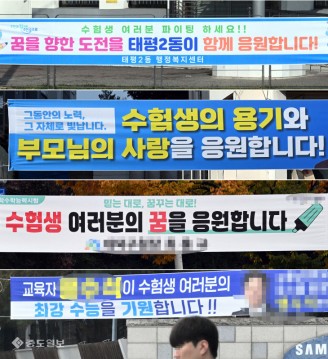|
| 이강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광도측정그룹 책임연구원 |
인공조명의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이 법의 시행규칙에 따라 야간 광고물 등 인공조명의 밝기를 휘도(Luminance) 기준으로 제한하는 중이다. 예를 들어,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전광류 광고물의 휘도를 자정부터 해뜨기 1시간 전까지 1000cd/m²(칸델라 퍼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한다.
휘도는 광원 표면에서 특정 방향으로 나오는 빛의 양을 나타낸 값으로, 단위 면적당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우리 눈의 수정체는 카메라 렌즈처럼 작동하는데, 광원과의 거리에 따라 초점거리를 조절해 망막에 광원과 똑같은 모양의 상(Image)이 맺히게 한다. 이에 따라 망막의 시각세포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광원 표면의 휘도에 비례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휘도 기준을 빛공해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휘도만 가지고 빛공해를 나타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휘도는 광원의 물리적인 특성이고 눈부심이나 빛공해는 빛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휘도의 광원이라도 선글라스를 착용할 때와 벗을 때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눈부심의 정도도 달라진다. 사람의 눈에서 선글라스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홍채에 의해 조절되는 동공이다. 밝은 환경에서는 동공이 수축돼 눈 안으로 들어오는 빛을 줄이고, 어두운 환경에서는 동공이 확장돼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밝은 대낮에는 차량의 전조등이 그리 밝게 보이지 않지만, 밤에는 매우 눈부시게 보인다.
게다가 사람의 뇌는 실제 망막에 들어오는 광량과 다르게 시각적 밝기를 재구성한다. 어두운 배경에서 밝은 물체는 더욱 뚜렷하게 인식하며, 움직이거나 변화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해 밝기를 높게 인식한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깜빡이는 조명이나 주변 환경과 휘도 차이가 큰 조명이 더 크게 눈부심을 일으킨다. 이러한 조명들은 같은 휘도라도 더 엄격한 기준에서 관리돼야 한다.
사람 이외에 환경 영향을 평가할 때는 아예 다른 빛공해 기준이 필요하다. 천체 관측에서는 각 조명의 휘도보다 대기의 전반적인 빛 산란을 나타내는 스카이글로우(Skyglow)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전체의 조명을 관리하고, 조명 방향을 최적화해 불필요한 빛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또, 사람에 맞춘 기준을 동식물에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휘도는 사람이 색에 따라 빛의 세기를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시감도(Luminous Efficiency Function)를 적용해 결정된다. 반면 동식물은 사람과 다르게 색을 인식하기 때문에, 사람과는 다른 빛공해 기준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곤충은 사람보다 자외선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곤충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선 야간 조명의 자외선 방출에 대해 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 맞는 빛공해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학 분야의 복합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국제조명위원회(CIE)는 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7월에 열린 정기학회에서 빛공해를 기조 강연 주제로 발표하는 등 빛공해 평가 기준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4년부터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와 환경 문제 해결을 고려해 빛공해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빛공해 기준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이강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광도측정그룹 책임연구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효인 기자
임효인 기자








![[계족산 황톳길 걷기대회] 황톳길 밟으며 가을을 걷다](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1m/09d/78_2025110901000664800029421.jpg)


![[박현경골프아카데미 시즌-3]공이 잘 나가지 않느냐 여봐라 `주리를 틀어라`](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11m/10d/20251107001410235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