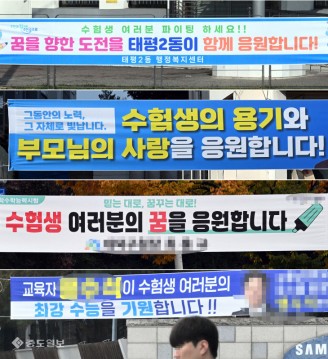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교육정책과 지역정책을 분리하지 않는 점이다. 대학 연구개발 기능의 지역 문제 집중을 위한 리빙랩(Living Lab) 모델 등은 참신하다. 산업·기술·문화 측면에서의 종합적 거점 기능은 교육정책과 지역정책 통합을 지향해야 가능한 제안들이다. 실제 그렇게 되면 대학·지자체·산업계·시민의 '제도화된 다층 협력'도 앞당길 수 있겠다.
논쟁적 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아니면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 체제와 같은 동반성장 구조가 반드시 이상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고 서울대와의 협력 체계를 만드는 일은 피하지 않아야 한다. 대전권처럼 지역거점대학의 혁신경쟁력지수가 높다면 혁신 역량의 파급력도 커진다. 수도권 집중화와 정부 지원 부족이 지역 대학 침체의 '100%' 원인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 대학을 지역의 중심 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이 경우 더욱 유효해질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7%인 고등교육 정부 지원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까지는 늘려야 한다. 다만 혁신네트워크를 갖춰도 '투자=성장'의 공식이 쉽게 작동되지 않는 것이 비수도권의 현실이다. 참여정부 때 지역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에 1조2000억 원, 박근혜 정부 땐 산학 연계 선도대학이라며 2조1000억 원을 지원했지만 역부족이었다. RISE나 글로컬대학 사업은 '빈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아야 한다. 거점대학과 비거점대학 간 기능적 연계 구축에도 한은이 제시한 통합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계족산 황톳길 걷기대회] 황톳길 밟으며 가을을 걷다](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1m/09d/78_2025110901000664800029421.jpg)


![[박현경골프아카데미 시즌-3]공이 잘 나가지 않느냐 여봐라 `주리를 틀어라`](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11m/10d/20251107001410235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