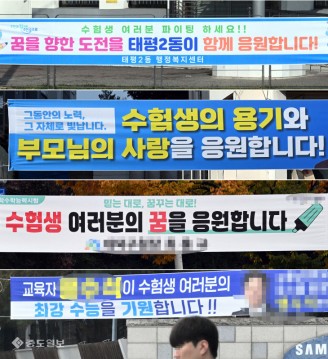이들의 손을 맞잡게 한 진짜 동력은 국내 철강산업의 고사 위기라는 심각성 때문이다. 여기에는 공급 과잉과 무역 장벽, 글로벌 탄소 규제, 중국산 저가 물량에 일본산 철강재 공습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다. 가동 중단과 공장 무기한 휴업으로 가동률이 80% 수준으로 급감했다. 철강왕 카네기와 금융 제왕 JP모건이 합작한 US스틸이 일본제철의 자회사가 된 사실은 타산지석이다. 철강산업 미래 경쟁력 상실은 특정 지역 이해에 한정되지 않는다. 철강도시만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이 걸린 문제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산업을 과거의 영화에 묶어둘 수는 없다. 수도권의 배후지역으로 대규모 철강 수요를 맡아 왔던 당진의 경우, 자원순환형 산업클러스터와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난제에도 직면해 있다. 수소 환원 제철 같은 핵심 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시점이다. 철강 수요 산업 중 조선을 빼면 국내 건설 시장을 필두로 지금 업황이 안 좋다. 산업위기지역 지정으로 위기가 끝나지는 않는다.
이를 살릴 시작점이 K-스틸법이다. 철강 위기를 돌파할 관련법 제정은 석탄화력 특별법과 함께 충남의 핵심 현안이다. 국내총생산(GDP)의 4.8%를 차지하며 산업 전반을 지탱해온 철강산업을 이대로 주저앉힐 수는 없다.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K-스틸법 제정 절차도 가능한 한 앞당기기 바란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철강의 입지가 축소되면 안 된다. 녹색 전환과 산업 생태계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까지 아우르는 정책적 해법 찾기는 한시가 급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대전 유학생한마음 대회] "코리안 드림을 향해…웅크린 몸과 마음이 활짝"](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1m/10d/118_2025111001000800600033961.jpg)









![[박현경골프아카데미 시즌-3]공이 잘 나가지 않느냐 여봐라 `주리를 틀어라`](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11m/10d/20251107001410235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