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해발 1172m의 지리산 정령치 휴게소 위쪽의 잘 다듬어진 등산로다. 방해물 하나 없이 눈 앞에 펼쳐진 확 트인 전경은 황홀함 그 자체다. 명산 중 명산인 지리산과는 첫 만남이기 때문에 즐거움이 더했다. 동쪽으로 노고단에서 반야봉을 거쳐 천왕봉에 이르는 봉우리들이 펼쳐지고 남쪽으로 성삼재와 왕시루봉이, 북서쪽으로는 남원시 조망이 시원스럽다. 찬란한 햇빛의 조명은 없었지만 아쉽지 않았다. 오히려 눈부심 없이 깨끗한 시계로 봉우리들이 더 선명해 운치가 더하다. 메아리를 부르는 풍경이다.
알록달록 화려한 등산복에 보기에도 튼실한 등산화, 양손에는 등산지팡이까지 갖춘 일행 5명이 나를 흘끔 쳐다보면 스쳐 간다. 출근길에 어울리는 정장 바지에 단화를 신은 모습이 지리산과는 부조화처럼 보였나 보다. 괜스레 멋쩍어 슬그머니 두 손을 내리며 "경치 진짜 죽이네"라며 무안함을 달랜다.
원래는 구례 쪽에서 화엄사와 신원사를 지나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성삼재 휴게소를 찾았다. 활짝 연 창문을 통해 들이마셔 지는 산의 공기는 마음마저 시원스레 정화한다. 도심지의 공기와는 질이 다르다. 하지만 기대를 안고 도착한 성삼재 휴게소는 건물 공사로 시끄럽고 어수선했다. 기대했던 지리산의 민낯을 여유 있게 감상할 수 없어 좌절했다. 춘향과 몽룡이라도 만나고 가자고 남원 쪽으로 길을 잡았다가 도착한 곳이 정령치 휴게소였다. 실망은 기쁨으로 변했고 춘향과 몽룡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다.
지리산 산행, 아니 방문은 처음이다. 여기서 굳이 방문이라고 한 이유는 한 걸음 한 걸음 땀 흘리며 걸어서 오른 것이 아니라 자가용을 운전해서 왔기 때문이다. 학창시절 수학여행이나 친구끼리 놀러 다닐 때, 언론사에 입사한 후 취재 등의 이유로 제법 전국을 돌아다녔는데도 지리산이 여정에 포함된 적은 없다. 광고문구처럼 "언젠가 꼭 가보고 말테야"를 되새기던 것을 실행케 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다.
전대미문의 전염병인 코로나는 세상을 뒤집었다.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 소독제는 필수품이 됐다. 학교에 가는 것도, 영화관, 맛집,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도 조심하고 꺼려지는 세상이다. 타인과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자동차 안전거리처럼 사람 간에도 2m라는 벽이 생겼다. 불과 몇 개월 전 당연시 했던 평범한 일상들을 하지 말라고 강요를 받는 세태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대나무밭에서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친 두건장이의 심정이 이렇지 않았을까.
지리산이 준 힐링을 이어가기 위해 날 좋은 6월의 어느 주말에는 대청호반을 따라 굽이굽이 드라이브 여행을 떠날 생각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건우 기자
이건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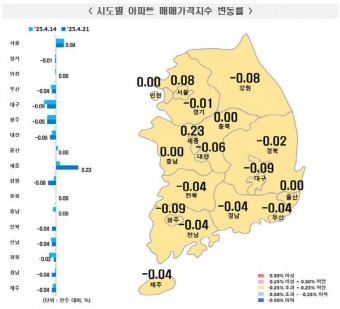







![[박현경골프아카데미]백스윙 어깨 골반 회전! 당겨서, 고정하고, 돌려주세요](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4m/20d/85_20250420000024502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