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 대덕구 상서동 비위생매립장(사진 왼쪽)은 29년째 매립가스가 배출돼 포집 및 소각 중이다. 비위생매립장 대부분 표층에 쓰레기가 드러나고 침출수 처리공정 없이 매몰되어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
대전 서구 봉곡동의 1985년 매립을 완료한 비위생매립장에서 침출수가 현재까지 유출되는 게 확인된 가운데 중도일보가 추가로 확인한 사용완료 매립장 3곳에서도 오염을 예방할 시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서구 관저동 서대전톨게이트 방향에 있는 매립장은 사유지임에도 면적 상당 부분을 쓰임새 없이 방치되는 것으로 보였다. 일부는 하우스를 설치하고 밭농사를 짓는 곳도 확인됐으나 전체 면적(2013㎡)의 절반은 거친 흙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곳은 1984년 생활폐기물 3만7170㎥를 매립하고, 가스가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 건설폐기물로 표층을 덮었다. 당시 폐기물은 최고 18m 높이로 쌓았는데, 비닐과 플라스틱, 섬유, 의복류의 잔해가 관찰된다. 그러나 매립 폐기물 안으로 빗물이 스미지 않도록 차수막을 세우거나 집수정 시설이 없어 침출수는 미처리 방류됐고, 지금도 별도의 배수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어 찾은 동구 대청동의 또 다른 비위생매립장은 사유지면서 1989년 2만7000㎥ 폐기물을 1989년 매립해 지금은 과수원과 밭으로 사용 중이다. 2003년 조사 때는 비닐과 플라스틱류가 주로 관찰되고 냄새가 감지돼 농사짓기 어려운 곳이었으나, 이날 방문 때는 침출수 등의 오염원이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곳 역시 침출수를 모을 집수정이나 차수벽이 없고 최종 복토 높이도 2m 이내로 깊지 않다.
끝으로 유성구 신성동의 매립장은 폐기물 8만5000㎥을 1990년 처리한 곳으로 지금은 동호인들의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옅은 악취가 느껴졌으나 봄 영농철을 앞두고 밭에 뿌린 거름의 것인지 구분되지 않았고, 하천 웅덩이는 벌써 녹조가 끼고 붉은 색 부유물로 혼탁했지만 이 역시 침출수인지 농경지 탓인지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 없었다. 다만, 차수막과 옹벽 또는 차수벽 전혀 없이 최종 복토 높이도 1m 이하로 과거 폐기물 누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대전 60곳의 비위생매립장 중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관리하는 대덕구 상서동과 신대동의 매립장에서는 폐기물 매립을 완료한 지 29년째를 맞은 지금도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해 처리하고 매립가스를 포집해 소각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유병로 한밭대 미래산업융합대학 책임교수는 "금고동에 위생매립장을 만들기 전에 생활주변 곳곳에 오염 차단막도 없이 폐기물을 묻어 처리했던 것이 지금까지 적정하게 유지되는지 돌아볼 때가 됐다"라며 "대게 매립장 안정주기를 20~30년으로 보고 있으나 침출수와 매립가스에 대해서는 그 이상에서도 관찰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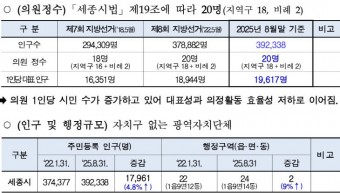






![[유통소식] 대전 백화점과 아울렛, 크리스마스·연말 겨냥 마케팅 활발](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11d/78_20251211010011343000469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