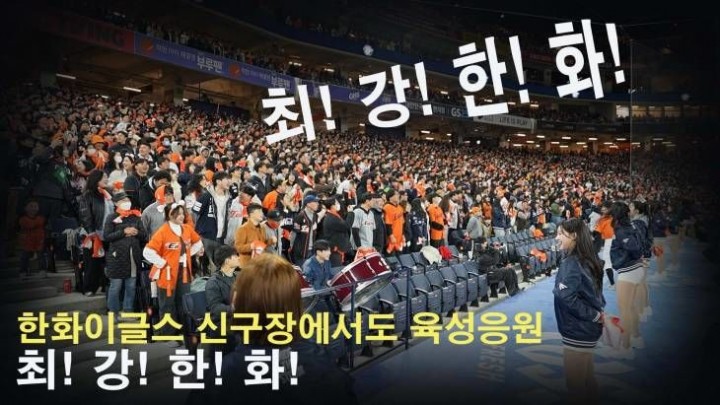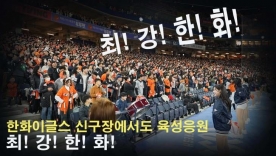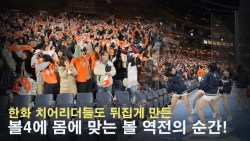|
| 최정민 미술평론가 |
삽살개는 대한민국 남동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토종견으로, 긴 털이 얼굴을 덮은 신비로운 외모로 인해 '액운을 쫓는다'는 뜻의 '삽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삽살개는 삼국시대 김유신 장군의 군견으로도 사용될 정도로 용맹함을 자랑하며 한국 민족의 정신을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시절, 삽살개는 멸종 위기에 처하며 큰 고난을 겪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제는 '견피(犬皮)의 배급통제에 관한 법령(1939년)', '견피 판매 제한에 관한 법령(1940.3.8.)'과 조선원피판매주식회사 설립(조선총독부령 제26호) 등 법률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토종개들의 모피를 군용 방한복과 방한모 제작에 이용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최소 100만에서 150만 마리의 토종견이 도살되었는데, 삽살개는 긴 털과 방한, 방습 능력이 뛰어난 가죽을 이유로 집중적인 도살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삽살개는 일본의 식민지 수탈 정책 속에서 가죽을 이유로 희생된 대표적인 동물이었다.
삽살개에 대한 문헌 기록은 16세기 편찬된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 확인된다. 당시 개품종은 지금처럼 엄밀히 구분되지 않았지만, 삽살개는 털이 긴 특징을 가지고 있어 '견(犬)' 또는 '방(尨)'으로 불렸다. 이후 18세기에 이르러 자연 탐구가 활발해지면서 삽살개 외에도 다양한 품종이 세분화되었고, '염', '갈교', '동경개', '바둑개' 등의 이름이 등장했다.
삽살개는 단순히 개로서의 의미를 넘어 조선 문화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다. 조선 후기 화가 김두량(金斗樑, 1696~1763)의 <삽살개>는 삽살개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긴 털의 질감 표현은 섬세하면서도 생동감이 느껴지며, 삽살개의 외적 특징을 강조하는 동시에 작품의 무게감을 더한다. 긴 털로 인해 눈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몸짓과 자세에서 느껴지는 당당함과 용맹함은 그림의 주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단순한 동물의 묘사를 넘어, 삽살개의 용맹함과 충직함을 깊이 있게 표현한 것이다. 김두량의 그림에는 조선의 영조가 직접 쓴 화제(御書)가 더해져 그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 영조는 김두량의 그림에 "사립문을 밤에 지키는 것이 네가 맡은 임무이거늘, 어찌하여 길에서 대낮에 이렇게 짖고 있느냐"는 글을 남기며 삽살개의 충직함을 조선 사회에 대한 풍자와 함께 묘사했다. 조선시대의 회화와 문헌을 통해 본 삽살개는 조선인의 자연관과 신앙적 세계관이 투영된 동물로 여겨졌다.
삽살개는 단순한 토종견을 넘어 한국의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특별한 존재다. 수천 년 동안 한국인의 삶과 함께하며 충직함과 용맹함의 상징이 되었고, 일제강점기의 아픔 속에서도 그 존재 가치를 이어왔다. 오늘날 삽살개는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과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다.
삽살개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일은 단순히 한 종(種)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역사를 지키는 일과 같다. 삽살개가 지닌 상징성은 과거의 수난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한국인의 모습과 닮아있다. 삽살개의 긴 털이 액운을 막아준다는 믿음처럼, 그 존재가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희망과 정체성을 지켜주는 상징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정민 미술평론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