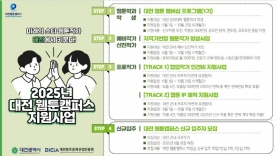|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실, 호수공원, 정부세종청사 등이 있는 세종시 세종동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징 도시로 태동한 만큼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이 수십 년 간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 제자리 걸음인 균형발전 백년대계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은 이를 비웃듯 5년 전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광역급행철도망(GTX)까지 구축하며 인구 블랙홀 기능을 되레 강화하고 있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이어갈 때, 서울은 GTX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충청권은 메가시티, 즉 광역연합으로 수도권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인 양상이다. 2012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로도 견고한 수도권 벽은 깨지지 않고 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위상으로 정상 건설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 정부세종청사에서 바라본 일출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수시 개최 ▲대통령 세종 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집현동 세종 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충청권 광역철도망, 광역급행철도(CTX)로 추진 ▲'디지털미디어단지(DMC)' 조성안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조성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와 방사선 의과학 융합 산업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뒤 지난 3년 간 실행력은 물음표가 달린다. 국무회의 개최는 가뭄에 콩나듯 미약했고, 세종의사당 개원 시점은 2027~2028년에서 2031년까지 밀려났다. 대통령 집무실도 분실로 검토되고 있어 균형발전의 강력한 신호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CTX는 올 하반기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를 봐야 하나 인해전술로 가속도를 내고 있는 수도권 GTX에 비해선 더디다.
디지털미디어단지도 세종의사당과 함께 미뤄져 제자리 걸음에 있다. 교육발전과 기회발전 특구는 지방 모두가 나눠먹기식으로 분배돼 효과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2026년을 바라보고 있다.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와 청년 창업빌리지는 용역 단계에 있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대선 기간에 내건 공약은 어떨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 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검토에 나섰으나, 문재인 전 정부 역시 시선은 광화문에 머물렀던 전례가 있어 앞으로를 지켜봐야 한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히 건립 △여성가족부와 감사원 등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행정수도 위상의 문화 인프라 확대 △ 5-1과 5- 2생활권에 AI·자율주행·빅데이터·첨단의료 등에 기반한 스마트 헬스시티 조성, 공공의료기관 설립 △ 세종~서울 간 환승 없는 직통 (준)고속열차 △서울~천안~조치원~정부세종청사 연결 전철 (연장) 운행 등도 내건 바 있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수도권 병폐에서 비롯한다"며 "탄핵 정국은 기회다. 이제라도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국가의 제1정책으로 삼고, 강력한 변화 신호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희택 기자
이희택 기자
![[이슈] 청소년 비행 잡고 불법촬영 막아주는 대전자치경찰위 `과학치안`](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3d/과학치안1.jpeg)

![[썰] 4·2 대전시의원 보궐, 더불어민주당은 본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3d/78_2025040301000346200012001.jpg)



![[WHY이슈현장] 청소년 비행 잡고 불법촬영 막아주는 대전자치경찰위 `과학치안`](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3d/78_2025040301000308200010831.jpg)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영상]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파면 전원일치 선고의 순간 대전은하수네거리 환호의 함성](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4m/04d/85_20250404001152047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