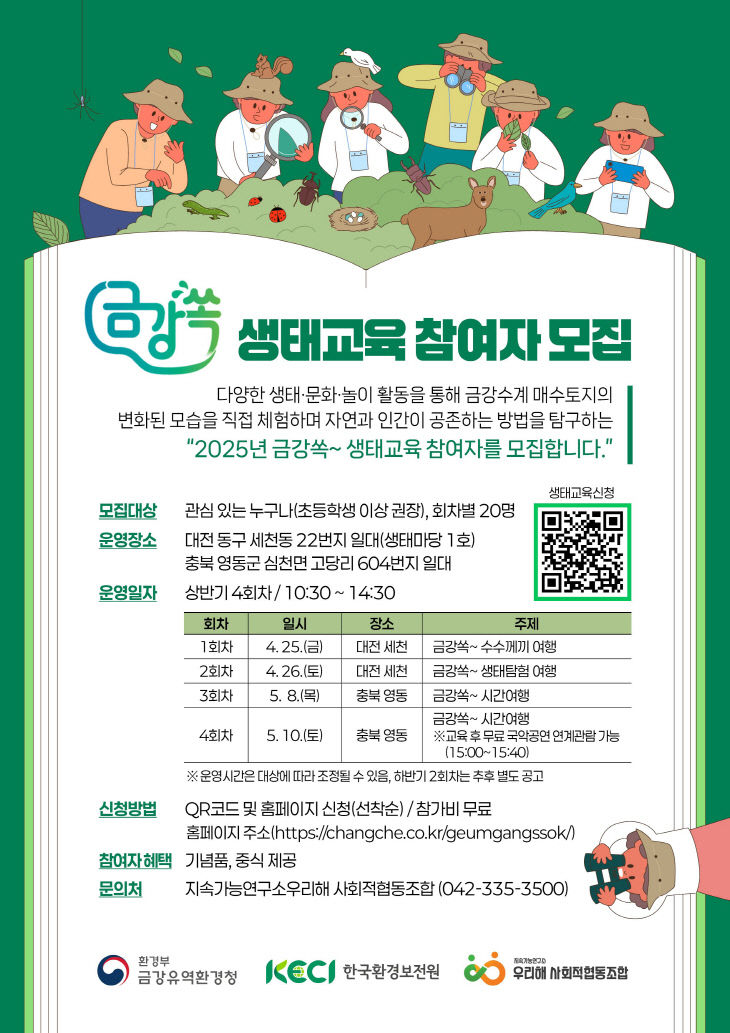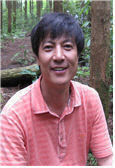 |
| 김홍진 교수 |
시인은 세계와 갈등하고 불화한다. 근대 이후의 시인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세계와의 불화에서 시인은 탈주와 이탈을 꿈꾸고 현실 저 너머 피안을 동경한다. 미지의 꿈과 동경을 포기한 자는 진정한 예술가나 시인이 될 수 없다. 아도르노의 표현처럼 예술은 세계의 모든 어둠과 죄를 자신의 내부에서 떠맡으면서 부정적 경험 세계가 변화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말없이 말한다고 했을 때, 시인의 운명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럴 때 시인은 현실로부터 탈주하여 망명정부를 차리고, 지금 여기를 지배하는 문법을 대체할 문법을 찾아 나선다. 예술의 새로움은 탈영토화에 있다.
근대 이후 시인이나 예술가는 늘 고통스럽고 불행한 운명의 초상을 하고 있다. 그들의 운명은 거대한 날개로 푸른 바다 위를 활공할 때는 우아하지만 갑판 위에선 선원들에게 조롱받는 보들레르의 '알바트로스'처럼 비극적이다. "내가 내 심장을 끓여 먹"으며 "어둡고 동시에 빛을 발하는 여인"을 환시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운명의 존재이다. 말하자면 시인이나 예술가는 현실적 조건들과 생래적으로 불화하며 불안하게 뒤뚱거리는 자이다. 그들은 주어진 현실에 만족할 수 없는 결핍된 자아이며, 때문에 비극적 운명의 소유자이다.
다시 아도르노의 표현을 빌어 세계의 불행을 인식하는 데서 시인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한다. 그러나 이 말은 미적 경험이란 주체가 자기를 확인하는 만족이나 충족이 아니라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는다는 뜻이다. 세계가 불러일으키는 전율스러운 충격은 결코 자아의 부분적 충족이 아니며 쾌락과 비슷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충격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한계와 유한성을 깨닫게 되는 자아의 소멸에 가깝다. 그들은 항상 세계와 불화하며 긴장한다. 긴장하며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 존재의 떨림을 감각하며, 세계가 변화되었으면 하는 희망의 가능태를 넘본다.
얼마 전 2025년도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문학 분야 심의에 참여했다. 매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끼는 점은 대전 지역 문단에 원로 문인이 이다지도 많다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 청년이나 중견 문인의 수보다 곱절은 많이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건 순전히 문학적 성취나 업적보다 물리적 나이만으로 원로라는 개념을 인식하는 까닭인 것으로 보인다. 외람되지만 원로라는 호칭이 무색하게도 솔직히 다수의 작품은 습작에 가깝거나 창작 행위를 하나의 여기(餘技)로 여기는 듯싶었다.
글쓰기란 백지의 사막, 사막 같은 백지 위에서 고뇌하고 공포에 떨며 좌절하고 실의에 빠져 방황하는 일과 다름없다. 사막 같은 백지의 막막함과 순결한 처녀성에 매번 좌절하고 낙담하고 다시 쓴 결과물이 작품이다. 그러나 글쓰기에 고뇌 어린 표정은 읽을 수 없었고, 대부분 재래의 문법을 자동반복할 뿐이었다. '쉽게 씌어진 시를 부끄러워한' 동주를 무색하게 했으며, '최후의 나'가 내뱉은 고통스러운 언어적 질감을 느낄 수 없었다. 아름다운 여인은 눈을 고통스럽게 하는 법이다.
김홍진 한남대 교수.문학평론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