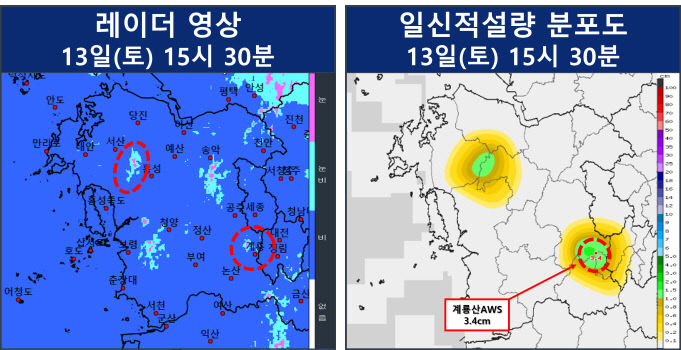|
| 대전에 남은 일제강점기 전쟁유적으로 여겨지는 금광 모습. 중구 무수동과 금동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
중도일보가 대전에 남은 일제강점기 전쟁유적을 조사하는 여정은 보문산과 도솔산을 거쳐 오월드를 지나 대전의 가장 남쪽의 골짜기까지 이르렀다. 보문산의 굽이마다 전쟁의 방공호로 여겨지는 동굴이 파고든 것처럼 도솔산의 갑천 자락에 조선제련주식회사가 금을 찾아 사정없이 후빈 것처럼, 완연한 농촌 마을의 이곳 산에도 지하자원 수탈의 생채기는 아물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았다. 취재진은 지난 1월부터 중구 석태산 일원에서 자원 수탈 현장을 조사해 3곳의 폐광을 찾을 수 있었다. 무수동 너머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절개지 정상부에 앞서 서구 도솔산에서 관찰된 조선제련의 금광과 동일한 형태의 폐광 1개가 존재하고, 남쪽으로 내려와 금동 마을 맞은편 얕은 야산에 2개의 폐광이 각각 남아 있다.
목달동에서 태어나 지금은 무수동에 거주 중인 권평원(86) 옹은 "국민학교 시절 소풍 가는 길에 금광 구덩이가 있었고 친구들끼리 어렸을 때 몇 번은 가봤으나 그때 이미 채굴은 이미 멈춘 상태였다"라며 "누가 캤는지 듣거나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금동의 마을회관에서 만난 어르신들도 금을 캐던 곳이 있다고 알고 있으나 언제 조성됐는지 전해지는 이야기는 모른다는 반응이었다.
무수동 뒤편의 폐광은 직사각형의 수직갱도로써 정교하게 작업한 흔적이 역력했고, 폐광에 이르는 경사로에는 잔돌을 가지런히 배열해 수로 형태의 모양을 냈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철망이 녹슨 채 남아 있다. 금동 마을 맞은편의 폐광은 규모가 비교적 작고 한 곳은 굴착을 중단한 모습이었는데, 다른 한 곳은 안쪽이 너무 어두워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들 시설에 추락 안전시설은 마련되지 않았다.
 |
| 돌을 깎아 금 채굴이 이뤄진 현장에는 버려진 폐석들이 경사면에 흘러내린다. 무수동 지점에서는 폐석을 쌓아 수로로 추정된 시설(사진 왼쪽)을 만든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
조선총독부 통계연보를 담은 '통계로 보는 일제강점기 사회경제사'에서는 1936년 대전을 포함한 충남에서 일제는 137만2000g의 금을 채굴했는데 경기도(33만g), 전북(7만g), 강원도(69만g)을 크게 웃돌고, 그해 조선 금 생산량의 9.35%를 충남에서 수탈했다고 밝혔다.
같은 논문에서 금은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을 분석했는데 조선인의 임금은 일본인의 임금을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인보다 낮았다고 분석했다. 1931년 기준 일본인 성인 보통 근로자 임금이 1.6엔일 때 조선인은 0.6엔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937년 이후 광산물 통계를 극비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는데, 1936년 광산 213곳 중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한 광산이 전체의 81.7%라고 밝히고, 일본인이 운영하는 광구에서 금은 생산액이 전체의 83%를 차지해 조선인의 금은 광산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였다고 분석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대전, 일류 문화도시의 현주소] 국립시설 `0개`·문화지표 최하위…민선8기 3년의 성적표](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14d/117_2025121401001223600052381.jpg)



![[대전, 일류 문화도시의 현주소] 국립시설 `0개`·문화지표 최하위…민선8기 3년의 성적표](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14d/78_20251214010012236000523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