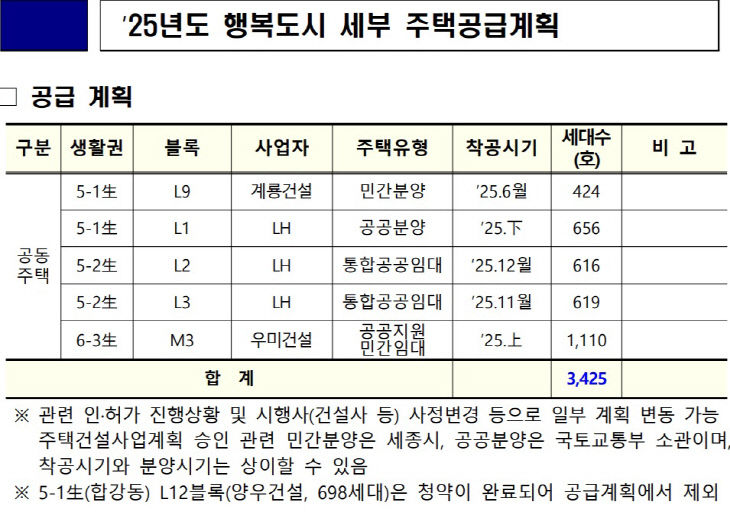박수량의 무자비는 청백한 성품의 상징이었지만, 무자비가 세워진 이유가 다양하다. 정쟁의 희생양으로 사약을 받아 죽게 되자, 복권을 기다리며 묻어 두기도 하였으며(조선 김정), '무위의 도' 설파, 재임 내내 먹고 놀다 업적이 없어서 또는 관례에 따라(중국 명나라 만력제), 천지간에 업적이 미미함을 깨우쳐서(중국 서한 한무제), 폭정으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중국 유일의 여황제로 당나라 측천무후), 나라 잃은 수치로(경남 함안에 세워진 이오묘비), 그야말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무자비(충북 진천 연곡리 석비, 보물 제404호, 경남 합천 상가면 이온의 비-경남 유형문화재 제291호, 경기도 감악산 정상, 추정 설인귀비) 등이다.
욕망은 우리 행동을 유발 시키는 동인이다. 끝이 없다. 문제는 양극 지향성이다. 극단으로 치닫는다. 양극은 선과 악이다. 선은 아름다운 것이요, 악은 멸망의 길이다. 시작이 미미하여 처음엔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빠져나오지 못할 지경이 되어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다. 이미 늦었다 생각되는 그 때라도 사생결단의 의지로 돌아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권력욕도 다르지 않다. 게다가, 권력욕의 속성 중 하나가 마음대로 휘둘러보고 싶은 것이다. 중국 당나라 측천무후(則天武后, 624 ~ 705, 본명 武照)는 550여 중국 황제 중 유일한 여성이다. 아버지 무사확(武士?)은 개국공신이었으나 출신이 미천하여 따돌림을 당했다. 자식 사랑은 깊었는지, 무조에게 공부를 많이 시켜, 말 타기와 활쏘기, 춤과 노래, 글쓰기 등 만능이 되게 하였다. 게다가 미모가 뛰어나고 총명하여 당태종 이세민의 눈에 들었다. 열네 살에 입궁한다. 서가 관리 담당으로 황제의 총애는 받지 못했다. 이세민이 죽자 관습에 따라 비구니가 되어 감업사(感業寺)로 출가한다. 이세민의 아들 이치와의 연분과 왕후의 도움으로 다시 입궁하여 소의가 되었으며 능수능란한 처세로 황후에 책봉 된다. 나이 34세였다.
황후란 야심이 이루어지자 복수의 시간이 된다. 김후 저 <불멸의 여인들>에서 황제가 되는 과정만 발췌해 보자. 황후책봉에 반대한 중신들 숙청이 있었으며, 스무 명이 넘는 원로를 좌천 시켰다. 황제의 외삼촌 장손무기도 유배시킨 후 강요하여 목매달아 자결케 한다.
슬하에 어려서 죽은 딸을 제외하고 4남 1녀를 두었다. 태자로 있던 이충(李忠)을 폐하고 자신의 큰아들 이홍을 태자로 세웠다. 무후에게 권력이 집중되자, 소심한 황제 이치가 불안하여 재상 상관의(上官儀)를 은밀히 불러 황후를 폐하는 조서를 작성토록 지시했다. 영악한 무후가 어찌 모르랴. 상관의가 폐태자 이충을 다시 세우기 위해 모반을 도모했다 모함하여 이충과 함께 처형하였으며, 가족은 모두 노비로 전락시켰다.
이홍이 성장하면서 주관이 뚜렷하여 어머니와 대립하기 시작한다. 절대 권력으로 가는 걸림돌이 되자, 잔인한 선택을 한다. 독주를 마시게 하여 독살한다. 둘째인 이현(李賢)이 태자가 된다. 이현 역시 영리할 뿐만 아니라 탁월한 능력에 강건한 기백까지 갖추었다. 여러 번 경고하였으나 귀담아 듣지 않자, 사생활 문란과 반역 도모로 몰아 서인으로 강등시킨다. 유폐하였다가 황제 이치가 죽자 두 달 만에 살해 한다. 둘째 아들의 아들, 즉 손주가 세 명 있었는데 모두 황궁 깊숙이 유폐한다.
셋째 아들 이현(李顯)이 황제 직위를 계승하였으니 이 사람이 중종(中宗)이다. 아버지 이치처럼 야심도 없고 심약하였으나 자신의 장인으로 재상을 삼으려 했다. 비위가 거슬린 무후가 셋째 아들 역시 55일 만에 유폐시킨다. 막내아들인 이단(李旦)이 황제의 지위를 이으니, 후일의 예종(睿宗)이다.
무씨 친족이 득세하면서 황제를 폐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려한다. 황후가 왕조 탈취의 길로 접어들자 반란이 일어났다. 유능한 장군들 덕에 40여일 만에 진압한다. 오히려 무후의 권력이 공고해진다. 그가 세운 북문학사(北門學士)란 서적편찬기관에서 <성씨록(姓氏錄)>을 발행, 보잘 것 없던 자신의 무씨 가문을 최고의 명문가로 조작하는가 하면, 무씨 5대조를 왕으로 추증하기도 하였다. 다시 반란이 일었으나 이십 여일 만에 손쉽게 제압한다. 고종 이치가 죽은 지 6년 후 결국 주나라 왕조가 새롭게 탄생한다.
권력욕에 눈이 가려 천륜인 친자마저 참혹하게 처단한다. 황족을 집중적으로 숙청하여 자신의 두 아들만 남기고 고조, 태종, 고종, 세 황제가 남긴 모든 황손을 제거한다. 걸림돌이 되는 권력주변의 수많은 사람 역시 사지로 몰아넣는다.
돌아보니 바람이었던 모양이다. 죽음에 직면하여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 획기적인 것은 능 앞에 무자비를 세우라 지시한 것이다. 자신의 업적과 과실에 대한 평가는 동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후세 사람에게 맡긴다는 의미였을까? 유구무언(有口無言)이었을까?
양동길/시인, 수필가
 |
| 양동길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의화 기자
김의화 기자
![[르포]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직접 방문해보니… 인피니티 풀이?](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2m/20d/118_2025022001001644100066421.jpg)

![[WHY이슈현장]14년 흉물 대전 현대오피스텔 정비사업마저 `흔들`…화약고vs지역자산 선택은](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2m/20d/78_2025021901001525100061621.jpg)

![[르포]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직접 방문해보니](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2m/20d/78_2025022001001644100066421.jpg)



![[현장]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가보니...亞 최초 몬스터월 눈길](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2m/21d/85_202502210100168010006767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