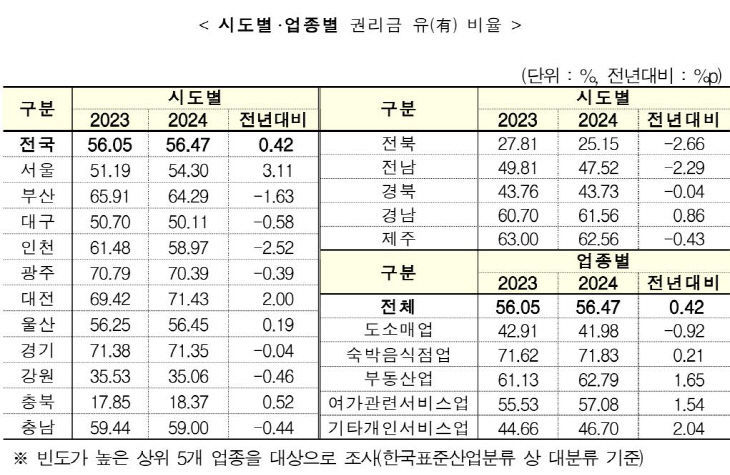|
| 정흥채 센터장 대전테크노파크 BIO센터 |
한가지 40세에 불과한 딥시크의 창업자 량위펑이 누구인가 궁금해진다. 그는 어떻게 딥시크를 창업했고 딥시크는 어떤 회사인가? 량위펑은 중학교 시절 미적분의 천재였고, 대학 시절에는 주식투자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기도 했으며 서른 살에 두 명의 대학 친구들과 함께 AI 기반 헤지펀드 하이플라이어를 2015년 창업해 운영해 왔다. 딥시크 창업 자금의 출처는 알고리즘 투자로 얻은 수익이나 중국 정부의 전략산업 공공투자 자금이 도움이 되었을 수 있다. 하이플라이어는 빠르게 성장했고 투자자 1만 명에 운용자금이 12조 원 규모로 역대급이다. 데이터를 최대한 이용해 패턴을 발견하고 수학적 모델링에 미친 젊은이들이 모인 회사가 하이플라이어였다. 딥시크의 R1 챗봇은 이러한 하이플라이어의 투자와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더군다나 R1은 공짜다. 이번 모델은 오픈소스로 공개한 것이다. 중국 AI 굴기의 정점을 보는 것 같다.
딥시크의 성공 요인 중 또 하나는 인재채용에 있다. 창업자 랑위펑은 모델링에 '미친' 젊은이를 채용했다.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 2년 이하의 경력만 가진 초급자들만 채용했다고 한다. 이들은 헤지펀드 투자모델을 만들려고 AI 연구에 심취했고, 챗GPT가 출시될 때 이미 상당한 수의 엔비디아 AI 칩을 보유하고 여러 칩을 연결해 고성능의 컴퓨팅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엔비디아 칩 공급을 제한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딥시크의 성공은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가야 하는 모델이다.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창업하고 글로벌시장에서 평가받는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미친' 젊은이들에게 자금을 제공해 실패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약 119만 개의 기업이 창업됐고, 기술기반 창업은 약 21만 개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으나 전체 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0.1% 상승했다. 이는 기술창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반영한다. 하지만, 우리의 혁신창업은 주로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 창업이나 연구 중심 대학의 교원창업이 주를 이룬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간섭과 투자유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량위펑과 같은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도전적인 연구자나 교수들의 창업 사례가 적고, 가능성 있는 혁신기술과 미친 듯이 놀아 볼 수 있는 자원의 무한 공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벤처투자는 눈에 보이는 수익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투자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에서 혁신상 절반을 휩쓰는 것을 보면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는 차고 넘쳐 보인다. 문제는 이를 새로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묻지마' 자본과 '미친' 사업가들이 안보인다는 것이다. 투자자본의 규모를 조 단위 규모로 조성되어야 하고, 큰돈을 벌고 있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부의 모험자본의 대규모 조성이 필수적이다.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위험 공유로 실패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정부가 바이오헬스, AI 그리고 양자컴퓨터 분야를 첨단 미래전략기술로 정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을 천명했다. 전략적 선택은 유효해 보이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모두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혁신기업의 창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세상을 바꿀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글로벌시장에서 먹히는 기업을 꿈꾸는 사업가에게 무한대 투자를 통해 우리도 딥시크와 같은 기업의 탄생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이제는 창업기업의 수보다 세상을 제패하는 기업 하나가 더 중요해 보인다./정흥채 센터장 대전테크노파크 BIO센터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