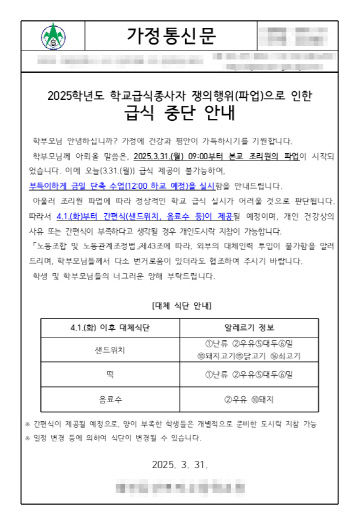관점도 다양하다. 의료사각지대의 다음 단계인 의료붕괴 대응에 광역자치단체 역할을 앞세운 것이 우선 그렇다. 지역별·전문과목별 불균형 등 보건의료체계 부실은 건강 형평성을 넘어 지방소멸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맞물린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역할은 그 점에서 경시할 수 없다. 지방소멸과 의료기관 수, 의료진료량, 의료이용증감률은 상관성이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서 의료 부문에 대한 반영 확대를 환기한 것 또한 유의미하다.
지방은 의사 구인난이 유지되고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조차 흔들리는 형국이다. 정부 기금을 만들어 광역지자체 차원의 특별회계를 두고 지역의료체계로 개편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췄다. 적자가 불어나 비상경영체계의 한계를 드러낼 지경에 처해도 일개 병원의 부실로만 보는 경향이 강하다. 지방교부세 산식(算式)에서 지역의료 실상을 반영하는 지표를 넣는 것, 지방소멸 위험 구분을 통한 단계적 정책 시행 등도 검토할 가치 있는 제언이다.
재정자주도 개선과 보건의료예산 증가 없이는 지자체에서 실천 가능한 수준에는 한계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의 지역 차별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이상이다. 지역의료 붕괴는 지방소멸과 나란히 오거나 그보다 먼저 온다. 지방소멸시대 아닌 지방시대를 여는 적합한 또는 과감한 지원에서 여태까지 '의료'는 잘 챙겨지지 않았다. 재정 확보와 지자체 역할 증대는 의료전달체계의 편중 해소에서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의료 개혁을 표방하면서 지역의료를 위기로 몰아넣는 역설적인 의정 갈등 상황을 끝내는 일이 더욱 시급해졌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117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유통]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1628000045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