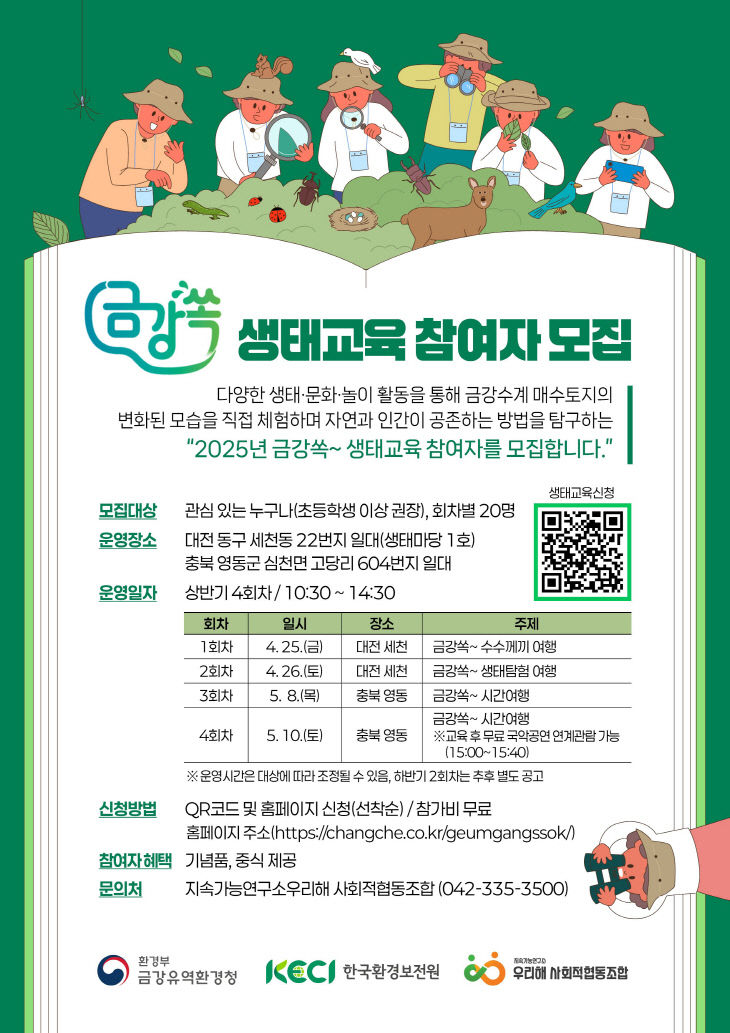|
| 민병찬 국립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지난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에 이어 두 번째이고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강 작가가 사상 처음이다. 한강 작가는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쓰게 됐다. 2016년 '채식주의자'로 세계적 권위의 맨부커상 국제 부분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데 이어 이번에 노벨문학상까지 거머쥐며 한강은 명실상부 세계적 거장 작가의 반열에 들게 됐다는 평가다. 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 거부가 된 알프레드 노벨 (Alfred Nobel)의 유언에 따라 제정된 상으로, 과학 분야에는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등 3개 분야에 시상된다. 이 상은 그 해에 인류의 복리 증진과 과학에서 가장 커다란 업적을 남긴 최근의 '발견', '발명' 혹은 '개선' 등을 해낸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노벨은 그의 유언에서 과학 분야의 노벨상 선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스웨덴 왕립 과학 아카데미와 왕립 카롤린스카 의학 연구소에 위임했다. 그의 유언에 따라 첫 수상자를 내기까지에는 5년이 걸렸다. 1901년 처음 수여된 노벨상은 최초에는 약 4만2000달러씩을 상금으로 지급했는데, 그 뒤 노벨재단의 수익금에 따라 상금은 계속 변화했다. 과학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실험물리학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문제점 이외에도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제정 당시의 상황과는 달라진 과학 연구 방식에 따라 노벨상의 선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선 수상 분야에 문제가 있다. 수학 분야가 빠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물리학과 화학 분야가 명시되는 바람에 지구과학과 천문학은 계속 수상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현대 수학의 공리적 기초를 세운 힐베르트 , 저장 프로그램 전자 컴퓨터의 발달에 기여한 폰 노이만 , 사이버네틱스를 창시한 위이너 ( Norbert Wiener ) 가 노벨상과는 상관없는 인물이 되었고, 에딩튼 (Arthur Eddington)이나 허블 같은 유명한 천문학자도 수상에서 제외되었다. 죽은 사람에게는 수여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노벨상이 최고의 과학자 모두에게 수여되지는 않았다는 근거가 된다. 원자번호를 원자핵의 전하량에 의해서 재정한 영국의 과학자 모즐리는 제1차세계대전 중 터키 전선에서 참전하다 전사하는 바람에 노벨상을 받지 못했고, 1944년 DNA가 유전과정을 지배하는 핵심 물질이라는 것을 밝힌 에이버리 (O.T. Avery)는 왓슨(James D. Watson), 클리크(Francis H.C. Crick), 윌킨스(Maurice Wilkins)가 노벨상을 받을 때까지 살지 못하고 죽어서 결국 노벨상을 타지 못했다. 개인에 대한 수상을 원칙으로 하는 점도 문제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과학연구 자체가 점점 공동연구의 형태를 띠고 이어가고 있고, 특히 가속기 연구소에서의 연구와 같은 거대과학의 연구에서는 한 연구에 약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등 집단적인 연구가 심화되고 있으나 노벨상은 계속 개인에 대한 수상만을 고집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무선전신을 발명한 굴리엘모 마르코니 (Guglielmo Marconi)와 브라운 (Karl Braun), 그리고 천연색 사진을 발명한 가브리엘 리프만 (Gabriel Lippmann) 등은 공학적인 발명을 해서 노벨상을 받았었다. 그러나 발명 자체가 기업과 국가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된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노벨의 유언에 맞도록 특정 발명에 노벨상을 주기란 상당히 힘들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 기술을 비롯한 공학이 인류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언제까지나 순수과학에만 노벨상을 제한해도 되겠느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또 사회가 다원화되고 수많은 학제간 분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20세기 초에 확립된 분야인 물리학, 화학, 생리학 등으로는 다양해진 과학 분야를 모두 포괄할 수 없게 되어 가는 것도 21세기를 맞으면서 노벨상이 변신을 요구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노벨상은 그 상이 지닌 높은 권위 때문에 그 선정 자체가 20세기 과학의 향방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말의 과학기술 관점에서 제정되었고, 20세기의 과학과 함께 지내왔으며, 또 20세기의 학문적 토양에서 제도화된 노벨상이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계속 주목해 볼 만한 흥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된다. 민병찬 국립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