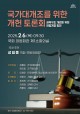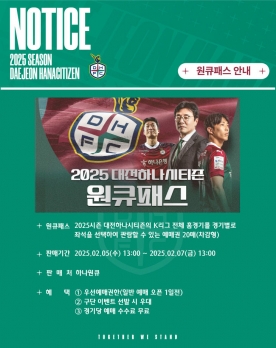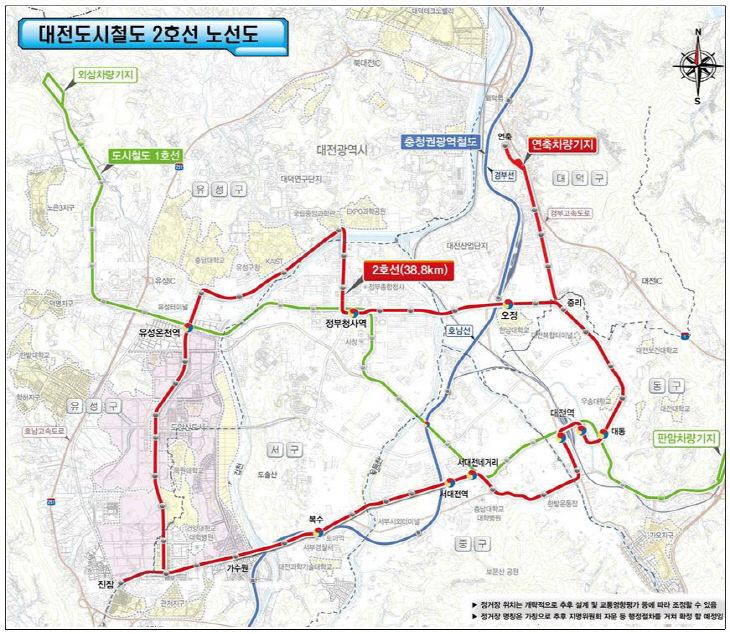|
| 깍두기 |
우리는 흔히 아무 맛이 없는 음식을 '무맛'이라고 하는데 무는 지방질이 그리 많지 않지만 보통 일 년 내내 먹을 수 있으며 사람에게 이로울지언정 해(害) 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재래종 무는 단단해서 깍두기를 담글 때 절일 필요가 없었지만 요즘 나오는 무는 물기가 많고 무른 품종이 많아 이런 무로 깍두기를 만들려면 썰어서 소금에 절여서 수분을 빼고 나서 버무려야 덜 무르다. 깍두기는 무의 씹히는 질감이 맛을 크게 좌우한다. 무 껍질을 깨끗이 문질러 씻어서 껍질째 담가야 아삭하니 씹히는 맛이 좋다.
김장철을 맞추어 올해 11월 11일 공주에서는 '공주깍두기'의 유래를 널리 알리기 위한 '2023 제3회 공주깍두기 축제'를 열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싱싱한 무와 고춧가루 등 공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해 만든 양념을 무와 골고루 잘 버무려 먹음직한 '공주깍두기'를 만들어 이날 담근 '공주깍두기' 약 200kg을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
| 공주 깍두기 축제 행사 모습. |
그래서 그동안 문헌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공주 깍두기 유래를 처음 알린 사람은 조선식찬연구소(朝鮮食饌硏究所) 소장으로 있던 재야 지식인 홍선표(洪善杓) 선생이다.
일제 강점기 조선식찬연구소(朝鮮食饌硏究所)를 운영하던 지식인 홍선표(洪善杓)가 1937년 11월 10일자 동아일보에 깍두기의 유례를 "정종조(正宗朝 : 정조를 정종으로 잘못 기재 됨)의 사위인 영명위(永明慰) 홍현주(洪顯周)의 부인이 임금에게 여러 음식을 새로이 만들어 들일 때 처음으로 무를 쓰러 깍두기를 만들어 드렸더니 대단히 칭찬하시고 잡수신 일로부터 전파하였다는 것인데, 그때 일흠을 '刻毒氣(각독기)'라 하였고 민간에 전파하기는 그때 대신 중에 일흠은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만 공주에 낙향해야 깍두기를 먹었는 까닭으로 깍두기가 공주에서부터 민간으로는 시작된 관계로 오늘까지 공주깍두기라고 유명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홍선표(洪善杓)가 동아일보에 기고한 3년 후인 1940년 6월에 국한문 혼용으로 『조선요리학(朝鮮料理學)』이라는 요리서에 "200년 전 정조의 사위인 영명위(永明慰) 홍현주(洪顯周 1793-1865)의 부인(숙선옹주: 淑善翁主 1793년 3월 1일~1836년 6월 7일)이 임금에게 처음으로 깍두기를 담가 올려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에는 각독기(刻毒氣)라 불렀으며, 그 후 여염집에도 퍼졌다. 고춧가루 대신 붉은 날고추를 갈아서 쓰면 빛깔이 곱고 맛도 더욱 좋다"라고 기록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조경남(趙慶男1570∼1641)이 쓴 『춘향전(春香傳)』에 깍두기란 말이 처음 등장한다.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 떨어진 개상판에 콩나물 깍대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라는 구절에도 깍두기가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깍두기를 전라도 사투리로 깍대기라고 불렀던 모양이다. 서울 대갓집에서 별미로 담가 먹던 것으로 '감동젓무' 또는 '감동젓'이라는 깍두기가 있다. 노론·소론의 사색당파가 요란했던 시절에 유독 노론집에서 이 음식을 만들어 먹었으며, 구한말 갑신정변으로 희생된 김병학(金炳學1821년~1879) 대감의 손부(孫婦)인 한영수 할머니가 만들었다고 한다.
위자료를 볼 때 깍두기 조선 중기 궁중이나 서울의 대갓집에서 해 먹던 깍두기가 공주를 통해 민간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 깍두기를 '젓무', 또는 '홍저'라고도 하며, 궁중에서는 '송송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자료를 찾던 중 '한국고전번역원'에서 해제한 고려 말 도은(陶隱) 이숭인(李崇仁, 1347~1392)의 문집인 '도은집(陶隱集)' 제3권 / 시(詩) '絶句二十首用唐詩分字爲韻寄呈民望待制(절구이십수용당시분자위운기정민망대제) 글자를 분류한 당시의 운을 써서 지은 절구 20수를 민망 대제에게 기증하다'라는 시(詩)에 '김치깍두기'가 보인다.
 |
| 공주깍두기 축제 행사 모습 |
그런데, 한글로는 분명히 '김치깍두기'라고 번역해 놨는데, 한문으로 '염해(鹽?)'라고 쓰여져 있다. "염해족료기(鹽?足療饑)- 김치 깍두기로 배고픔 면할 수 있고 언앙산요슬(偃仰散腰膝)- 다리 뻗고 허리 펴고 쉴 수 있나니 금일이여사(今日已如斯)- 오늘 이렇게 지냈으면 그만이지 하수문래일(何須問來日)- 내일을 물을 필요 뭐가 있으리오" 위 시(詩)는 고려 말 도은 이숭인 선생의 시 일부인데, 번역은 2008년에 한국고전번역원 이상현 선생이 한 것이다.
그리고 어느 분이 번역했는지는 몰라도 인터넷에서는 '염해족료기, 막김치로 시장기를 면하기 충분하고'라며 '염해'를 '막김치'로 번역해 놨다. 그러나 '염해'는 결코 '김치깍두기'도 아니고 '막김치'도 아니다. '염해'는 백합과의 여러해살이 풀인 염교 장아찌다. 이 염교를 교자라고도 하고 해백, 해근,, 야산, 해백두, 소산(小蒜)이라고도 한다. 영문명으로 'Rakkyo(락교)'라고 하는데, 이는 일본명(菜芝, ラッキョウ)을 그대로 표기한 것이다.
염교는 주로 일식집에서 자주 대하게 된다. 이 염교를 '돼지파'라고 한다. 일부 전통 5일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봄철에 수확하는 돼지파 잎은 향기로운 양념의 재료가 된다. 알뿌리를 말렸다가 김치를 담글 때 몇 알 찧어 넣으면 시원한 김칫국물을 즐길 수 있다. 고려 말 도은 이숭인의 문집을 보면 우리도 일찍이 '돼지파'라던 염교를 이용해 장아찌를 담아 먹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염해' 즉 염교장아찌를 '김치깍두기'나 '막김치'로 오역(誤譯) 했을까? 대부분 한학(漢學)을 하는 분들이 식생활 문화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영향과 폐해는 크다. '한국고전번역원'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런 공공기관에서 내놓는 오역(誤譯)된 결과물을 일반인들은 대부분 믿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고전을 번역할 때는 한학(漢學)을 하는 분들 외에 분야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
근대기 교육자 방신영(方信榮, 1890-1977) 선생이 1913년에 쓴 『요리제법(料理製法)』에 깍두기·오이깍두기·굴깍두기·숙깍두기·닭깍두기 등 다양한 종류의 조리법이 적혀 있다. 깍두기를 만드는 방법은 무를 너비 2.5㎝, 두께 1.5㎝ 정도의 입방체로 썰어 소금에 절인 다음 고춧가루와 버무려 빨갛게 물들이고, 파·마늘·생강과 새우젓 다진 것을 넣고 고르게 버무려 담근다
그리고 1917년 쓴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을 보면 깍두기의 양념으로 꿀, 엿과 함께 설탕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1920년 당시 서울에 24개에 불과하던 설렁탕집이 몇 년 만에 100여 개로 폭증하면서 매콤하고 달달한 서울식 깍두기는 외식에 빠질 수 없는 반찬이 되었다.
'깍둑이무우나 혹 외(오이)를 골패짝만콤식 써으러 그릇에 담은후 고초 마늘 파를 잘게 일여넛코 새우젓국으로 간을 맛치고 오래동안 쥬믈러셕거 가지고 항아리에 담은후 물을 조곰만치고 뚝게(뚜껑)을 덥허두나리라.'
재야지식인으로 1930년 조선어사전편찬회 편찬원이었던 위관(韋觀) 이용기(李用基, 1870~1933)가 1924년에 쓴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깍뚝이와 외깍뚝이, 햇깍뚝이, 채깍뚝이, 숙깍뚝이 조리법이 나오는데 굴깍뚝이를 제외한 다른 깍뚝이에는 설탕이 들어간다. 이는 192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음식에 설탕을 넣는 음식 문화가 시작된다.
조자호(趙慈鎬, 1912~1976) 선생이 1939년에 쓴 전통 요리책 『조선요리법(朝鮮料理法)』에는 배추통깍두기, 굴젓무(깍두기), 조개젓무(깍두기), 오이깍두기 조리법이 나온다. 임신부가 먹는 정사각형의 정깍두기도 있고, 이가 안 좋은 노인들을 위한 숙(熟)깍두기도 있다.
정월 무렵이나 설날(음력 1월 1일) 전까지 햇무가 나올 때 조금씩 담그는 깍두기를 햇 깍두기라고 하는데 젓갈을 적게 넣고 생굴을 넉넉히 넣어 담그면 맛이 산뜻하다.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에는 숙(熟)깍두기 만드는 법이 나와 있는데 '무를 삶아서 오푼 장광으로 두푼 윤두로 썰어서 다른 깍두기에 넣는 약법대로 만들어 넣어 섞어서 항아리에 담앗다가 익은 후에 먹나니 노인을 위해서 매우 적당하니라' 심지어 수박껍질로 만든 수박깍둑이와 고기를 먹지 않는 스님들이 많이 먹는 젓국이 들어가지 않는 소깍둑이(1931년 9월 2일자 동아일보)도 있다.
궁중에서는 아주 작은 크기로 네모 반듯하게 썬 '송송이'를 사용했다. 중간한 무를 가운데 쪼개고 큰 무는 열 싶자 (십자)로 조개(쪼개) 만든 두쪽 깍두기, 잘잘한 무로 만드는 통깍두기(1940년 11월 1일 [월간 女性])도 있었다. 깍두기가 네모 반듯하게 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고 커다랗게 썰어놓은 지금의 섞박지와 비슷한 깍두기도 있었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깍두기 옆에 '무젓, 젓무, 홍저(紅菹)'라고 병기해놨다. 젓무는 조선 말기 편찬된 작자 미상의 『시의전서(是議全書)』에 조리법이 나온다. 물론 깍두기 조리법과 같다. 서울의 깍두기는 감동젓무 혹은 감동젓으로 불렀다. 작은 새우로 담은 감동젓이 들어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깍두기의 원형으로 생각되는 또 다른 음식은 섞박지다. 섞박지는 배추와 무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젓갈을 사용하고 무가 중심이 된 음식이다. 조선시대 중종 때 황해도 감사를 지낸 사재(思齋) 김정국(金正國1485~1541)이 쓴 『사재집(思齋集)』에는 '자하젓과 오이로 섞박지(交沈菹(교침저) 일명 감동겸)'이 등장한다. 3섞박지가 감동저 즉 자하새우 젓갈로 담근 김치임을 알 수 있다.
/김영복 식생활문화연구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27.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일대 돼지고기 구이·찜](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2m/05d/gettyimages-jv13876267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