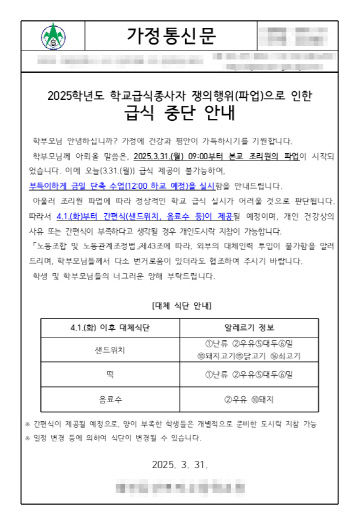|
| 오용준 한밭대 총장 |
사회적 대학의 이상과 개념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곳이 영국의 코번트리 대학이다.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산업대학에 해당하는 폴리테크닉 대학이 3만5000명 규모의 종합대학으로 승격돼 만들어진 이 대학은 영국의 명문대학 리그인 러셀그룹 대학들을 제치고 2018년에는 영국 12위 대학에 선정됐다. 2차대전 후 한때 전성기를 구가하던 도시인 코번트리는 유령도시로 불릴 만큼 침체기를 겪었지만, 지금은 이 대학으로 인해 영국의 문화도시(UK City of Culture 2021)로 선정돼 새롭게 활성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코번트리 대학의 자회사 격인 '코번트리 대학 사회적 기업(CUSE, Coventry University Social Enterprise)'에 비밀의 열쇠가 있다. CUSE는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를 키우는 공간이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기업 등의 비즈니스 교육, 창업지원, 허브센터, 생태계 구축 등의 역할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2018~2019년 기준 6667명의 학생, 교직원, 지역 주민들이 CUSE 활동에 참여하고, 15개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다고 한다. 1000명 이상의 학생, 교직원 등이 지역공동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코번트리 대학은 사회적 임팩트(social impact)를 강조한다.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고,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대학 내 30여 명의 교원과 40여 명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함께 꾸려가는 '사회 비즈니스 센터(Centre for Business in Society)'가 이러한 임팩트를 만들어 내는 방법과 실천적인 비즈니스를 연구하고 있다. 정부가 손을 놓은 지역의 빈 수도원에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된 공동체 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를 설립해 지역을 되살린 사례가 유명하다. 난민을 고용하고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청소회사 '스프링 액션', 버려지는 음식과 굶는 사람들은 연결하는 소셜 비즈니스 '리얼 정크푸드' 모두 코번트리 대학의 작품이다. 이러한 사회적 대학의 핵심 개념 중의 하나가 '앵커 기관(Anchor Institution)'이다. 도서관이나 병원 등과 같이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박고 관여하며, 지속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다. 예를 들어, 대학이 가진 부동산, 연구 자산 등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조달하고, 지역경제 주체의 교육, 고용, 인큐베이팅 및 협력망을 통해 지역재생을 이끄는 협업사업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 등의 사업을 통해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가고 있다. 필자가 재임하고 있는 한밭대의 경우에도 지역사회상생센터가 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센터가 운영하는 대전지역사회문제은행은 지역의 문제를 대학의 구성원과 연결하여 해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노력해야 할 영역과 극복해야 할 과제가 대단히 많다. 무엇보다 제 역할을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 우리 대학의 경우 2년 전에 새롭게 개설된 '지역의 이해'라는 학과목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대전의 산업과 역사를 소개하고, 전망있는 지역 내 중견·강소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앞으로 우리 대전의 대학들이 함께 협력해 지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 /오용준 한밭대 총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117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유통]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1628000045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