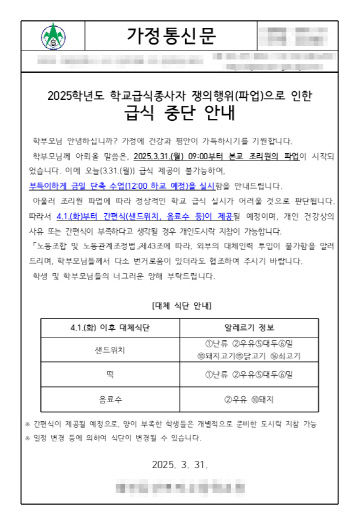|
| 김충일 북 칼럼리스트 |
해진 뒤 거둔 낙엽 속엔,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미움과 오만의 굴레를 훌훌 벗어던지고 거듭 태어나 '성공한 성숙함'으로 열매 맺은 밝음이 숨어 있다. 한편 그 속엔 아직껏 증오와 자만의 사슬에 질끈 동여매인 채 치기(稚氣)의 아픔 속에 머무르는 '실패한 미성숙'의 그림자도 있다. 두 빛깔의 '엇갈린 또 다른 성취'가 자리 잡고 있다. 한 해의 후반부로 다가서고 있는 지금. '되돌아보는 사유의 작업'을 놓치지 말자.
내가 이룩한 성취를 가늠하겠다는 생각 자체에 숨은 위험은 만만치 않다. 과연 지금까지의 일상에 충분히 거리를 두고 공정한 평가를 내릴 초월적 관점이 가능 할까? 거리를 두고 보면 우리가 욕구했던 목표는 성취했어도 허망해보이거나, 새롭게 유혹하는 목표에 더 마음을 빼앗긴다. 게다가 성공은 당연히 이룩했어야 하는 것인 반면, 실패는 늘 계속해서 마음을 후벼 판다. 우리는 늘 아픈 것만 기억하려고 한다.
빛바랜 티브이의 길 잃은 정치 쇼를 지나치며, 설익은 자식들의 성적표를 읽으며, 더욱 어려워진 통장의 잔액에 눈 맞추며, 치열하게 빨리 달려온 나를 나무라거나 격려하는데 인색하지 말자. 그 작업은 내가 일군 일상의 성취를 평가하겠다는 생각 자체에 위협이 만만치 않음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하지 않는(undoing)일을 함(doing)"이 성숙(maturity)임을 깨달아 그것을 일상의 중심에 놓고 그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다.
성숙은 황금물결로 일렁이던 추수를 마친 들녘처럼 도착 완료된 정지 상태, 그리하여 한적하고 고요한 지혜의 오아시스에서 삶을 관망하는 절정기가 아니다. 일어난 일, 지금 일어나는 일, 그리고 (다시 상상되었다가는 곧 기다리는 미래로 합쳐지는) 우리 과거의 결과사이에서 근본적인 경계가 해체되는 것이다. 경계의 넘어섬은 위험을 무릅쓰게 하지만 그 위험은 더 큰 그림, 더 큰 지평을 향한 것이다.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실제로 전혀 통제되지 않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때 거짓된 피난처, 거짓된 계산, 대안적 피난처가 우리를 유혹한다. 과거에 도망쳐 숨었던 장소에 숨을 수 있다고, 현재를 고립시킬 수 있다고, 미래를 확실히 예측할 수 있다고 구슬린다. 하지만 바로 경계의 넘어섬과 위장된 경계선의 유혹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미성숙의 성공'이란 자신의 일상을 잘 조절할 수 있다.
성숙함이란 더욱 많은 '얻음과 일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진 힘으로 어떻게 해야 좀 더 잘 '잃어버릴 수 있을지, 내려놓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헤아릴 줄 아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확신을 굳히는 일이다. 하여 '성숙한 실패'는 '포기와 내어줌의 훈련'이고 '남은 것과 진짜인 것을 보는 능력'이며, 다가온 실패를 기꺼이 껴안음으로 일상이 가져다주는 '아픈 힘'이다.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피조물일 따름이다. 일상의 상투적 진부함을 떨치지 못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동물이다. 이웃이 덤덤하게 건네준 커피 한잔이나 따뜻한 미소를 고맙게 여기며 삶의 한 복판을 뚫고 흘러갈 자신의 통로를 재구성하며 나아가 보자. 이 가을, '성숙한 실패와 미성숙의 성공'이란 역설이 가져다주는 지혜의 터득이 가능하다는 수용적 자세가 소중한 위로가 되었으면 싶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117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유통]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1628000045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