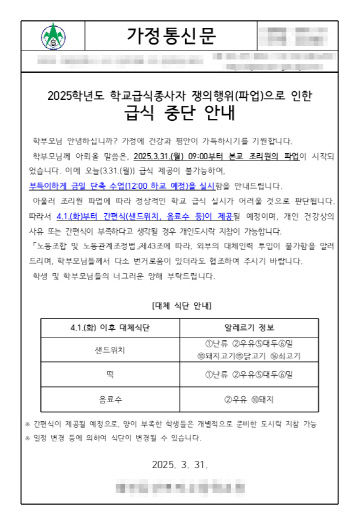|
| 신동호 한남대 교수 |
지역 불균형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한 노력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정책은 있었지만,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지방에 대규모 공업도시가 만들어진 것 등을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결과를 보면 성공이라 평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아직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성장격차가 감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간 균형발전문제가 다른 나라에서도 과제가 되고 있는가? 그러한 정책이 성공을 거둔 예가 있는가?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적 발전을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추진한 예가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지역 간 균형적 발전을 기회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인식한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1980년대 초 파리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 간의 불균형적 성장을 문제로 인식하고, 여러 가지 대응책을 구사했다.
사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우리와 달리 중세 때는 제후국가였기 때문에, 제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이 발전했다. 왕과 황제가 있었지만, 왕권이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하고 자주 바뀌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 여러 곳이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근대화된 유럽국가들은 지역적으로 이미 분권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지역이 비교적 골고루 발전할 수 있었다. 유럽 국가 중, 지역 간 균형적 발전을 잘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지역 간 인구분포를 보면 지역균형 현상이 확연히 드러난다. 즉, 독일 최대의 도시는 뮌헨인데, 인구가 약 450만 명이다. 그다음 큰 도시가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인데, 그들도 약 400만 명이다. 독일에는 우리와 달리 1000만명 도시가 없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인구의 지방분산, 균형적 분산이 이루어져 있다.
혹자는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나라에서 수도권 과밀이 무슨 문제냐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처럼 하나의 도시국가로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도시국가 아니다. 분명히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존재하고 있다.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이 서울의 배후지역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지역 간 엄연히 존재하는 차이를 인정하고, 각 지역이 가진 특색과 장점을 살려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야 하고 지역 간 투자가 골고루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좁은 국토 전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언제 태어나더라도 소외되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비수도권에서 성장하고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균등한 기회를 갖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불평등과 소외를 완화하는 것이 인구 과소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117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유통]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1628000045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