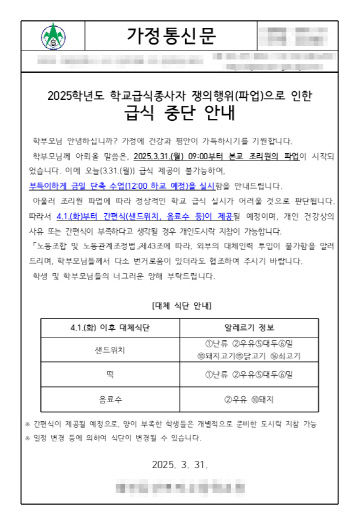|
| 김충일 북 칼럼리스트 |
우리네 삶은 하고 싶은 일과 되고 싶은 모습 사이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무심하게 흘러간다. 문득 '시간을 쓰는데 마음을 쓰지 말고 마음을 쓰는데 시간을 쓰라'는 어느 성자의 『지혜의 서』에 심통을 부리며 딴지를 걸고 싶어진다. 그렇게 세월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이야기, 우리가 현재 특권이라고 여기며 머무르는 이야기,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에게 막 일어나려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생생하고 서로 깨어주는 각성(覺醒)이란 선물을 준다. 그 깨달음 속 삶의 이야기는 삶의 거친 상처를 보듬으며 쉼터를 마련하고 소나기를 피하고, 더위를 막는 그늘이 되어 존재한다.
눈 아린 햇살보다도 따뜻한 눈길, 뜨겁거나 차지 않은 차분한 얼굴로 다가오는 그늘은 여름의 지난한 고통과 애씀이 만들어낸 깊숙한 숲을 뚫으며, 어둠을 분해하고, 너와 나, 다르면서도 어우러지는 그 사이에서 삶의 단맛과 쓴맛이 우러나는 곳이다. 또 그곳은 저물녘 황혼에 자주 늦어 지각했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셀 수 없는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공간이다. 지난여름 더위에 지친 음침한 이야기는 이제 다가온 가을 숲속 길 그늘 속에 숨어 있던 옹달샘에, 제대로 된 한 모금 성찰의 감로수가 되어 스며든다.
성하의 열기와 폭우를 견뎌낸 고투(故鬪)의 기록에 묻어있는 그늘은 외로움이란 내 안의 낙엽을 태우는 이야기되어 흐른다. 외로움은 자기 집으로 나를 이끄는 자기장이자 고립이란 삶의 핵심으로부터 나를 밖으로 내밀어 함께함을 이루게 하려는 손짓이다. 그늘 속 외로움은 타인을 맞이할 마음의 문지방을 넘는 기회이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방에 스스로를 위치시키고 나와 대면하는 것이다. 결국 외로움이란 삶의 내방(內房)에 웅크린 다른 빛깔이 된 '나'를 태우면서, 다른 몸들과의 접촉, 지성이나 상상력과의 접속을 통해서, 그늘 속 생성을 이끌어내는 다른 움틈이다.
가을에 짙은 그늘은 내 안의 성숙함의 흔적이다. 그늘 속 성숙함은 도착을 마친 정지 상태가 아니라 일어난 일, 지금 일어나는 일, 그리고 다시 기다리는 미래로 합쳐지는, 우리의 과거와 결과 사이의 근본적인 분리가 허물어지는 풀어짐이다. 하여 그늘은 우리 삶의 서로 다른 시기 사이, 삶과 죽음 사이, 당당했던 자신과 우울하고 무력해 상처받았던 자신 사이의 근본 경계를 깨뜨린다. 그늘 속에 짙어진 성숙의 열매는 진정한 침묵, 드넓음의 수용, 근원적인 내어줌으로써만 영글어질 수 있다. 성숙함은 포기와 내어줌의 훈련이고 남은 것과 진짜인 것을 구별해 볼 줄 아는 능력이다.
누군들 가을과 함께 보내준 그늘의 여유로움을 싫어할까. 여름의 짙은 녹음이 만들어준 그늘 속 아스라한 외로움과 성숙함을 품어 안아보자. 이제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삶, 독기를 버리고 깊이 가라앉은 삶, 미련 없이 자신을 비워내는 삶을 살아보자. 급기야 그늘의 빛을 맞으며 지난여름을 내가 먼저 떠나보내자. 이미 다가온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삶은 그늘 속 보행(步行)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117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유통]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1628000045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