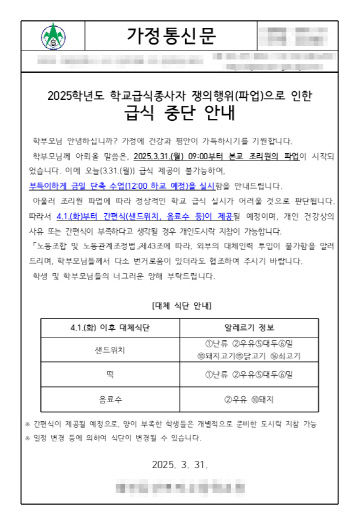|
| 한남대 신동호 교수 |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다. 남북분단은 물론 좌우대립, 지방쇠퇴, 빈부격차, 노인빈곤, 높은 자살률, 세대간 갈등 등이 그 대표적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전 국민, 특히 청년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기성세대들은 과거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바에 도취되어 있다. 그러한 경험에 입각하여 젊은 세대를 탓하기도 한다. 끈기가 없고, 까다롭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며, 결혼과 자녀출산을 꺼려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성취에 도취된 정도가 더 심한 기성세대일수록 청년세대에 대한 그러한 불평이 더 많은 것 같다.
청년들이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기성세대가 성취해 놓은 것을 크게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로 인해 인정받지 못하는 기성세대가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청년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 나라의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어떤 세대에게나 불안하게 하는 요소이지만, 그 피해를 직접 감수해야 하는 세대는 청년세대다.
1960년대 이후 우리는 고성장시대를 살았다. 그때에는 미래가 희망적이었다. 자전거가 흔하지 않았고, TV가 없던 시절에 우리는 마이 카(My Car)시대를 꿈꾸면서도 과연 그런 세상이 올지에 대해 의심했다. 그러나 지금 가정마다 차 없는 집이 드물다. 심지어 식구마다 차를 한 대씩 가진 집도 있다.
그런데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가 그렇게 녹녹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불안하고 불편한 점도 적지 않다.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비물질적인 측면, 즉 안전과 안정, 여유, 공평, 희망 등과 같은 시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사회가 그렇게 훌륭한 것만은 아닌 것이 사실이다.
형식적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스페인 수준을 능가하였고,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에 가입한 지도 20년이 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가 경쟁력이나 청렴도, 출산율, 노인 빈곤율, 자살률 등과 같은 지표를 보면 아직도 우리는 선진국이 아닌 것 같다.
청년은 국가의 미래이다. 국가의 미래는 이들에게 달려 있다. 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나라가 희망적인 나라이다. 지금까지 추구해 온 성장 중심의 국가의 정책목표가 이제는 변해야 한다. 기성세대의 기대가 아니라 청년세대의 바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성세대가 추구했던 부(富)와 권력보다는 한 차원 높은 가치를 기대한다. 앞으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경제적,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부디 적극적으로 안전과 안정, 공평과 희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청년에게 미래가 있고, 국가의 장래에 희망이 있다.
최근 메스컴을 장식한 각종 사건사고와 새만금을 배경으로 일어난 헤프닝은 그런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그것을 두고 국가적 지도자들이 서로 논쟁하는 모습은 여러 사람을 실망케 한다.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사건과 사고를 접할 때마다, 안전하고 안정되며 풍요로운 사회를 국가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를 생각해 본다. 그들에게 정착된 국가적 지도이념,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사회시스템을 생각한다. 그런 시스템으로 품격있는 삶을 누리는 국민 일상을 상상하면서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럴 때 우리나라도 청년에게 미래가 있는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117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유통]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1628000045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