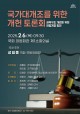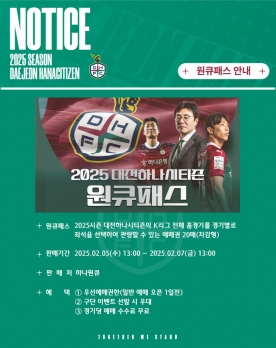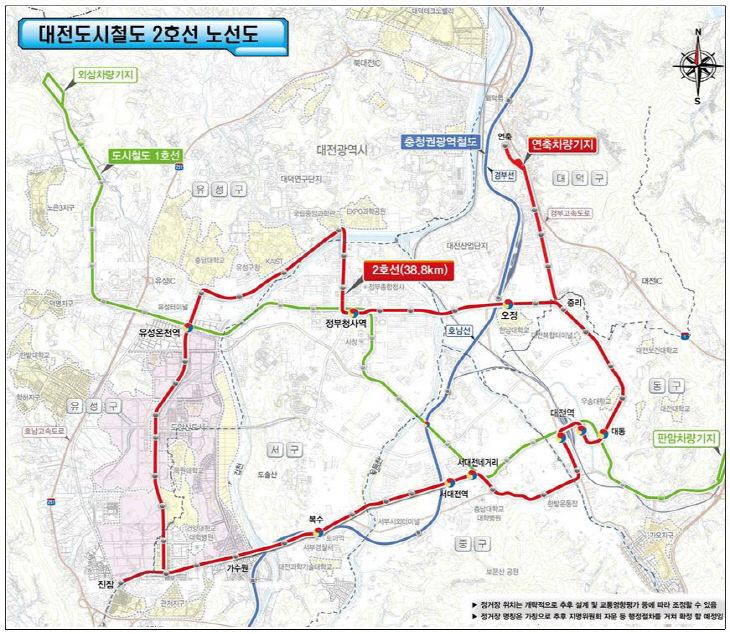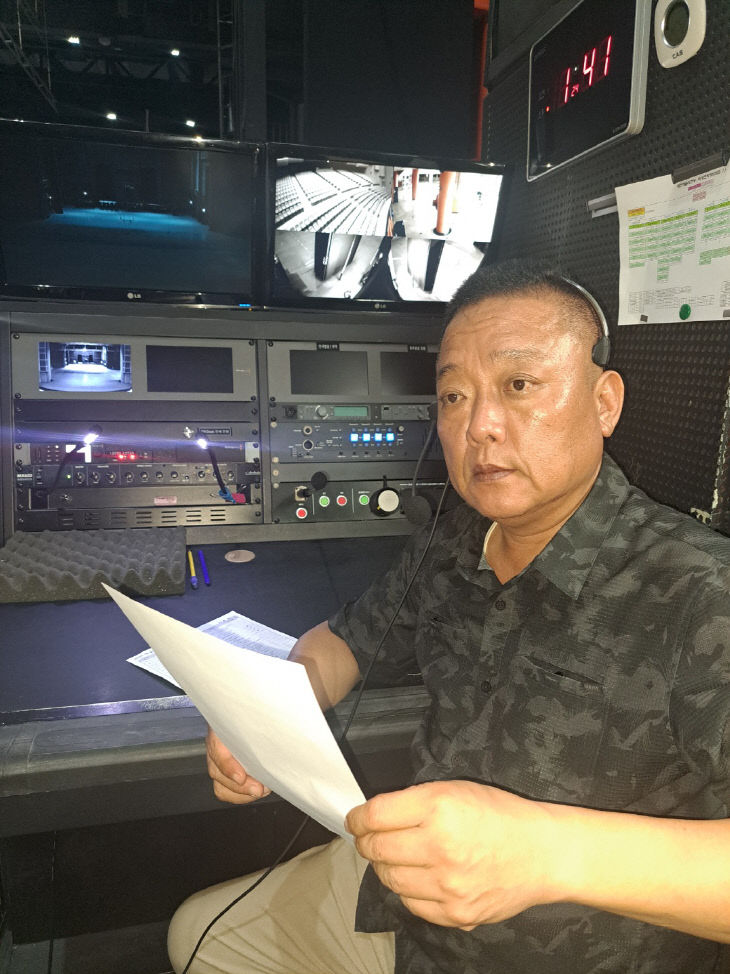 |
| 윤기선 과장 모습 |
공연예술이 메카인 대전예술의전당에서 근무하는 윤기선 무대예술과장도 그중 한 명이다. 윤 과장은 무대 관리 경력만 35년의 베테랑이다. 서울예술의전당에서 시작해 2003년 대전예당이 생긴 이래로 20년간 조명과 음향, 무대 장치, 소품 등을 총괄해왔다. 그동안 무대 뒤편은 판도라의 상자와 같았다. 현실적인 모습들이 자칫 공연의 환상을 깰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무대 뒤에도 항상 서사는 있었다. <편집자 주>
 |
| 대전예술의전당 모습 |
윤 과장은 "주 무대의 규모는 98평(323㎡)인데, 전체 무대 규모는 428평(1414㎡)"이라며 "장르와 연출에 따라 사용되는 무대 크기, 무대 장치가 다르고 하물며 사용되는 스피커의 개수도 다 다르다. 오케스트라 피트도 경우에 따라 60~70석 규모의 객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광활한 무대는 공연 때마다 바뀐다. 특히 대전예당은 대관 수요가 많아 매년 공연장 가동률은 풀 가동 수준인 90% 이상에 육박한다. 종합예술공연장이다 보니 클래식, 오페라, 연극 등 장르에 맞게 무대 세팅하고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
| 무대 준비가 진행 중인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모습 |
"10m 정도의 벨벳 소재 배경막은 엄청난 무게가 나가요. 전동장치가 있지만, 기계의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야 하는 만큼 도르래 방식으로 스태프들이 직접 쇳덩어리의 추를 달아 양쪽 무게를 맞춰야 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빠잡이’라고 부르는데, 저도 이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아무나 시키는 일은 아니예요. 2~3년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죠."
 |
| 공연이 준비 중인 무대 위 모습 |
"당시만 해도 뮤지컬 등 전국의 좋은 순회공연들은 관객이 적어서 공연지로 대전을 빼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전예당이 생기기 전까지는 큰 공연을 할 수 있는 1000석 이상 규모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서울 예술의전당 같은 큰 공연장에서 하던 뮤지컬을 대전에서 하려면 세트나 장치물이 다 못 들어와서 몇몇 씬들이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대전에서 공연을 본 사람들이 서울 공연과 큰 차이를 느껴서 지역에서 공연을 안 보려고 했던 거예요. 대전예당이 생긴 후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깨기 위해서 매번 순회공연을 하는 연출자하고 제작사한테 한 씬도 빼지 말고 하물며 배우가 침 뱉는 거까지 빼지 말라고 강조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 관객을 속이는 행위는 지금은 못하죠"
무대를 총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안전'이다. 스태프들은 공연을 준비할 때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 이날 공연장을 소개하는 도중에도 윤 과장은 그 누구도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무대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했다.
"의외로 공연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특히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사고가 빈번하죠. 오케스트라 피트가 내려가 있는 걸 알지만, 깜깜한 곳에서 바쁘고 급하게 움직이다 보면 스태프나 배우가 떨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아까 보셨던 쇳덩어리 추가 천장에서 떨어져서 식물인간이 된 사람도 있고요. 안전문제 때문에 연출자, 출연진하고 의견이 부딪힐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위험한 연출은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품이 좋고 명작이라도 사고가 난다면 소용이 없죠"
 |
| 캣워크 모습.이곳에서 천장에 달린 48개의 배턴을 관리한다. |
"아까 공연장의 10분의 1도 보지 않았지만, 이제 공연을 볼 때 감동은 10분 1로 줄어들 거예요. 공연이 어떻게 준비되고 진행되는지 알게 되면 신비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 항상 무대 뒤쪽은 깜깜해야 해요. 지금도 이 나이에 과장이라는 직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한 복장을 입는다는 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젊을 때부터 양복보다는 긴바지에 티셔츠 그것도 검정색만 입었어요. 밝은색 옷을 입으면 객석에서 보일 수 있거든요. 주말 저녁에도 공연이 있어 요일 개념도 없죠. 이번 인터뷰로 제 개인적인 것보다는 무대 뒤에도 누군가의 노고나 애환이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공연장의 변화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클래식의 경우 고전으로 갈 수 있어도 뮤지컬이나 오페라에서 변화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극장 내 공연장에서 그 장비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쓰임에 따라서 종류도 다르고 장비 규모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기본적인 것은 현재 공연장이 다 갖추고 있지만, 더 전문적이고 발전적인 공연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신개념의 공연이 들어왔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기술력도 같이 제휴할 수 있어야 해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홀로그램 기술을 공연장에 적용해보고 싶어요."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27.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일대 돼지고기 구이·찜](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2m/05d/gettyimages-jv13876267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