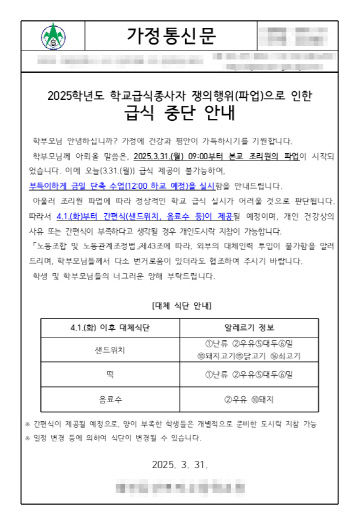|
1980년대 후반에 고등학교를 다녔던 필자는 학력고사라는 타이틀로 대학입학시험을 치렀던 터라 실상 수능을 경험해 보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에 대한 이미지는 서열화를 위해 필요한 평가 도구로 그려지고 예전의 학력고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 물론 요즘 대학 입시 전형에서 수능은 예전 학력고사처럼 대학 입시를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다. 그렇지만 2023년 올해도 수능은 대학 입시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그 존재감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다.
1994년부터 시작된 수능(대학수학능력)은 앞서 필자가 경험한 학력고사의 단점을 보완한 대학 입학시험 제도로서 교과목 중심의 암기 위주식 시험 방식에서 벗어나 논리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이렇게 좋은 취지로 탄생한 지 올해로 30년째가 된 우리의 수능은 왜 '킬러 문항'과 친구가 되었을까?
수능에게 물어보니, 변별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란다. 수능은 변별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킬러 문항'을 친구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친구가 나쁜 친구라고 한다. 왜냐하면 '킬러 문항'이 사교육의 나쁜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이란다.
그러면 사교육은 왜 나쁜 친구로 낙인찍혔을까? 사교육에게 물어보니,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교육격차'라는 친구와 친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대답한다.
'교육격차'를 찾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사교육과 친해졌는가?"를 물어본다면 과연 우리는 '교육격차'로부터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교육격차란 교육 투입의 부족으로 또는 결합 과정이 잘못되어 생기는 교육 산출의 차이 정도로 정의된다(교육학용어사전, 1995). 교육격차는 스스로 작동할 수 없는 존재이다. 교육격차가 작동될 수 있는 조건은 사람이 만드는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격차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과 교육제도가 교육을 경쟁과 차별로 서열화시키고 시장 논리에서 교육의 효과성을 찾고자 한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로 인하여 교육 불평등이 야기된다는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격차 입장에서 보면 사교육의 나쁜 친구로서 '킬러 문항'을 만든 주범으로 내몰리고 또한 가만히 있는 수능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수능을 소위 '문제아'로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으니, 교육격차는 할 말이 참 많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것이다. "왜 나한테 그래?"
그렇다! 우리가 만든 교육격차를 그저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라며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에만 빠져 있다면 '교육격차'는 계속에서 우리에게 억울하다고 호소할 것이다. 필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알파벳 'K'에서 찾고 싶다. 예컨대 한류를 상징하는 알파벳 'K'를 교육격차와 만나게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단순한 문자 결합으로는 'K-교육격차'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격차를 사라지게 한 사례를 일컫는 것으로서 또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의미가 담긴 대명사로서 'K-교육격차'가 언급될 수 있다면, 이것으로 'K-교육격차'는 새로운 가치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와 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의미하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격차 극복 사례를 상징하는 'K-교육격차'가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세계화를 대표해왔던 K-팝, K-드라마에 이어 새로운 한류를 이끄는 신박한 주역으로 우뚝 섰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남궁선혜 대전보건대 유아교육과 교수·부속유치원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117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유통]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1628000045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