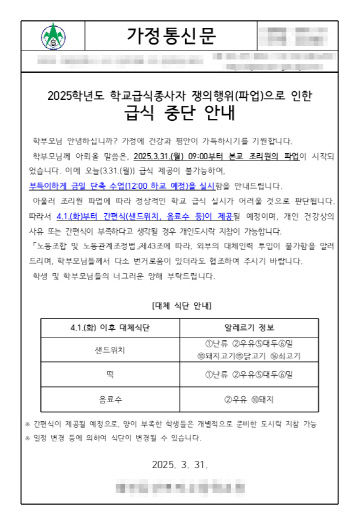|
| 김명숙 수필가 |
시성(詩聖) 두보는 그의 시에서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하여 인간의 수명은 칠십 세를 넘기기가 매우 드물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갈마아파트에는 1980세대 가운데 100세를 넘게 사시는 분들이 여덟 분이나 계십니다. 이른바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가 아니라 '인생일백고래희(人生一百古來稀)'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늘어나는 수명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은 나이가 드는 병이고, 다음으로 무서운 것은 사랑하는 자손들로부터 냉대를 받는 것이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 수족이 불편 할 때 애지중지 모실 자녀들이 있는지요.
사람의 몸에는 각종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의학의 발전과 좋은 식자료들로 질병들을 고칠 수 있고, 영양을 채울 수 있지만, 나이를 먹는 것과 자손들에게 냉대받는 것은 어떤 의학기술로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100세를 사신 노모를 위해 잔치를 벌인 부여군 외산면 어느 효자로 소문난 '상수연(上壽宴)'행사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600년을 이어온 종가인데 한 마을에서 200년 넘게 살아온 파평 윤씨 정정공파 12대 종부 채복록 여사의 상수연 잔치였습니다.
200년을 한 마을에서 종가를 지키기 위해 사셨다 합니다. 자손들은 직업을 찾아 시골을 떠나고 늙으신 노모가 홀로 남아 꿋꿋한 삶을 사셨다 합니다. 그러나 파평 윤 문의 이 가족의 자손들은 어머니를 현대판 고려장인 요양 병원에 모시지 않고 서울로 모셔가 함께 살았다 합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어머니께서 지키며 사시던 옛집을 찾아 하룻밤을 지내고 상경하기를 반복했다 합니다.
'상수연'의 '상수'는 사람의 수명을 상, 중, 하로 나눌 때 가장 많은 나이로써 100세를 말하지요.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100세를 맞는 장수하신 분은 흔한 게 아닙니다.
상수연을 맞이한 어머니께서는 100년을 살면서 앞만 보고 사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잔치에 오신 손님들과 자손들에게 "지난 세월이 먼지와도 같이 사라진 세월이라" 표현하시면서 "지금은 눈도, 귀도 어둡고 다리 힘도 빠져 자손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내 힘으로 일어나 밥 먹고 세수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긴다. 생각해 보면 100년이란 세월도 하루, 한나절 같구나. 젊어서 이곳 무술에서 새벽 별 보고 일어나 왼종일 들에서 일하다가 저녘 달빛 보고 들어와서는 아궁이에 불을 때서 저녘 밥상을 차렸으며, 쉴 틈도 없이 바빠 농사짓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년이라니... 화 냈던 일, 형편 때문에 하지 못한 일들만 생각난다. 100년이라지만, 다시 돌아보면 한여름 밤의 꿈만 같다.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사는 하고 가야겠다. 지난 100년 동안 나를 아는 분들과, 내가 아는 모든 분들, 다 고맙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 다 행복하세요."라고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수연 잔치를 마치신 후 진짜 생신 다음 날 새벽 소천하셨다는 부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요. 100년을 사시고 자손과 친인척들을 상수연에서 모두 만나시고 덕담을 나누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날 하신 말씀이 상수연 잔치를 하며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됐던 것이지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 끝의 모습입니다.
이는 한 가정이 자연스레 해체되는 모습이지요. 젊은 시절 한참 자식들이 태어나 자랄 때 식구들이 모여 웃고 울고 떠들고 먹으며 집안이 시끌벅쩍하게 들썩거리던 대가족의 기쁨과 그 사랑은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돼버렸지요.
세월 따라 그런 오붓한 시절은 점차 사라지고 자식들은 제각기 자기 일, 자기 가정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고, 버팀목이던 부모님은 병들어 쇠잔해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을 떠나면 그 가정은 허물어지듯 해체돼 버린다는 사실!
그러나 백 세를 사시면서도 요양원에 모셔지지 않은 이 할머니는 자손들의 효성으로 인해 건강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를 사신 부모님께 해드리는 '상수연(上壽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117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유통]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1628000045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