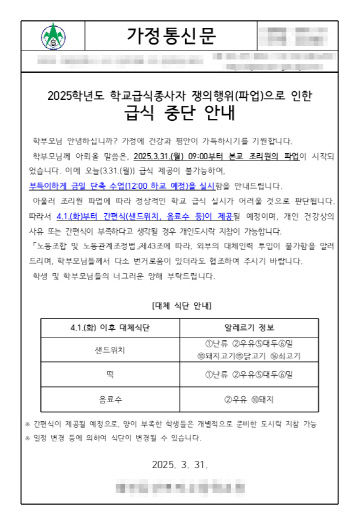|
| 이희학 목원대 총장 |
대한민국은 1970~80년대를 지나며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관한 관심만큼 우리가 겪은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필자의 어린 시절에는 정수기라는 물건이 없었고 공기청정기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다. 동네에서 뛰어놀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 어떤 가게에 가든 주전자에 물이 담겨 있었고 물을 마시는 데 돈을 낼 필요가 없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정수해서 물을 마시거나 물을 사서 마시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았던 시기였다. 1990년대가 돼 생수를 법적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됐는데, 처음에는 물을 사 먹는 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며 농담조로 이야기하곤 했다. 현재 고급 생수는 휘발유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다. 이런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사건에는 1980년대 수돗물 중금속과 발암물질 검출, 1990년대 초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등이 있다.
청정한 공기에 대한 필요성도 1980년대를 전후해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건설에 사용된 자재와 내장재에서 호흡기와 피부에 악영향을 끼치는 물질이 배출돼 국민 건강 문제로 대두되는 일들이 생겼다. 이른바 새집증후군이라는 이 새로운 질병은 두통, 피로, 호흡곤란, 천식, 비염, 아토피 등을 동반했다. 교과서에는 영국의 산업 혁명을 예로 든 스모그 현상에 관한 설명이 실렸고,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공기청정기는 사업장과 가정의 필수품이 된 지 오래고 이제는 자동차 엔진이 탄소를 뿜어내며 온실 기체를 생산하는 동시에 차 안의 공기는 청정기가 깨끗하게 해주는 모순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관련 법은 1963년 제정된 공해방지법이다. 실제 시행규칙은 1967년 제정됐지만, 경제 활동이나 실생활에는 거의 적용되지 못했다.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서서히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줬다. 현재는 물, 토양, 자연, 대기 등 여러 환경보전법으로 세분돼 있다. 미국 최초의 환경에 관한 법률은 1899년 하천 및 항만법이지만, 환경에 관한 대부분의 실제적 법률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 제정되고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환경에 대한 인류의 대응은 이제 막 시작된 것과 다름없다.
대학은 환경과 생명의 관점에서 자연, 인간, 사회, 예술, 과학, 정치와 경제를 교육해야 한다. 과거의 경제적 관점에서는 더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미덕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생산은 곧 탄소의 배출을 의미하고, 탄소는 지구 온실화를 가속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현재 생산과 소비는 환경과 생명의 관점에서 더 이상 미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강의를 개설하고 교육 과정을 개발해 인간의 활동이 다른 많은 생명체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이미지와 영상을 통해 지구 환경의 변화를 보고 느끼게 해줘야 한다. 환경에 관한 법률을 가르치고 세계의 국가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협력하고 있는지 알게 해줘야 한다. 모든 학문 분야를 환경과 생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적용할 수 있도록 생태적 안목과 통찰을 갖추게 해줘야 하고, 지구 환경에 관한 과학 기술과 지식뿐만 아니라 철학과 윤리를 다시 세워야 한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생명의 고귀함을 적어 내려갔던 문인들의 작품을 통해 생태 감수성을 길러주고, 음악과 미술을 통해 소리 내고 표현해야 한다. 교육을 통해 환경과 생명에 대한 태도와 관점을 바꾸는 것이 지구와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생존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학 교육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이희학 목원대 총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117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유통]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1628000045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