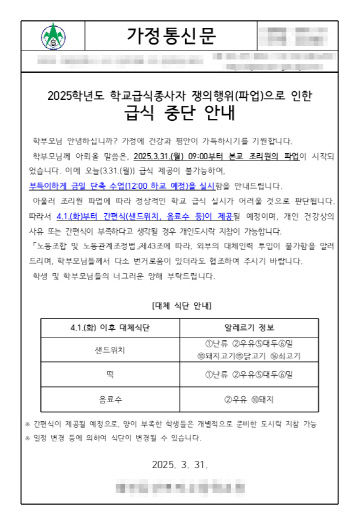|
| 김충일 북 칼럼리스트 |
우리는 삶이란 마당에 내려쬐는 밝은 햇살을 받으려 애쓸 때, 짙게 드리운 그늘의 틈새에 쌓인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 종종 '주름의 밭'에 씨앗을 심고 가꾸는 일에 어긋나거나 어긋 내곤 한다. '그늘'이라는 말은 일상의 신산고초를 통해 얻는 두터운 고난의 체험들이 켜켜이 쌓여 삶의 생명력으로 승화된 삶의 무늬를 이르는 말이며 주름 꽃은 연륜과 세파가 남긴 흔적이자 삶의 생명성을 알리는 표식이다. 오랜 시간의 숙성 끝에 터져 갈라진 혹은 세파에 의해 굴곡진 그 흔적, 그늘. 그늘의 역설적 작용을 통해 비로소 삶은 생동하는 주름의 매듭으로 다시 풀어져 나간다.
그늘,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처지나 환경에 처했을 때, 기쁨 속에서는 눈물로, 아픔 속에서는 밝음으로 말한다. 그것은 결핍의 순간에도 채울 대로 가득히 채우고 오히려 남음의 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밝음의 빛을 밝힌다. 그것은 근심스러움이나 불행의 어두운 상태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단한 꿈을 한 때 쉬어가게 하며 밝음의 틈새를 열어준다. 혹, 밝음의 뒤편에 서 본 적이 있는가? 밝음과 그늘은 늘 함께 한다. 모든 삶의 환희 속에 고뇌가 내포되어 있듯, 상처는 새살로 돋아난다. 이렇게 주름은 신체적 흔적을 품은 영적·심리적 풍경으로 거듭 태어난다.
밝음과 그늘의 뫼비우스적인 어울림이 가져온 의미 생성의 틈이 주름이다. 그 틈은 삶의 전환점으로, 위안과 안식의 자리로, 재생의 터로 변주된 삶의 흔적이다. 주름은 죽음을 허락한 늙음처럼, 넉넉하게 자유를 수락하며, 삶의 상처가 덧난 자리를 섬세하게 품어 안으며, 무의식 속에서 꿈틀대는 밝음에의 갈망을 만들어간다. 때론 삶의 질서를 뒤 흔들면서 전복시키고 때론 탈주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렇게 주름들은 살아 움직이는 그늘을 키우고 짙게 삶 속에 드리우다가 살아 숨 쉬는 생명으로 자라나 삶의 이랑에 자리 잡는다.
주름의 흔적과 결을 그리며 사는 것은 사람이 밝음과 어둠 사이의 경계에서 어떻게 사는지 이해하는 것. 밝음만 있는 완벽한 삶은 불가능하다. 완벽함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결국 책임지지 않으려는, 예외가 되려는, 그리하여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으려는 사람이 되려는 시도다. '주름 꽃'을 만들어 가는 우리네 삶의 흐름은 끊이지 않는다. 그 흐름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우리 자신, 우리와 함께 있는 이들, 심지어는 아직 스스로는 경험하지 못했으나 남들은 이미 인식하고 있는 자기 일부분에 대한 단서다. 그늘과 밝음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저 벗어날 수 없을 뿐.
우리네 삶의 이야기 속을 들여다보면, 밝음의 날의 배후에는 그늘 같은 날이 있고 밝음을 맞이했다고 해서 기쁜 것도 그늘이 졌다고 줄곧 슬픈 것도 아니다. 그늘이 한숨 돌릴 휴식처가 되기도 하고 뜨거운 밝음의 순간을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렇기에 밝음과 그늘에 담긴 모든 순간을 아끼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닐까. 분명 삶의 밭에선 '밝음과 그늘의 조화로 생명을 피워내는 주름 꽃'이 일 년 내내 피고 진다. 5월의 끝 날이다. 태풍 마와르가 빠져나가며 데리고 온 습도 높은 무더위를 견뎌 내실 어머니의 '주름 꽃'에 문득 입 맞추고 싶다.
/김충일 북 칼럼니스트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117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유통]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1628000045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