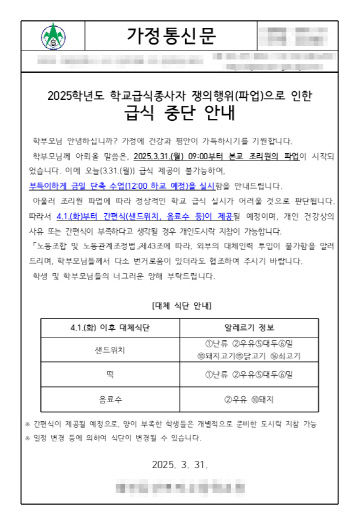|
| 김태열 수필가. |
'논어'의 '자로편'에 공자와 초나라의 실력자인 섭공(葉公) 간에 정직에 관해 벌어진 이야기가 나온다. "섭공이 우리 고장에 아버지가 양을 훔치니 이를 고발한 착한 아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공자는 자기 향리에서는 아비는 자식을 숨겨두고 자식은 아비를 숨겨두는데 곧음은 그 속에 있다"라고 말한다. 공자의 그 말이 동아시아의 공동체를 이끈 도덕률이었다. 서구사회가 유교권 사회를 법이 아닌 인정에 이끌리는 문화라고 비난하는 근거이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지금도 나와의 친밀도로 일이 처리되는 '관시' 문화가 퍼져있다.
효孝는 고대사회로부터 근대까지 예禮의 뿌리이자 중심이었다. 그 바탕 위에서 충忠과 신信으로 확장되어 사회질서가 유지되었다. 효는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 고유의 특성이다. 다른 포유류는 새끼를 낳아 기르기는 하여도 일정 기간 지나면 그걸로 끝이다. 효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인지, 학습으로 얻어지는 것인지는 논란이 많다.
수천 년을 이어온 효의 개념이 뿌리째 뽑히고 있다. 부모가 상을 당한 상갓집에 가도 상주들은 마음속에 슬픔을 쟁여놓지 않는다. 그 자리에는 누가 오는지를 헤아리는 거래의 법칙이 흐르고 있다. 불과 백 년 전만 하더라도 당연했던 삼년상은 전설이 되었고 삼일장 모시기도 버거운 세상으로 변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137억 년 우주의 역사, 앞으로 우주의 시간이 다하는 날까지도 단 한 번 있을 사건이다. 그런 기막힌 인연이라도 슬픔을 머금고 살기에는 너무 바쁘고 인간관계가 분분하다. 게다가 점점 나이 든 자식이 늙은 부모를 보살피는 세상이다. 내 한 몸 버티기도 버거운데 벅차다. 자연히 인생의 끝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요양원에서 매듭지어진다.
세상이 너무 변하고 있다. 비혼이거나 결혼해도 자식은 아들딸 구분 없이 하나거나 잘해야 둘에 불과하다. 대부분 시골이 아닌 도시에서 태어나 고향의 정서를 잃어 가족 공동체의 구심점이었던 제사 문화도 실감하지 못한다. 한때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렸던 우리 예의 문화가 흔적만 남았다. 어른 같은 어른이 드물고 전통 윤리를 말하면 꼰대가 된다.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각종 단체의 타락을 보면 우리 사회에 기댈 곳이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
'사기'의 '노자·한비열전'에는 공자가 노자를 찾아가 예禮를 묻고, 사서오경 중의 하나인 '예기'의 '증자문'에는 공자가 노자에게서 예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4차례나 나온다. 공자가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지 엿볼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인간의 거의 모든 행위를 예의 테두리 안에서 묶었다. 주자(朱子)가 '천 리의 절도와 꾸밈(天理之節文也)'이라고 했던 예는 이제 수명을 다하였다. 우리 사회를 이끌 새로운 예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할아버지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자 구속됨을 뻔히 알면서도 스스로 귀국해서 광주에서 행한 진심 어린 참회를 보면서 양심의 불빛을 느꼈다. 아니, 한 가닥 바람이 일어났다. MZ 세대인 그가 개인의 보편적 양심에 기반을 둔 공동체의 윤리의식 회복이라는 희망을 쏜 것이다.
완연한 봄날이다. 손주를 둔 나이인데도 늘 내 속에 보채는 어린아이가 들어있다. 부모님도 그랬을 테다. 그런 아이를 안고서도 또 다른 어린애를 키우신 어버이들을 통해 우리들의 세계가 열렸다.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에 대한 감사와 오늘이 있기까지 길 위에서 마주친 숱한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되새기는 오월이 되었으면. 김태열 수필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유나 기자
이유나 기자![[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117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유통]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1628000045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