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남용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책임연구원 |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전달된다. 마찬가지로 에너지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져야 한다. 그런데 왜 태풍의 거대한 에너지는 주변으로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걸까. 물론 태풍은 크게 보면 저위도의 높은 에너지를 고위도로 옮겨 주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왜 그런 에너지가 균일하게 밀려 올라오는 대신 태풍이라는 과격한 형태로 전달이 되는지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한 가지 원리는 회전운동에 있다. 지구 자전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회전운동 덕분에 태풍의 엄청난 에너지는 한쪽으로 날아가거나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고 빙글빙글 도는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다. 지지부진하던 에너지의 이동이 우연히 만들어진 태풍이라는 형태로 급격히 촉진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설명으로 태풍의 원리를 이해하기는 힘들다.
핵융합을 설명할 때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에너지의 전달이다. 정확히 말하면 핵융합에서는 전달보다는 가둠이 중요하다. 핵융합 플라즈마의 성능은 보통 밀도와 온도 그리고 가둠시간의 세 가지 변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중 밀도와 온도는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핵융합을 일으키는 입자의 개수가 많으면 밀도가 높고 각각의 에너지가 높으면 온도도 높다. 그런데 가둠시간은 그렇게 간단히 설명하기 어렵다.
토카막 내의 플라즈마는 핵융합 반응을 원활히 일으키기 위해 1억 도가 넘는 엄청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플라즈마를 그대로 놔두면 당연히 주변으로 에너지와 입자가 빠져나가며 온도가 식어 버린다. 자기장을 이용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씩 새어나가는 건 어쩔 수 없다. 가둠시간이란 이처럼 플라즈마를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을 말한다. 이는 실제로 플라즈마를 지속시킨 시간과는 다르다. 한국의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인 KSTAR는 1억 도의 플라즈마를 30초 이상 운전하는 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추가적인 가열 등을 통해 온도를 유지한 것으로 가둠시간은 이보다 훨씬 짧다. 보통 핵융합을 위해서는 최소 1.5초 이상의 가둠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가둠시간은 플라즈마를 어떠한 구조로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모드라고 한다. 1982년 플라즈마의 가둠 성능을 2배 이상 끌어 올리는 H-모드(High-Confinement mode·고성능 플라즈마 운전모드)가 발견되어 인류는 핵융합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었다. 그러나 H-모드는 가둬두었던 에너지가 일시에 폭발적으로 방출되는 경계면 불안정 현상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자의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얼마 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서울대의 공동연구팀은 파이어(FIRE·Fast Ion Regulated Enhancement)라는 새로운 운전 모드를 발견했다. 이는 플라즈마 내에서 매우 빠르게 가속된 고속 이온이 내부의 에너지를 밖으로 빼내는 난류를 안정화하는 현상이다. 말하자면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옮기는 태풍을 쏘아 없애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플라즈마 내의 난류는 무조건 나쁘지는 않고 잘 이용하기만 하면 도움이 되므로 이는 너무 거친 비유이기는 하다. 아직 나아갈 길은 멀지만 우리나라가 초전도 토카막인 KSTAR를 앞세워 새로운 운전 모드를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척 고무적이다. 미래의 누군가가 핵융합으로 노벨상을 받을 때 그게 한국인일 수도 있다는 상상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니다. 남용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책임연구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효인 기자
임효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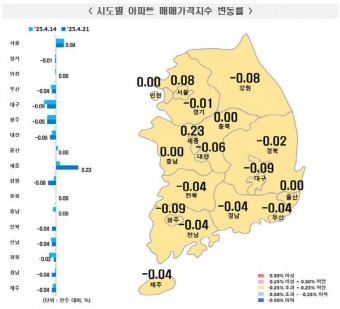







![[박현경골프아카데미]백스윙 어깨 골반 회전! 당겨서, 고정하고, 돌려주세요](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4m/20d/85_20250420000024502_1.jpg)
![[박현경골프아카데미]상체가 들어 올려진다고? 어깨를 옆으로 밀어주세요](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4m/26d/20250425001657212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