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영석(1686~1761) 작 『현이도』, 비단에 담채, 31.5×43.3㎝, 간송미술관 소장 |
과거에는 놀지 말고 심신을 부지런히 갈고 닦는 신근(辛勤)을 중요시했다. 놀이는 바라보지도 말라고 경계했다. 그러나 놀이는 삶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수면 등과 같은 것이다. 휴식이면서 창조활동이다. 자유와 즐거움을 만끽한다. 그래서 레크리에이션이라 하지 않는가. 지나치면 패가망신 할 수도 있지만 삶의 원천이요, 동력이다.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다.
놀이는 혼자 하는 것부터 여럿이 하는 것 까지 다양하다. 아무래도 여럿이 하는 게 좋다. 즐거움이 배가되기 때문이다. 신분과 때, 장소, 성별에 따라 다르다. 배우기 어려운 것은 고급 놀이로 분류되기도 한다. 배우기 어렵다는 것은 규칙이 많다는 것이다. 바둑과 장기가 그렇다.
장기는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려 3000∼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전쟁형식을 본 따 만들어진 것이 여러 형태로 발전하였다. 처음에는 대장기, 중장기, 소장기가 있었으며, 앞의 두 가지는 사라지고 현재는 소장기만 남았다. 서양으로 전파되어 체스가 되었다 한다. 포진에서 전법까지 전술전략이 다양해서 무척 심오하다.
장기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훈수이다. 넌지시 옆에서 수를 일깨워 주거나 가르쳐 주는 것을 이른다. 얽매이다 보면 아는 수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수라도 옆에서 보면 수가 잘 보인다. 일상에서도 전체를 보고 역지사지해봐야 하는 까닭이다.
과거라고 놀이를 부정적으로만 본 것만은 아니다. 논어 양화편에 "배불리 먹고 하루 종일 마음 쓸 곳이 없으면 딱한 일이다. 바둑과 장기가 있지 않은가? 그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일이다.(子曰 飽食終日 無所用心 難矣哉 不有博奕者乎 爲之猶賢乎已)"라고 하여 취미생활을 현이라고 불렀다. 지금도 현명한 일임은 다르지 않다.
화제를 거기에서 따온 그림 <현이도>이다. 관아재 조영석(觀我齋 趙榮?, 1686 ~ 1761, 문신, 문인화가) 그림이다. 호 관아재(觀我齋)는 나를 살펴보는 집이란 뜻이다. 많은 작품이 전하지는 않지만, 윤두서와 더불어 조선 후기 풍속화 성행을 이끈 사람이다. 산수와 영모에도 능했다. 한동네 살던 겸재 정선, 사천 이병연과 30여 년간 교유, 정선과 정선의 제자 현재 심사정과 더불어 삼재(三齋)라 불렸다고 오세창이 전한다. 다른 사람처럼 그림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인물화로 유명했다.
보이는 바대로 장기 두는 모습이다. 그림에는 화제와 많은 글이 첨부되어있으나 이는 다음으로 미룬다. 소나무 아래에 자리 깔고, 6명의 등장인물이 어우러져 있다. 깔려있는 것이 멍석이라는 해설도 많으나, 새끼를 짚으로 엮어 만드는 멍석은 짜임새가 조밀하다. 그림과 같은 모양이 나올 수 없다. 부채를 들고 있어 여름철 같으나, 흐트러짐 없는 의상으로 보아 한여름은 아닌 듯하다. 맨 앞 서안(書案) 옆에 앉은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장기판에 몰입해 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인가 보다. 긴장하여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실감난다. 두는 사람 역시 긴장하여 장기 알을 만지작거리며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죽은 말이 장기판 옆에 널브러져 있어 종국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휴식공간이나 저자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정겨운 풍경이다.
등장인물 의상이 제각각인 것도 볼거리다. 두 사람은 먹물 도포를 입었다. 외출할 때 쓰는 갓을 쓴 사람과 평상시 사용하는 모자를 쓴 사람이 섞여있다. 동네사람과 외지사람이 어울린 모양새다. 신분이 다를 수도 있겠다. 부채 들고 서있는 사람은 맨머리를 묶어 총각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은 모두 모자를 쓰고 있다. 두 사람은 지금도 접하기 쉬운 갓을 쓰고 있다. 장기 두는 외편 사람이 쓴 모자는 세로주름이 잡혀있어 낙천건(樂天巾)으로 보인다. 낙천건은 당나라 시인 백거이가 즐겨 썼던 모자다. 수염을 만지는 왼편 사람은 평소 집에서 쓰는 탕건을 썼다. 맨 앞사람 모자는 네모지고 위가 편평한 사방건(四方巾)이다. 자유분방한 누구나가 함께 어울리는 것이 놀이다.
놀이 규칙은 함께 즐기는 것에 있다. 누군가 억울하면 안 된다. 따라서 규칙이 무너지면 놀이는 없다. 속임수도 없다. 지혜롭지 못해 속을 뿐이다. 우리 삶과 국가사회도 그렇지 않을까?
양동길 / 시인, 수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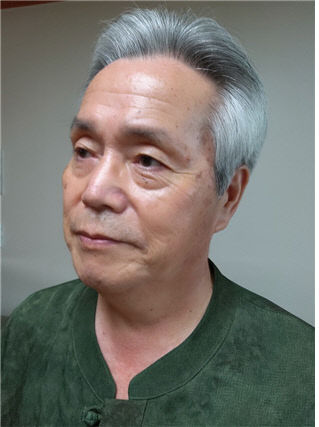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의화 기자
김의화 기자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18. 대전 중구 선화동 버거집](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1d/버거1.jpg)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1d/118_2024112101001603200062341.jpg)



![[기획]`대한민국의 스페이스X를 꿈꾼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의 도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0d/78_2024112001001447200056411.jpg)





![[2024 청양 풋살대회] `칠갑산의 기운을 받아 맘껏 기량을`](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4y/11m/22d/2024111801001224800047831.jpg)
![[2024 청양 풋살대회] `청양에서 모두 힐링의 시간을`](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4y/11m/22d/20241118010012241000477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