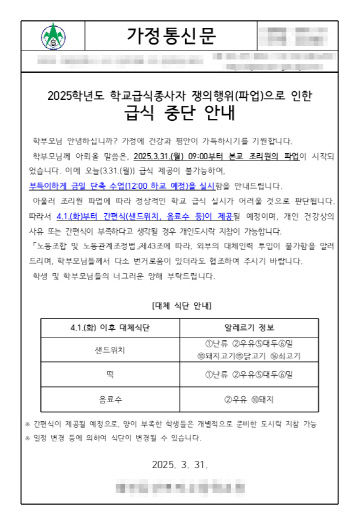|
| 성광진 소장 |
지난 2월 11일 춘천지방법원은 수업 중 아파서 책상에 엎드린 학생을 두 차례 강제로 일으키고 "억울하면 112에 신고하라"고 말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한다. 교사는 "어디 아프냐?"는 물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깨우기 위해 일으켜 세웠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학생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교사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에게 잘못된 언행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자는 학생을 일으켜 세워 학습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건 교사의 당연한 책무이다. 누워 있는 학생들에게 일어날 것을 종용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아파요'다. 이럴 경우 교사들은 뻔한 거짓말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간에 팽팽한 기 싸움 끝에 때로는 감정이 섞인 말들이 오가게 된다. 결국, 이번 판결로 중등 교사들은 자는 학생들을 깨우기가 두렵다고 할만하다.
지난해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4만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자신의 수업시간 중 자는 학생이 없다는 비율이 초등학교는 70.5%였지만 중학교는 21.1%, 고등학교는 7.3%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고교의 어느 교실에서나 수업 중 학생들이 엎드려 있는 것이 일상화된 풍경이라는 얘기다.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중학교보다 고교에서 자는 학생이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건 짚어볼 사안이다.
학교급별이 높아질수록 보다 지적 욕구도 더욱 다양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의 고교에서는 1교시부터 잠을 자서 마지막 교시까지 수업시간 내내 엎드려 있는 학생들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몇몇 학교의 고민이 아니라 고교의 일반적인 고민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교 교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느냐다.
핀란드의 직업학교 교감인 ‘앤 라사카’는 2017년 제주교육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해 제주에서 40일 정도 머물면서 우리의 학교 수업 현장을 경험했다. 앤 교감에게 가장 놀라운 점은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들을 그대로 놓아둔다는 것이었다. "수업시간에 1~2명의 학생, 또는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잠을 자는데, 교사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핀란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핀란드는 여기보다 적은 지식을 천천히 가르친다. 또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비교했다.
이 지적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수업 중 자는 학생의 문제는 교사의 학습지도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교육환경에 따른 문제다.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임용 과정을 보더라도 어느 직업계층보다 전문지식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석사학위 이상 교원 비율이 초등학교 30.1%, 중학교 35.7%, 고교 37.7%로 나타나 있다.
도대체 학생들은 왜 수업 중에 자는가?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학습 의욕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왜 학습의욕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일까? 우리 교육은 동일한 학생들을 동일한 수준까지 끌어올려 완전 학습을 이루기보다는 성적에 따라 줄을 세워 진학에 이용하는 데 목적을 둔 입시 중심의 성적 지상주의적 학습을 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정책 당국은 동일한 대상들을 학습할 때 동일한 수준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교육환경이 필요한지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해야 학생들의 수준을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보여왔다.
결국 지나친 입시 경쟁 때문에 우리의 교육과정은 필요 이상으로 그 수준이 높아서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꺾고, 사교육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모순을 직시하지 않고 단순히 자는 학생을 타박하거나 이를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우리 교육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도 겁나게 된 지금, 우리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할까? 다시 핀란드의 교육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117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유통]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1628000045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