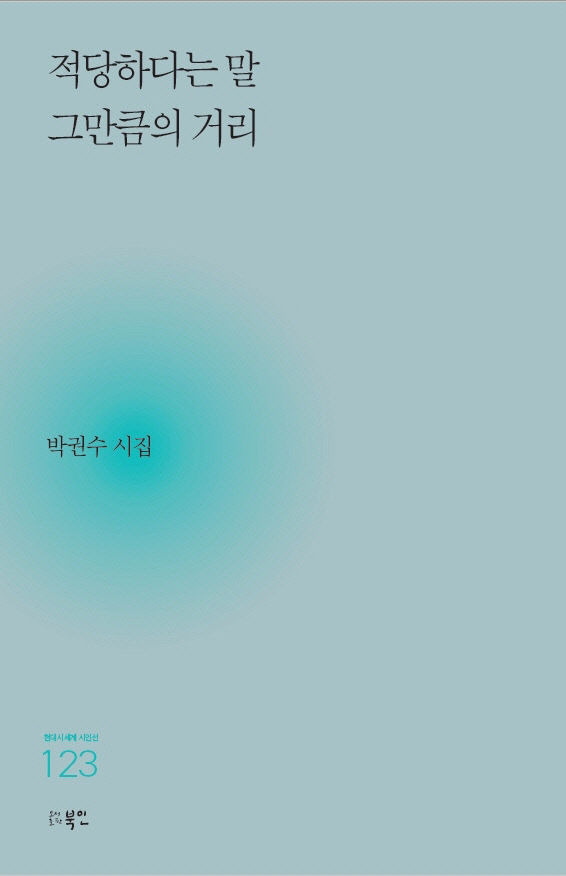 |
박권수 │도서출판 북인
박권수 시인의 시어는 견고한 건축물 같다. 뼈대부터 잘 쌓아 올린 낱말들은 하나의 집이 되었고, 군락을 이룬 촘촘한 시는 박권수의 세상으로 거듭났다.
'적당하다는 말 그만큼의 거리'는 박권수 시인의 첫 번째 시집 '엉겅퀴마을' 이후 4년 만에 세상에 내 논 이야기다.
시집 면면을 살펴보니 세상을 보는 통찰력도 남다르지만 밋밋한 일상을 특별한 순간으로 바꾸는 시인의 구력은 남다르다.
시집에 실린 'ㅇㅋ'나 '밥 한번 먹자 ', 'ㅝ'는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일상일 뿐인데, 시인의 숨결을 거치니 유쾌한 일상으로 탈바꿈 되어 있다.
박 시인은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집의 부제는 '어머니'라 불러도 무방할 것 같다.
시집 곳곳에 어머니에 대한 애정, 그리움, 아쉬움이 절절하게 묻어난다. 어머니를 명명하지 않았어도 어머니를 대입해 읽어보면 끝 모를 그리움에 뭉클함이 밀려온다.
엄마 신발 없어진 후로 항상 닫혀 있는 문/ 가지런한 신발 이젠 나만 바라보고/ -혼자하는 식사 中
앞장선 걸음 멈출 때마다 가린 손수건 워이워이/ 언젠가 보낼 일 먼저 가면 어떠랴/ 걸음이 걸음 업고 걷는 봄날/ -뭐혀 어여 와 中
박성현 시인은 해설에서 "박권수 시인의 비극적 허무주의는 엄마 신발이 없어진 후로 항상 닫혀있는 문에 집약돼 있다"며 "죽음으로부터 삶을 사유하는 이 지독한 난청이 시인이 그리는 서정의 유화에 스며들며 신과 죽음을 소환한다"고 해석했다.
시인은 말한다. '가까운 사람이 떠날 때 내 안에 못이 자란다'고. 이 못은 형태는 그 사람 모습 닮아있는데 반복이 일상을 두껍게 한 뒤에야 깊게 배인 녹을 오래도록 감당해야 한다고.
시인의 가슴에 자란 못이 녹물처럼 짙고 짙게 우리 가슴에 퍼져 간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해미 기자
이해미 기자![[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117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유통]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1628000045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