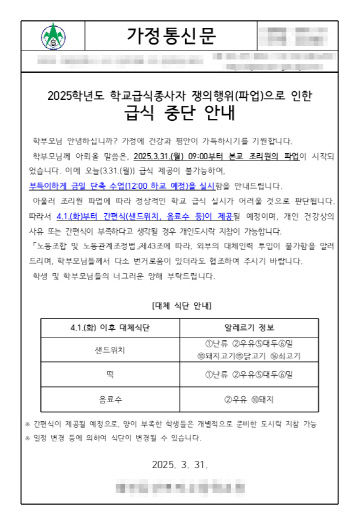|
| 송복섭 교수 |
가을 계절을 이용하여 나간 첫 하천 나들이는 경이로움의 연속이었다. 평평하게 정비된 산책로 옆 수풀 사이로 물이 흐르고 굵은 조약돌이 쌓인 여울에서는 청명한 울림 물소리가 반향을 만들고 있었다. 얕고 투명한 물가를 주의 깊게 살피며 작은 물고기를 물결과 구별하는 일도 감동이었다. 오리 한 쌍을 만나는 건 일도 아니고 백로에다 목을 움츠리고 물고기를 응시하는 왜가리도 볼 수 있었다. 풍광이 아름다운 목 좋은 곳에는 영락없이 길가에 커피숍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운동복 차림에 테이블 하나를 차지하고 커피와 함께 한참을 멍 때리다 돌아왔다. 그야말로 힐링의 시간이었다. 밤 운동이 몸 건강을 위함이었다면 하천걷기는 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어느 도시나 사람 사는 공간 사이로 하천이 흐른다. 도시가 하천을 끼고 발달한다는 사실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한때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실개천이 차지한 땅이 아까워 그 위를 콘크리트로 덮은 다음 도로나 주차장으로 썼다. 이제는 복개하천을 복원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하천 복원은 새로운 주민 쉼터를 조성하고 지역 명소로 발전시켜 상권 활성화와 지역 가치상승의 효과를 낳는다고 추진하는 측은 홍보한다. 하상도로도 마찬가지다. 하천 둔치를 교차로와 신호등 없이 질주하며 시간을 단축하는 이점을 따르다 보니 하천으로 사람이 접근하는 일이 어려웠다. 자동차 창 넘어 철을 따라 변하는 꽃이나 풍경을 즐기는 정도가 그나마 전 시대에 비해 나아진 일상이었다. 이제는 하상도로에서 차가 물러나고 주민의 쉼터로 재편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도시하천을 편히 이용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는 홍수로부터 물을 다스려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한 때문도 있었다. 여전히 도시하천에는 치수와 이수의 개념이 대립한다. 기후변화의 여파라고는 하는데 올해는 유독 물난리가 많았다. 순식간에 만물을 쓸어버리는 강물을 볼라치면 식겁한 일이지만 일 년 중 며칠을 위해 남은 날들을 다 포기하고 산다는 건 너무 억울하다. 게다가 충분한 관제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면야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AI와 IOT 등 첨단 기술도 이런 데 쓰라고 개발하는 것 아닌가?
도시하천을 시민의 쉼 공간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각해 볼거리가 있다. 그저 메뉴얼에 따라 하상을 정비하고 산책로와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정도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누가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계획과 설계가 필요하다. 바르게 가꾸고 이용하는 데에는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조사와 설계도 고려할 만하다. 매일 하천을 산책하는 지역주민이 누구보다 그 장소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무엇이 필요한지도, 그리고 어떻게 유지 관리해야 하는지도 웬만한 전문가보다 낫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공모를 비롯해 그 과정을 시민이 만들어가는 축제로 계획해봄 직하다.
하천을 산책하다 보니 성가실 일이 하나 있었다. 느긋한 마음으로 걷고 있는데 난데없이 따르릉 소리와 함께 자전거가 길을 비켜 달라 아우성이다. 헬멧에 제법 전용복장을 갖춘 이가 좀 느리게 비켜줄라치면 째려보고 달아난다. 새롭게 도시하천을 정비할 경우에는 자전거와 보행자를 엄격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교통수단이 새롭게 등장하니 둔치에 생기는 자전거도로에는 이들도 포함해 새로운 도시교통수단으로 인정해보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송복섭 한밭대 건축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117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유통]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1628000045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