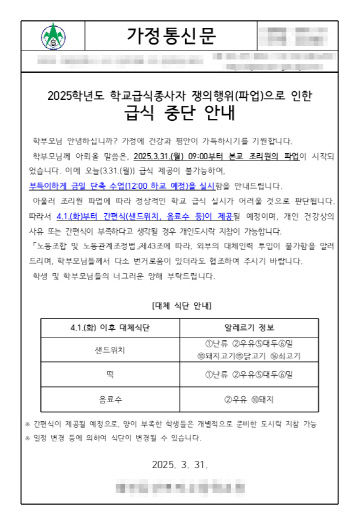|
| 손종학 교수 |
올 초 코로나 전염병이 돌 때만 하더라도 필자는 이렇게도 길어질 줄은, 이다지도 심각할 줄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저 한때의 전염병으로만 여겼다. 그렇기에 약간은 관망꾼의 호기심으로 바라보았던 적도 있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유치하였던 것임을 깨닫는 데는 그다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은 우리를 극한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고, 지금도 어려운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 더 무서운 것은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 끝난 뒤의 후유증이 얼마나 클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연극이 끝나듯 언젠가는 코로나 고통의 터널도 마지막을 보여 줄 것이다. 무엇으로 자신하느냐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인간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왔기에, 역사가 증명한다. 도전과 응전, 집단 지성, 자연 창조의 섭리 등이 그 답을 대신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은 연극의 막간 시간인지도 모르겠다. 더 나은 다음 막을 준비하는 막간 말이다.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형용하지 못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취할 자세는 무엇일까? 바로 지금을 막간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지혜와 겸손이다. 사람에게 막간은 무엇일까? 내면을 향한 시간이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요, 인간 사이의 피상적 사회성과 교류성에만 매몰됐던 내가 내 속에 잠겨있던 고독한 존재로서의 참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다. 고독감은 결코 외로움이 아니다. 홀로 있어 좋은 희열이요, 새로운 세상의 발견이다.
지금 우리가 최우선으로 신경 쏟을 일은 현재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주어진 가장 큰 과업은 무엇일까? 당연히 방역 피해의 최소화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예측하여 그에 대비하는 일일 것이다. 어쩌면 이것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코로나 막간을 현명하게 보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이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진정 필요한 것은 우리를 돌아보는 일일지 모르겠다. 수없이 오고 갔던 사회적 언어와 그로 인한 다툼들 다 내려놓고 내면의 나로 시선을 돌려 나와 대화할 때이다.
누군가 말했다. 비울 때 비로소 채워진다고. 작은 것 하나 움켜잡은 손을 펴지 않으면, 결코 더 큰 것은 채워지지 않는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기능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를 잠시 내려놓고, 더 큰 나를 얻는 지혜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막간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제발 허접한 것 비우라고, 그러면 진짜 보물로 채워주겠다고.
완연한 가을이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다. 잔인하였던 봄과 여름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얻은 추수이기에 우리는 나름 뿌듯하게 여겨도 좋으리라. 그러나 자연 앞에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존재임도 잊지 말자. 이 불완전 존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저 자연에 경외감을 표하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 경외감은 공활하게 비어있는 푸르른 가을을 내 마음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로 시작된다.
텅 비어있지만, 코발트 빛으로 속이 꽉 찬 가을 하늘의 공활함이 주는 마음의 풍요함으로 코로나 시대가 전하고 싶어 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자. 현명한 자는 떠날 때 길을 만들고, 머물 때 집을 짓는다. 지금은 막간이기에 머물면서 나만의 고독한 집을 지을 때이다. 더 나은 미래의 사회적 교류를 위해서.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117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유통]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1628000045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