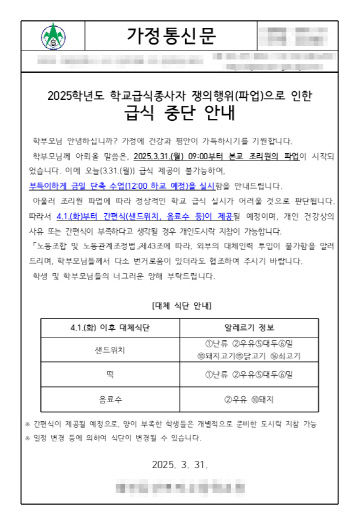|
| 송복섭 교수 |
"나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채워주는 집은 어떤 것인가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는 나만의 집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편안하고 편리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힐링할 수 있는 집은?", "미래에는 건축에 어떤 점이 바뀔까요?", "좋은 집이란 무엇인가요?", "단독주택의 삶을 산다는 건 아파트에 비해 무엇이 다른가요?", "부부가 살고 자식들이 가끔 오고 싶은 집을 지으려면 어디에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요?", "이웃 사람과 반려동물이 어울리는 집, 바람과 햇볕과 공간이 연결되는 집, 시각적 감각적 느낌이 소통하는 집, 후세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집은?", "미래에 가치가 있는 집은?", "모듈화된 곳에서도 개성을 잘 살리는 방법은?",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집은?", "함께 늙어가면서 권태기 없는 집은?" 무려 절반이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다.
1937년 잡지 '여성'에는 이런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두 분께서는 가정이란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은 인류의 행복을 만들어 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처럼 좋은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서든가 어떤 향락장에 가서든가 혹은 연회자석에서든가 그러한 데서도 간혹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순간에서 더 지내지 못하는 것이죠, 허나 우리가 가정에서 얻는 행복이야말로 영원한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대를 달리해도 가정은 영원한 안식처이며 가족의 공간인 집은 이런 바람을 담아내야 하는 곳이다. '가족으로부터 주거를 박탈한다는 것은 가족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주장되어왔고 주거권과 주거복지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코로나19 이후 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수요가 늘었다고 한다. 공간을 구분하던 가벽을 털어서 넓은 거실 겸 식당으로 꾸미는가 하면, 조명을 바꿔 전과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미니멀리즘’을 실천한다며 가구와 온갖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정리수납 전문가라는 직업도 등장했다. 아파트 일색에서 단독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움직임도 부쩍 늘었다. 단독주택 분양현장에 가보면 어린 자녀 손을 잡고 집을 보러 다니는 젊은 부부가 생각보다 많은 것에 놀란다. 이 모든 변화는 집을 부동산으로 여겨 차익을 챙기려는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가족 모두가 힐링하며 행복하고 후손에도 물려주고자 하는 집에 대한 원초적인 욕망이 드디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집은 우리에게 피난처이기만 할까? 최인훈의 소설 광장에는 광장과 밀실의 개념이 등장한다. 광장은 사회적 공간에 대응하며 밀실은 개인의 사적인 생활을 의미한다. 사회적 활동과 개인의 삶이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듯이 밀실로서의 집에서 행복과 충분한 휴식을 취한 이후에 힘을 얻어 사회적 활동에 왕성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 어느 정도 제약을 받게 되었으나, 이를 침잠과 내면을 채우는 기회로 삼아보자. 고통스럽게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미소 같은 마음으로 소소한 일상을 즐겨보자. 가구 위치도 바꾸어보고 병을 찾아 꽃도 꽂아보고 베란다에다 나무도 키워보고 차를 끓여 음악과 함께 향을 느껴보기도 하고…….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취미가 하나 있다. 예쁜 나무나 맛있게 먹은 과일을 보면 씨를 받아 화분에 심어보자. 싹이 터 자라기를 바라는 은근한 기대가 쏠쏠하다.
/송복섭 한밭대 건축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117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273600008991.jpg)


![[유통]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1628000045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