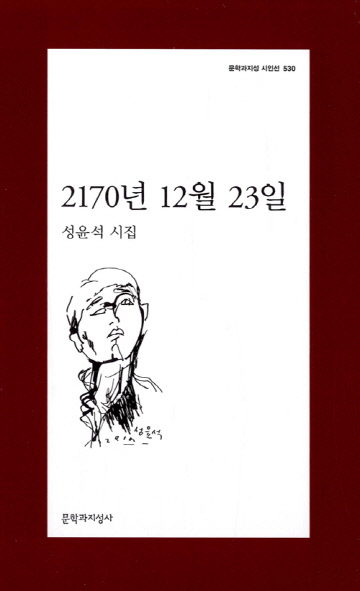 |
| 문학과지성사 제공 |
표제시 「2170년 12월 23일」은 "거기에 나는 없었다"는 구절을 반복하며 미래의 겨울, 크리스마스이브 전날로 간다. 춥지만 따듯함을 나누는 연말이자 크리스마스와 크리스마스이브를 앞두고 있지만 아무 날도 아닌 미래의 어느 날은 "흐린 겨울" 속 "검은" 것들("검은 구름" "검은 마스크")이 난무하는 "비틀어"진 모습이다. 하지만 시인의 섬세한 시선은 그 검은 세상에도 아직 남아 있는 흰 이미지를 놓치지 않는다. "공중에서 눈이 내렸다 검은 구름에서 흰 눈은 여전했다"는 "세상 최후의 고독을 살"아가는 신인류에게 남은 어떤 가능성으로 읽히기도 한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아요"라는 "도시의 재해대책본부에서 쏘아올린 저녁의 문장이" "마치 돛대 같"아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을 과연 '희망'이라 부를 수 있을까.
"고독도/오래되면 중독된다"고 말하는 시인은 "거짓 위로들로 가득한 부산함들에 앗기지 않으려" "색을 버리고 덜어내고/긁어"내어서 "시를 흑백으로 쓴다". 위안 없는 비틀림 삶, 소외된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 절망의 체험을 특유의 리듬으로 전했던 시인은 눈물과 슬픔으로 얼룩진 '밤'의 세상을 지나, 결국엔 시인이 사라지고 없을 미래를 상상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극장을 드나들던 소년에서 묘지 관리인, 남쪽의 한 바닷가 도시의 잡부까지, 시인의 생활을 시 곳에 녹여내었던 작가는 전작 <밤의 화학식>에서부터 삶의 비애 속으로 침잠해 들어가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한다. 5부로 나뉘어 총 67편의 시가 실린 <2170년 12월 23일>은 어둠(흑)과 밝음(백)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며들고 번지는 것이라는, 생의 비밀을 탐색하는 시집이다.
박새롬 기자 onoin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새롬 기자
박새롬 기자
![[드림인대전]생존 수영 배우다 국가대표까지… 대전체고 김도연 선수](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4d/드림인대전1.jpeg)
![[현장]구청·경찰 합동 쓰레기집 청소… 일부만 치웠는데 21톤 쏟아져](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4d/118_2024112201001657300065231.jpg)




![[주말 사건사고] 청양 농업용 창고서 불…카이스트서 전동킥보드 화재](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4d/78_2024112401001726300067831.jpg)
![[날씨] 12~1월 평년과 비슷하고 2월 따뜻](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4d/78_2024112401001726800067861.jpg)

![[드림인대전]생존 수영 배우다 국가대표까지… 대전체고 김도연 선수](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4y/11m/24d/20241124010014328000559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