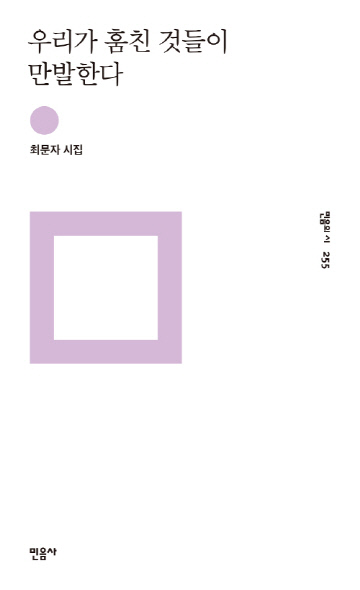 |
| 민음사 제공 |
최문자 지음│민음사
누구의 잎으로 산다는 건
한 번도 꽃피지 않는 것
어금니를 다물다 겨울이 오고
마치 생각이 없다는 듯
모든 입술이 허공에서 죽음과 섞이는 것
―「잎」에서
만발은 꽃이 다 핀다는 것인데, 훔친 것들이 만발하는 풍경은 어떤 것일까. 훔친 것이라 숨겨야 했을 어떤 존재들이 모습을 다 드러내고 피어나려면 고백이 필요할 것이다.
최문자 시인은 '훔친 것들'을 아무도 모르게 숨겨 둔 외로운 이처럼, 덤덤하게 삶을 풀어 놓으면서도 때때로 고백과 비밀, 죽음과 참회 들이 터져 나오도록 둔다. 오랫동안 품어 왔던 비밀을 털어놓고, 일생 동안 사랑했던 이가 죽음을 맞이하는 '끝'의 순간들로부터 시인은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한다. 상실과 불안을 여유롭게 부려 내며 촘촘히 짜인 시의 격자는 어떤 것도 헐렁하게 빠져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는 그 안에 단단히 붙잡힌 채, 슬픔과 참혹함이 지나가며 남기는 흔적들을, 그것들이 지나간 뒤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시간의 궤적을 가만히 바라본다.
상실과 참회에서 비롯된 신음과 울음이 시집을 가득 적시고 있지만 시인은 좀처럼 과잉되는 법이 없다. 누구나 저마다 고백이 되기 직전의 무엇을 가지고 있을 터. 수많은 고백들이 모두 바깥으로 터져 나온다면 역설적으로 고백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고백이 극적일 수 있는 것은 삶이 무심하게 흘러가기 때문일 테다. 시인은 삶이 각자의 절실한 마음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하게 흐르는 것임을 알고 있다. 그리하여 삶의 작동 방식을 논리적 언어로 설명하는 대신, 흘러가는 장면의 연쇄로 표현한다. 시에 담긴 건조하면서도 감각적인 장면의 연쇄는 고백이 극적으로 피어오를 수 있는 무대가 된다. 『우리가 훔친 것들이 만발한다』의 독자들은 가장 효과적인 무대에서, 가장 강력하게 터져 나오는 슬픔의 고백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해설을 쓴 조재룡 평론가의 말처럼, 이 눈부신 슬픔은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을 한껏 쏘아 올린다.
박새롬 기자 onoin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새롬 기자
박새롬 기자
![[드림인대전]생존 수영 배우다 국가대표까지… 대전체고 김도연 선수](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4d/드림인대전1.jpeg)
![[현장]구청·경찰 합동 쓰레기집 청소… 일부만 치웠는데 21톤 쏟아져](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4d/118_2024112201001657300065231.jpg)




![[주말 사건사고] 청양 농업용 창고서 불…카이스트서 전동킥보드 화재](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4d/78_2024112401001726300067831.jpg)
![[날씨] 12~1월 평년과 비슷하고 2월 따뜻](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4d/78_2024112401001726800067861.jpg)

![[드림인대전]생존 수영 배우다 국가대표까지… 대전체고 김도연 선수](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4y/11m/24d/20241124010014328000559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