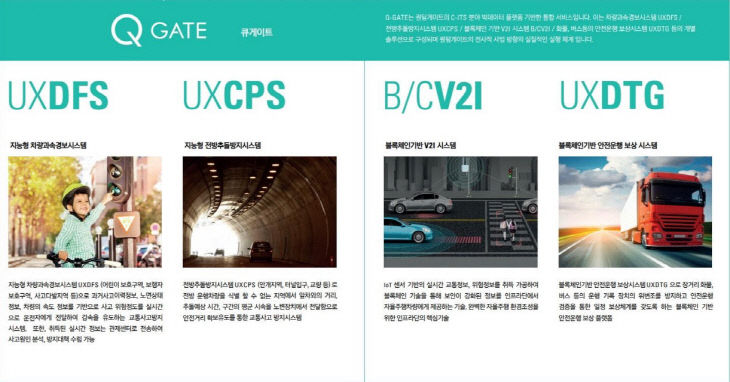|
| 게티이미지 제공 |
는?
(마취 풀린 개구리 한 마리가 내장을 질질 끌며 달아
나고 있는 테이블 위)
이렇게, 절개되기로 되어 있었니?
오장육부까지
꺼내 보여야만 했어?
주르륵 흘러내리는 기억의 창자를 끌며 어기적거리는
어기적거리는, 이게, 내, 인생이니……봉합
되지 않는?
- 「……?」 전문
김언희의 시는 격렬하다.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게 없다. 갈가리 찢기고 부서지고 밑바닥 욕망을 들쑤셔 참 불편하다. 아니, 이것도 남성의 시각일 게다. 철저히 봉인된 여성의 상처와 불안을 끄집어내 마당 한 가운데 쫙 펼쳐놓는다. 그래서 미처 알지 못하고 구태여 알고 싶지 않은 금기의 욕망을 마주했을 때의 당혹감.
도대체 왜 이다지도 과격할까. 그녀는 무엇을 보고 알아버렸을까. 김언희의 시를 접하면 과연 시의 미학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혼란스러워진다. 기존에 내가 인지하고 있는 아름다움이란 타당한 것인가. 시인의 전복적인 사고 앞에 나는 무력해진다. 그리고 여름날 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후련하다. 나도 '내장을 질질 끌며 달아나고 있는' 시인을 따라가 볼까.
우난순 기자 rain4181@
다음 시들은 너무 질척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우난순 기자
우난순 기자
![[드림인대전]생존 수영 배우다 국가대표까지… 대전체고 김도연 선수](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4d/드림인대전1.jpeg)
![[현장]구청·경찰 합동 쓰레기집 청소… 일부만 치웠는데 21톤 쏟아져](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4d/118_2024112201001657300065231.jpg)




![[주말 사건사고] 청양 농업용 창고서 불…카이스트서 전동킥보드 화재](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4d/78_2024112401001726300067831.jpg)
![[날씨] 12~1월 평년과 비슷하고 2월 따뜻](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4d/78_2024112401001726800067861.jpg)

![[드림인대전]생존 수영 배우다 국가대표까지… 대전체고 김도연 선수](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4y/11m/24d/20241124010014328000559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