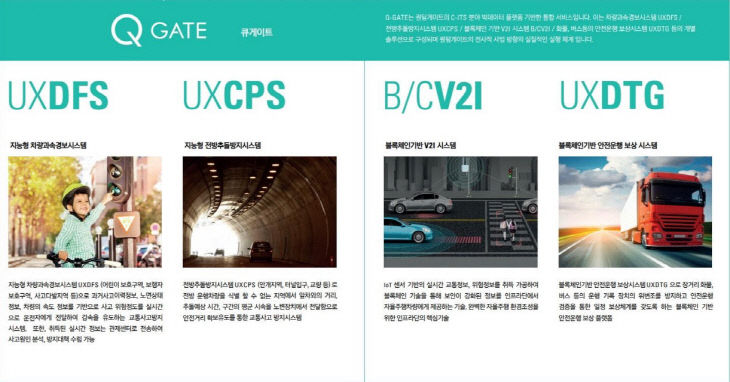|
| 게티이미지 제공 |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體溫)을 나누어 가진다.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假飾)하지 않는다.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어 젖은 한 마리 상(傷)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 겨울, 살얼음이 낀 논바닥에 비둘기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반짝이던 눈동자는 빛을 잃었고 몸은 뻣뻣하게 굳었다. 나뭇가지에 앉아 중심을 잡던 앙상한 발은 갈퀴처럼 날카로워졌다. 그 새를 죽인 건 무엇일까. 논바닥에 볍씨가 흩어져 있는 걸 보았다. 독이 묻은 볍씨들. 비둘기는 아무 것도 모르고 볍씨를 주워 먹었을 것이다. 먹이의 상찬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이었다.
새는 아무것도 모르고 날고 아무것도 모르고 노래한다. 구구구구. 새는 자신의 죽음을 알까. 동물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한다고 했다. 지진의 징조로 사람들은 동물의 행동을 보고 감지한다. 떼지어 이동하는 개미들, 갑작스레 날뛰는 가축들. 인간의 총구와 독이 묻은 먹이를 감지하지 못하다니. 그것이 새의 순수였던가.
교태부리지 않고 사랑하고 노래인 줄 모르면서 노래한다. 정말 새는 아무 것도 모를까. 목숨을 기꺼이 인간 앞에 놓는 새들. 그것이 새의 운명이라면 새의 노래는 아름답지 않다. 새의 노래를 듣지 않겠다. 난 한 마리 상한 새의 덩어리를 외면하겠다. 새의 따스한 체온을 거부하겠다.
우난순 기자 rain418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우난순 기자
우난순 기자
![[드림인대전]생존 수영 배우다 국가대표까지… 대전체고 김도연 선수](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4d/드림인대전1.jpeg)
![[현장]구청·경찰 합동 쓰레기집 청소… 일부만 치웠는데 21톤 쏟아져](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4d/118_2024112201001657300065231.jpg)




![[주말 사건사고] 청양 농업용 창고서 불…카이스트서 전동킥보드 화재](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4d/78_2024112401001726300067831.jpg)
![[날씨] 12~1월 평년과 비슷하고 2월 따뜻](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4d/78_2024112401001726800067861.jpg)

![[드림인대전]생존 수영 배우다 국가대표까지… 대전체고 김도연 선수](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4y/11m/24d/20241124010014328000559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