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화학 공부의 필수인 원소주기율표을 달달 외우던 학창시절이 있었다. 도저히 외워지지 않는 낯선 이름을 되뇌이다 보면 도대체 어떻게 탄생한 이름일까, 궁금증이 생겨난다.
세상 모든 물질의 기본이 되는 원소의 이름에는 발견한 과학자, 혹은 나라의 지명, 원소의 색을 보여주는 색상의 이름이 붙여져 있다.
‘아인슈타이늄(Es 99)’은 원소명을 지을 무렵 비슷한 시기인 1955년 사망한 아인슈타인의 이름에서 따왔다. 1952년 수소폭탄 폭발 실험의 낙진에서 처음 발견됐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원소 가운데 가장 무겁다. 자연적으로는 생성되지 않아서 인공원소 합성과 같은 기초과학 연구에서만 사용된다.
‘멘델레븀(Md 101)’은 주기율표를 만든 ‘멘델레예프’를 기념하는 이름이다. 악티늄족 원소 중 하나고, 9번째 초우라늄 금속 원소, 첫 번째 초페르뮴 원소다. 멘델레븀은 극미량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금속이나 화합물 형태로는 얻지 못했다. 물리와 화학적 특성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노벨륨(No 102)’은 노벨상을 만든 노벨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원소의 이름과 원소 기호는 1957년 스웨덴 노벨연구소가 102번 원소 발견을 주장하면서 제시했다. 그러나 노벨연구소의 원소 발견에 대한 주장은 후속 연구로 확인될 수 없어 철회됐지만, 제시한 원소 이름과 기호는 남게 됐다. 노벨륨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다. 노벨륨은 이름값이 무색하게도, 앞으로 실용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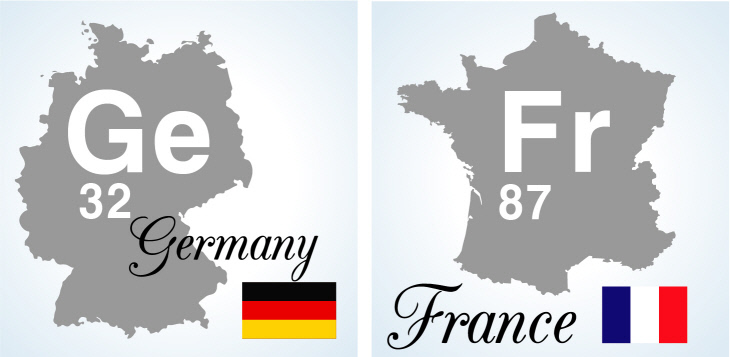 |
‘프랑슘(Fr 87)’은 자연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늦게 발견됐다. 프랑스 여성과학자 페레가 악티늄-227 방사성 붕괴를 연구하던 방사능으로 검출됐다. 페레의 모국의 이름을 따서 원소 이름을 지었다. 프랑슘은 지각 전체에 존재하는 양은 20~30g뿐이다. 프랑슘은 핵반응으로도 합성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합성 중에서 가장 많이 얻은 양이 약 30만개의 원자들로 이뤄진 뭉치다. 프랑슘은 아주 희귀하고 수명이 짧다.
도시의 이름이 붙은 원소도 있다.
하프늄(Hf)은 덴마크의 코펜하겐, 루테늄(Lu)은 프랑스의 파리, 다름슈타튬(Ds)은 독일의 다름슈타트에서 따 왔다.
색깔을 나타내는 원소도 있다.
세슘(Cs 55)은 알카리 금속으로 하늘색을 뜻하는 시안(Cyan)에서 따 왔다. 세슘의 불꽃 반응을 일으키면 하늘색이 된다.
루비듐(Ru)은 이름에서 보듯 빨간 보석 루비를 뜻한다. 루비듐은 보통 회색이지만 가열하면 빨간색이 되기 때문에 루비듐이 됐다.
무지개를 뜻하는 이리스(Iris)에서 따온 이리듐(Ir). 이리듐은 원래 무지개색이 아닌 흰색이다. 화학물의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무지개를 뜻하는 이름이 붙게 됐다.
브로민(Br)은 할로겐 원소인데, 악취가 나는 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브로민은 냄새가 지독한 정도가 아니라, 눈과 목을 자극하고 들이마시면 허파가 상할 정도다.
오스뮴(Os)은 그리스어로 냄새를 뜻한다. 상온에서 산소와 쉽게 결합해 강하고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 오스뮴은 1803년 발견됐고, 지구에 존재하는 양은 아주 미량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해미 기자
이해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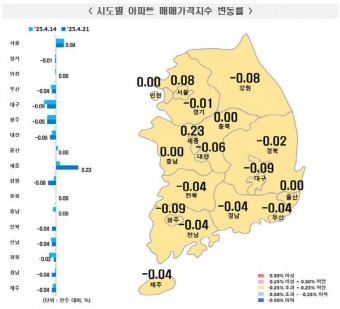







![[박현경골프아카데미]백스윙 어깨 골반 회전! 당겨서, 고정하고, 돌려주세요](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4m/20d/85_20250420000024502_1.jpg)
![[박현경골프아카데미]상체가 들어 올려진다고? 어깨를 옆으로 밀어주세요](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4m/26d/20250425001657212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