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사계절 제공 |
|
앳된 장이가 산기슭을 내려온다. 산골 집에서 아버지와 마주앉아 만든 통나무 상을 시장에 팔려는 것이다. 장터에는 소반전이 늘어섰는데, 손님이 통 오지 않자 주인공 장이는 기가 죽는다. 자기가 만든 상은 볼품없어 팔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
|
| ▲ 사계절 제공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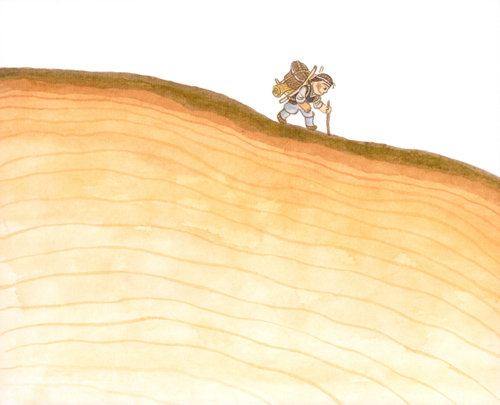 |
|
| ▲ 사계절 제공 |
|
남들이 만든 것처럼 화려하고 팔릴 것 같은 상을 만들고 싶다. 장이는 지나가던 상방에서 상 만드는 법을 제대로 배우기로 마음먹고 산골도, 아버지와 만든 상도 잊은 채 소반 만들기에 열중한다. 마침 곡예를 하던 줄꾼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선물할 상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하자, 장이는 멋들어진 호족반 하나를 완성한다. 그런데 정작 줄꾼 아이는 호족반에 손이 가지를 않는다. 예쁘기는 해도 자기처럼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다는 것. 결국 줄꾼 아이는 장이가 가지고 온 통나무 상을 집어 든다.
세상에 어울리는 것은 따로 있으며 겉모양을 갖추는 것보다 진짜 실속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주인공은 이제야 깨닫게 된다. 비싼 옷칠 대신 콩기름으로 윤을 내고 화려한 조각 대신 동그런 받침이 전부인 통나무상. 볼품없는 거무스름한 생김이 가을볕에 그을린 아버지의 얼굴을 닮은 상의 의미가 이 책을 읽는 아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쇠못 대신 나무못으로 마무리하고 옷칠을 하는, 식탁에 밀려 귀해진 우리 상 만드는 과정을 엿보는 즐거움도 상당하다. 투박한 듯 하면서도 동그랗고 다정한 그림체가 책의 맛을 더한다.
박새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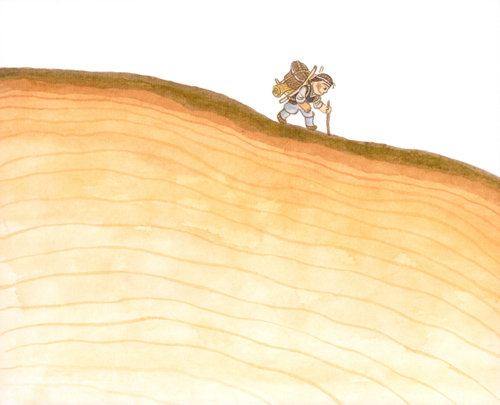
 박새롬 기자
박새롬 기자
![[드림인대전]생존 수영 배우다 국가대표까지… 대전체고 김도연 선수](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4d/드림인대전1.jpeg)
![[현장]구청·경찰 합동 쓰레기집 청소… 일부만 치웠는데 21톤 쏟아져](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4d/118_2024112201001657300065231.jpg)




![[주말 사건사고] 청양 농업용 창고서 불…카이스트서 전동킥보드 화재](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4d/78_2024112401001726300067831.jpg)
![[날씨] 12~1월 평년과 비슷하고 2월 따뜻](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4d/78_2024112401001726800067861.jpg)


![[드림인대전]생존 수영 배우다 국가대표까지… 대전체고 김도연 선수](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4y/11m/25d/20241124010014328000559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