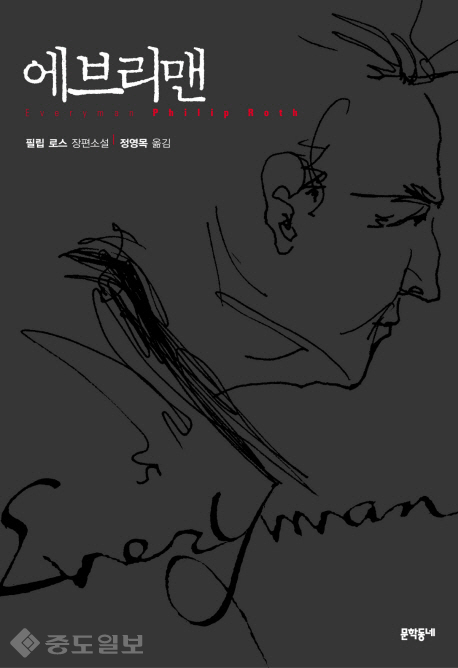 |
| ▲ 에브리맨/필립 로스 지음 / 문학동네 / 2009 刊 |
'늘씬한 작은 어뢰처럼 상처 하나 없는 몸을 지닌 그 소년의 활력은 어떤 것으로 꺼버릴 수 없었다. 아, 그 거침없음이여, 짠물과 살을 태우는 태양의 냄새여! 모든 곳을 뚫고 들어가던 한낮의 빛이여, 그는 생각했다. 여름의 매일매일 살아 있는 바다에서 타오르던 그 빛이여. 그것은 눈에 담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크고 귀중한 보물이었다. (p.188)'
책의 시작은 주인공이 죽고 난 장례식장에서 시작된다. 장례식장에는 첫째 부인의 아들 둘과, 둘째 부인 피비, 그리고 낸시 기타 등등의 인물들이 온다. 장례식장에 온 사람의 숫자 때문에 장례식이 더 초라해 보인다. 일흔이 넘은 주인공은 수차례의 심장수술과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직감한다. 뉴욕에서 살다가 해안가 마을로 이사를 감행한다. 한적한 곳에서 평생 꿈이었던 그림을 그리는 일에 몰두하고 싶었다.
한적하니 처음에는 여유를 만끽하다 외로움을 느낀다. 그림교실을 연다. 수강생은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이었다. 암이나, 심장병 등의 병을 달고 있었다. 주인공은 거기서도 새로운 여자를 만나기를 고대한다. 세 번씩이나 이혼했는데. 주인공이 그나마 괜찮은 상대로 여겼던 크레이머라는 여자는 병의 고통 때문에 자살하고 만다. 그림교실도 질려버리고 만다. 그림교실과, 혼자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괜찮은 노년을 영유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무너져 내려버린다.
진정 필요한 건 가족, 사람이었다. 그는 해안마을에서 딸 낸시가 있는 뉴욕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는다. 낸시와 함께 사는 것을 고대한다. 낸시의 엄마, 두 번째 부인이었던 피비가 쓰러지면서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낸시에게 가면 안 되겠냐고 매달리고 싶다.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것 같은 자신에 절망한다. 젊었을 시절, 광고회사에 다니던 시절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한다. 치매, 말기 암, 존경하던 직장상사는 이미 저세상으로 가버렸다. 상사의 부인과 그의 명복을 빌고 추억할 뿐이었다.
그렇다. 흘러내리는 근육, 사막과 같은 피부밖에 남아있지 않는 노인에겐 죽음의 냄새만이 느껴진다. 그 외에는 없다.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키려고 해봐도, 늙음 앞에서는 다 바스러져 버린다. 결국 남는 것은 죽음뿐이다.
사람이 죽는 순간에,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에 위치한 그 순간에는 삶의 모든 것이 한번 눈앞으로 스쳐지나간다고 한다. 증명할 방법도 없고, 어디서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는 듯 영화나 책에서 많이 이런 모습이 차용되곤 한다.
죽어서 무덤에 묻힌 이의 고백도 무엇도 아닌 제 3자의 시선으로 한 남자의 삶을 판단하지 않고 비교적 담담하게 그려내는 이 짧은 책을 읽으면서, 언젠가는 나도 죽을 것이고, 그때 내 장례식장엔 누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올까, 진정으로 내 죽음을 슬퍼해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
주인공 모씨의 삶은 모순투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성공과 일이 늘 함께 했고, 자신에게 정말 잘 맞는 짝을 두고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애정행각에 빠져 결국은 딸 하나, 자신의 형 이렇게 두 사람 빼고는 모두를 잃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그런 모순을 한 두 개씩 갖고 사는지도 모르겠다. 주어진 것은 이미 손에 들어왔으니 안중에도 없고, 갖지 못할 것, 또는 가지면 안 될 것을 바라보면서 유혹을 느낀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는 말이 막 살라는 것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야말로 심각한 오독이 아닌가 한다.
순간에 충실하라는 말은 그렇게 잘못 회자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지금을 남용하고 있지 않을까? 마음은 낮추고 눈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의 삶에 충실하고 싶다.
박준석·유성구 평생학습원 사서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준석 유성구 평생학습원 사서
박준석 유성구 평생학습원 사서
![[드림인대전]생존 수영 배우다 국가대표까지… 대전체고 김도연 선수](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4d/드림인대전1.jpeg)
![[현장]구청·경찰 합동 쓰레기집 청소… 일부만 치웠는데 21톤 쏟아져](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4d/118_2024112201001657300065231.jpg)




![[주말 사건사고] 청양 농업용 창고서 불…카이스트서 전동킥보드 화재](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4d/78_2024112401001726300067831.jpg)
![[날씨] 12~1월 평년과 비슷하고 2월 따뜻](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4d/78_2024112401001726800067861.jpg)


![[드림인대전]생존 수영 배우다 국가대표까지… 대전체고 김도연 선수](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4y/11m/25d/20241124010014328000559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