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 오랜 친구는 종종 얘기한다. 그때 네가 차려준 밥상을 잊지 못한다고, 봄 햇살 잘 드는 조그만 방에서 너랑 마주앉아 밥먹던 그날이 그립다고. 15년 전이었을게다. 서울에서 직장다니는 친구가 대전에 온다길래 밥 한끼 해줘야겠다 싶어서 집으로 초대했다. 아욱국, 돌나물 무침, 콩나물 무침, 구운 고등어 한 마리, 쪽파 데쳐서 무친 것, 애기배추 겉절이 등. 아주 소박한 밥상이었다.
책상겸 밥상으로 쓰는 코딱지만한 앉은뱅이 책상에 그것들을 차려놓고 보니 한 상 떡 벌어지는(?) 밥상이 됐다. 친구는 밥상을 보자 감격에 겨워 울먹였다. 아욱국에 밥말아서 후루룩 먹으면서 젓가락으로 나물반찬을 이것저것 집어 먹으며 나물 이름을 묻기도 했다. 서울서 오랫동안 혼자 살며 집밥이 꽤 그리웠던 모양이었다. 다만, 채식주의자인 친구는 고등어구이는 그래도 몇점 뜯어먹는 성의를 보였다.
친구랑 깔깔대며 밥먹던 그 앉은뱅이 책상에서 지금 이 글을 쓴다. 내 역사와 추억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앉은뱅이 책상. 대학 2학년때 기숙사에 입사하며 산 거니까 30년이 돼 간다.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베니어합판으로 된 거지만 튼튼한 이 책상은 당시 기숙사생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 필수품이었다. 학기가 바뀔 때면 방을 새로 배정받아 이불보따리, 책 꾸러미와 이 책상을 들고 이사다니는 게 일이기도 했다.
이 책상은 나와는 질긴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한 존재다. 30년을 같은 공간에서 같이 호흡하며 이것만큼 내 손길이 닿은 게 있을까. 나의 희로애락을 적나라하게 지켜본 이가 누가 있겠는가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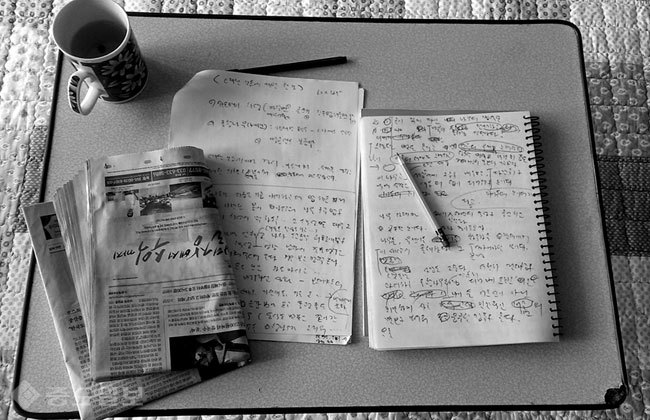 |
웃픈 에피소드가 있다. 오래전 실연의 상처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보내던 날들이 있었다.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굳이 시 구절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당시로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절망을 껴안고 살았다.
하루는 퇴근해서 밥맛도 없던지라 짜장면을 배달시켰다. 앉은뱅이 책상에 짜장면 한 그릇 올려놓고 싸구려 단무지를 우적우적 씹으며 짜장면을 입에 욱여 넣었다. 이런 게 소태맛이구나! 꾸역꾸역 먹고 있자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쁜 놈. 염라대왕 발바닥이나 핥아라.” 문득 눈물·콧물로 범벅된 짜장면을 먹는 내 모습을 TV 장식장 위에 놓인 거울 속에서 보았다. ‘꺄악!’ 하마터면 돼지 멱따는 소릴 질러 소란죄로 경찰서에 끌려가 벌금형이라도 맞을 뻔했다. 이게 누구시더라?
낯설고 전혀 친근하지 않은 캐릭터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닌가. 마스카라가 번진 눈두덩은 강시가 “누나”라고 부를 것만 같았고, 볼을 타고 흘러 내린 까만 눈물자국은 ‘귀곡성2’라도 찍어야 할 판이었다. 가관이었다. 어이가 없어 웃음보가 터졌다. 그날의 조울증적 히스테리를 거하게 치른 덕분에 다시는 고놈한테 전화 거는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다.
바로 위 언니는 이 책상을 볼때마다 이제 그만 버리라고 성화다. 언니 눈엔 구닥다리로만 보이는지 내 집에 올때마다 잔소리보따리를 풀어 놓는다. 지난 주말엔 멀쩡한 커튼을 바꾸자며 곧 사 갖고 온다는데, 참 나.
현대의 소비 이데올로기는 아직 사용가치가 충분한 상품을 폐기처분하도록 강요한다. 이것이 산업자본주의가 찬양해 마지않는 소비의 미덕이다. 장 보드리야르는 산업자본주의 발달의 핵심에는 인간의 허영과 욕망을 부추기는 유혹적인 소비 논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소비자들은 냉장고, 세탁기, TV, 휴대전화, 옷, 가구 등 새로운 것으로 갈아치우기 바쁘다. 그들에겐 오래된 것들은 케케묵은 과거에 불과한 것인가.
 |
얼마 전 친구랑 옥천의 금강변에 자리한 레스토랑에 갔다가 오래된 나무를 만났다. 굴참나무인데 품새가 늠름하면서 우아했다. 둘레가 몇 사람이 팔을 두를 만큼 장대한 그 나무는 수령이 400년쯤 됐다고 하니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에 생을 시작한 셈이다. 연륜이 느껴지는 골이 깊게 파인 나무의 껍질은 거북이 등처럼 단단했다. 층층이 수평으로 뻗은 줄기는 장구한 세월을 넉넉히 품은 거인의 풍모를 닮아 있었다. 굴참나무는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그늘을 내주었고, 다람쥐를 먹여 살렸고, 새들의 집이 되어주었을 것이다. 나무는 말없이 인간과 자연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경이롭나.
나무든 물건이든, 하루하루 견뎌내며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건 분명 어마어마한 일이다. 사람도 그렇다.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는 굴참나무처럼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는 치열하게 사는 인간적인 노년의 면모를 보여줘 감동을 준다. 허나 광주항쟁에 대해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전두환씨 같은 뻔뻔한 노년의 모습은 징그럽다. 다음 달 서울 친구 선화랑 만나기로 했는데 구수한 된장찌개 끓여서 볼이 미어터지게 상추 쌈이나 싸 먹을란다. 내 오래된 밥상에 마주 앉아서 말이다.
우난순 교열팀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우난순 교열팀장
우난순 교열팀장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1d/118_2024112101001603200062341.jpg)



![[기획]`대한민국의 스페이스X를 꿈꾼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의 도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0d/78_20241120010014472000564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