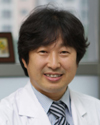 |
| ▲ 김윤식 대전대 교수 |
혹시 TV방송 광고 중 빠름을 강조하는 어느 통신사의 카피문구를 기억하는가. 대한민국은 이미 빠름에 익숙해져 있다. 느린 것을 무척 싫어한다. 기다리는 것에 익숙지 않다. 음식점에서 주문을 하면 음식이 곧바로 나와야 한다. 심지어 그것을 5분 이내에 후다닥 먹어댄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것은 벌써 부터가 상상하기 싫어진다. 결혼식은 30분 안에 끝이 난다. 부부를 상품처럼 이렇게 빨리 찍어내는 나라는 세상에 없으리라. 중국집 배달은 거의 총알수준이다. 배달된 음식이 식으면 돈을 받지 않겠다는 업체가 성업 중이다. 스마트폰의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바로 기기를 바꾸어 버린다. 택배나 대출, 인터넷 속도까지 빠른 것을 무기로 소비자를 공략하는 전략이 이미 보편화 됐다. 빠르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1970년대 중동의 건설바람이 불던 시절부터 최근 IT업계 호황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특유의 민족성인 빠름과 정확함, 그리고 성실함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무엇이든지 빨리 결정하고, 빨리 진행하며, 빨리 완성하는 습관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원동력임에 틀림이 없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첫인상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 역동성과 친절을 이야기 한다. 오죽하면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인사말을 제외하면 '빨리 빨리'가 단연 으뜸이 되었을까. 심지어 필자가 외국여행 중에 만나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빨리 빨리'를 외치는 모습이 참 흥미롭게 느껴졌다.
일교차가 심해지고, 찬바람이 불면서 감기를 호소하는 환자가 부쩍 늘었다. 손주를 돌보고 있는 어느 할머니의 넋두리를 기억해본다. 손주가 감기에 너무 자주 걸려 병원에 자주 간단다. 병원에 가보면 어떤 의사는 약을 한 두 개만 주고 물을 많이 먹이라고만 한다는 것이다. 할머니의 불만은 바로 이것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병이 빨리 나을 수 있겠어…. 그래서 그 분은 거리가 멀지만 좋은 약도 많이 쓰고 늘 주사를 놔주는 용한(?) 원장님을 찾게 되었고, 할머니는 지금도 그 원장님의 광팬이란다.
우리나라에서 소아환자, 특히 감기환자를 가장 많이, 그리고 잘 본다는 병의원이 발표된 적 있다. 공교롭게도 항생제 사용량과 거의 일치한단다. 씁쓸하다. 병을 빨리 낫게 한다는 명목 하에 몸을 손상시키고 종국에는 우리 몸의 면역기능을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를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들이 서슴지 않고 의사들에게 요구했다는 사실이다. 한국 의사들의 감기약 처방전을 본 외국 의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한다. 그냥 단순한 감기치료를 위한 것인데 처방은 마치 폐렴 치료하듯, 그래서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이 항생제 내성이 최고인 나라가 되지 않았던가.
'감기는 약을 쓰면 14일, 그대로 두면 15일 만에 치료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감기에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면역력에 의해 저절로 낫는다는 행복한 반증이라 그나마 위안을 준다.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에도 중풍이나 파킨슨병, 치매와 같은 많은 퇴행성 뇌질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더 빨리 회복되기 위해 양·한방 협진을 원한다.
“더 빨리 낫는 방법은 없나요?”
“빨리 낫는 특효약은 없나요?”
질병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질문에 난감하기 마련이다.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스트레스다. 그 병 자체가 치료가 빨리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발이 잦으며, 점점 더 악화되는 경우도 흔하게 때문이다. 빨리 회복시킬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마음만 아파온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필자의 대답이다. 그렇다. 빠름에 익숙해 있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 문제가 된 자신의 생활습관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바꾸려고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인내해야 한다.
자, 한번 기다려 보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다보면 회복되어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튼튼해진 나를 상상하며 지금부터 한걸음씩 천천히 걸어보자. 느림보 거북이처럼 말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윤식 대전대 교수
김윤식 대전대 교수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1d/118_2024112101001603200062341.jpg)



![[기획]`대한민국의 스페이스X를 꿈꾼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의 도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0d/78_20241120010014472000564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