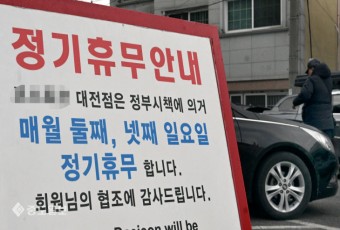|
처음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정리하면서 브래지어를 유방띠로 불렀다. 말다듬기 운동, 문화어 운동 등 의식적인 언어정책이 통하는 사회에서 밀어붙이면 유방띠로 살아남았겠지만 폐기해서 다행이고, 젖통띠로 부르지 않아 더 다행이다.
말이 너무 작위적이면 말이 아니다. ‘지속성 발정(發情)’을 ‘오래 끌 암내’로 바꾼 한글학회 쉬운말 사전이 호응을 얻을 리 없다. 날틀(비행기) 같은 말 쓰기가 시도되다 실패한 것은 동일한 이유다. 하기야 등정, 등반 대신에 길오름, 길뜸을 하고 냉수욕 말고 찬물미역 정도라면 써도 좋을 듯하다.
북한에도 끌힘(인력), 잊음즘(건망증), 거님길(산책로)처럼 한글학회식 단어가 없는 건 아니다. 어쨌든 그중 가슴띠는 뛰어나다. 고유어로 바꾼 정신, 국어 조어력의 실천적 근거를 제시한 점도 좋다. 그쪽의 매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모르겠다. 가슴을 작게 보이려 밴드를 감았던 옛 로마 여인 쪽에서 가슴을 치올려 크게 강조한 크레타 여인 쪽으로 이행하는 중이겠거니 짐작할 뿐.
사실 우리에게 가슴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치마에 달려 가슴께로 올라가 로마식으로 가슴을 짓누르는 구실을 했어도 가슴띠였고 실제로도 그렇게 불렸다. 허리띠, 머리띠가 있는데 가슴띠라고 왜 없을소냐. 그걸 노브라 패션이라 한다면 노브라를 유행시킨 이브 생 로랑이 울고 갈 패션이다. 그렇게 말하다 브래지어의 효시가 이브 가슴의 나뭇잎이라는 주장도 나오겠다.
다음은 홈쇼핑 광고에서 건성으로 스쳐 들은 멘트.
―여름엔 많은 여성분들이 집에서 더울 때 브래지어를 잘 안 하죠?
―네, 저도 그래요.
연출된 대화를 듣고 한민족이 노출 패션의 선구자였음을 생각하며 속으로 웃었다. 웬 벙거지 시울 만지는 소리냐 한다면, ‘조선 여인의 아들 자랑’이라는 제목을 달고 저고리 아래로 탱탱한 젖가슴을 드러낸 옛 사진을 기억해보자.
굳이 에르네스트 르낭의 다섯 가지 민족 식별법이 아니라도 남북의 보편적 문화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 단어인 가슴띠, 그리고 브래지어―통일이 되면 이 두 말을 복수 표준말로 지정해 함께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최충식 논설위원
최충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