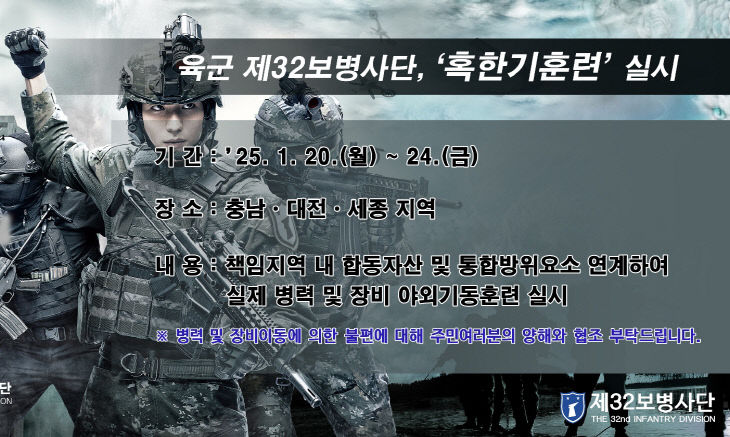|
|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이시데 요시후카도 화재 당시 사람이다. 에도 감옥의 책임자였다. 백 명이 넘는 죄수들이 수감돼 있었다. 화재 때 십만 칠천 명이 불에 타 죽었다. 창살 안에 갇힌 죄수들이 희생돼도 흔적조차 남지 않을 터였다. 화재가 나면 죄수를 풀어주라는 법도 없었다. 도시를 삼킨 불길이 맹렬한 기세로 감옥을 덮치려 했다. 요시후카는 죄수들을 풀어주었다. 스스로 목숨을 구했다가 불길이 잡히면 돌아오라고 말했다. 사흘 만에 화재가 진정되었다. 풀려난 죄수 전원이 자기 발로 감옥에 되돌아왔다. 영주는 그들을 감형시켰다. 화재로부터 죄수들의 인명을 보호하는 시설이 설치되었다. 여의치 않으면 죄수들을 풀어준다는 법도 만들어졌다. 시쳇말로 하자면 이시데 요시후카법이다.
할머니의 늦둥이 외아들은 전쟁터에서, 며느리는 폭격을 맞아 죽었다. 어린 손자들을 먹이려고 할머니는 입던 옷을 팔아 쌀을 샀다. 쌀 거래를 금지하던 식량관리법 위반죄로 체포되었다. 할머니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는 그날부터 밥을 끊었다. 불법의 시장에서 구매한 쌀로 배를 채우고 암시장의 쌀을 사고 판 사람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었다. 합법적으로 배급받은 쌀은 아이들을 먹이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암거래에 유연히 맞서 싸우다가 기꺼이 아사하겠다고 판사는 그의 일기에 적었다. 법을 위해 밥을 거절한 판사는 1947년 영양실조로 죽었다. 도쿄 지방법원 야마구치 요시타다 판사, 그의 나이 서른다섯이었다. 점령군 최고사령관 맥아더와 일본 최고재판소는 밥 때문에 법정이 오염되는 비극을 막으려고 협력했다.
명령이 곧 법이 되던 막부시대의 영주는 자기 밥의 상징인 천수각 재건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화마가 덮쳐오던 절체절명의 순간 교도소장은 법에 없던 명령을 내려 죄수들을 살렸다. 죄수들은 달아나지 않고 돌아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법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양심의 명령에 고뇌하던 젊은 판사는 밥 때문에 법정이 오염되는 사회적 비극을 줄였다. 오래된 남의 나라 법과 밥에 얽힌 이야기이긴 하지만, 밥을 벌기 위하여 법을 남용한다는 우리 세태를 곱씹어 보게 한다. 사법을 농단한 혐의로 고위 법관이 구속되고 전직 대법관들이 소환되었다. 급기야 검찰에 불려온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은 놀이터와 담벼락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조롱을 받았다. 법이 밥에 밀렸다는 주장일 것이다.
법과 밥의 문제는 법조에 국한되지 않는다. 금지하고 처벌하는 실정의 법률이 없더라도 사람들 마음속에 법적인 가치가 살아 숨 쉬는 법이다. 더 많은 양의 언론사 밥을 짓기 위해 저널리즘 가치가 불쏘시개로 소진되는 시대다. 수십 년 권력을 감시하던 현직 언론인들이 하루아침에 펜을 버리고 최고 권력의 참모로 이동했다. 밥을 위해 법을 버렸다는 비판을 언론은 견뎌낼 수 있는가?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고미선 기자
고미선 기자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24. 대전 서구 탄방동 카페](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1m/15d/카페사장님1.jpeg)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24. 대전 서구 탄방동 카페](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1m/15d/78_2025011501001086600042831.jpg)


![[드림인대전]미래 올림픽 스타 꿈구는 동문초 탁구부 반시우-최승연](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1m/14d/85_2025011201000734700029272.jpg)



![[드림인대전]미래 올림픽 스타 꿈구는 동문초 탁구부 반시우-최승연](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1m/15d/202501120100073470002927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