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충식 논설실장 |
136개 중 111개 조항에서 발견한 오류에는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처럼 딱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오류 같지 않은 오류도 있다. 헌법 제72조, 53조 4항, 130조 2항의 '붙이다'는 '부치다'의 혼동이 아니다. 어법상 국민투표에 '붙이는' 시절에 헌법을 만들었다. '붙이다'와 '부치다'는 생판 다른 단어가 아니다. 말의 족보를 파고들면 역사적인 근원이 같다.
이런 유(類)의 최근 논란에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현행 헌법 공포 이후 30년을 끌어온 논란거리였다. 헌법 전문 '각인(各人)'이 '개인(個人)'이라는 주장은 그 이상이다. 독일 바이마르헌법을 참고해 제헌헌법을 초잡은 유진오의 육필 원고를 직접 봐도 그렇게('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적혀 있다. 초안을 쓴 해방 직후에는 어색하지 않았다. 70년 동안 방치하니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경중을 가리면 일제강점기에 법학을 공부한 법학자는 거의 무죄다. 9차례 개헌 내내 스리슬쩍 붓 터치만 한 우리 죄가 무겁다. 다만 이오덕 식으로 4조 '민주적 기본질서'의 '적(的)'까지 빼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법률용어도 하나의 전문용어다. 그리고 언어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 진짜 착각은 어법이 틀리면 마구 교정하면 된다는 우리 상식이다. 맞춤법을 위한 헌법 수정도 '개헌'에 해당한다.
헌법 개정은 또한 용어를 넘어 시대정신이 충돌하는 1987년 체제 청산과 맞물린다.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 지향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을 규정한 117조, 118조의 느슨함이 지목되는 것이 그 좋은 예다. 이 경우, 1조나 2조쯤에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에 속한다' 등으로 규정해야 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뤄진다'고 못박은 프랑스 헌법 제1조 1항은 괜찮은 본보기다.
최고의 법인 헌법의 오류 범벅은 맞춤법의 문제만은 아니다. '새우리말 큰사전'을 보면 '붙이다'의 3번째 뜻으로 '일을 어떤 대상이나 과정으로 넘기다. 심의에 붙이다. 표결에 붙이다'라고 풀이한다. 이것이 바뀌어 '붙다' 의미가 살면 '붙이다', 안 그러면 '부치다' 정도로 정리된다. 어쨌든 헌법 개정 시점의 표현이 구식 표현이 됐다. 법조인 책임이나 국어학자 과오가 아니며 국회의원이 무식해서도 아니다. 영화 '1987'의 소재인 박종철 고문치사와 이한열 최루탄 사망 사건을 거친 6월 항쟁의 산물인 헌법은 6·29선언과 전두환 7·1담화로 불붙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개정됐다. 체육관 선거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얻은 것만도 감격스러운 성취였다.
위계가 아닌 시간 순서로 보면,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헌법은 1988년 2월 25일 시행됐고 1989년 1월 19일 개정된 한글맞춤법은 1989년 3월 1일 시행됐다. 물론 이것이 단 19%만 온전한 헌법 조항에 대한 면피는 되지 못한다. 조사나 어미, 문장 구조의 어긋남, 엿가락같이 들러붙은 띄어쓰기, 지시어 오남용, 능동과 피동의 혼선 등으로 얼룩진 헌법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다. 헌법 130조 2항에 따라 '국민투표에 붙여(부쳐)' 문법적으로 깔끔하게 고치는 일이 남아 있다. 일일이 세어보진 않았지만 111개 조항에 나타난 234건의 맞춤법 오류도 1987년 체제 극복의 당위성에 추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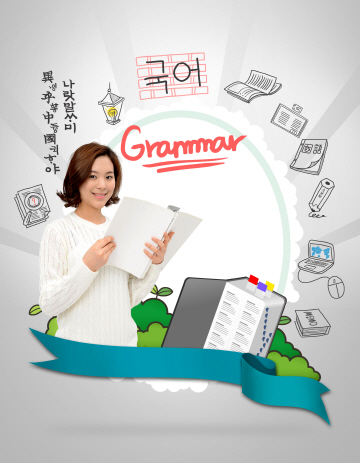 |
최충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1d/118_2024112101001603200062341.jpg)



![[기획]`대한민국의 스페이스X를 꿈꾼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의 도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0d/78_20241120010014472000564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