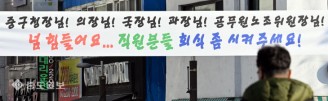|
| ▲ 김정숙 충남대 교수 |
그러니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로 시작하는 노래가사도 떠오른다. 켈트족 전설 속의 ‘가시나무새’는 평생 긴 가시나무를 찾아다니며 쉬지 않고 날다가 가시나무를 발견하면 그곳에 앉아 가시에 심장이 찔리며 죽어간다고 한다. 죽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하여 생긴 비극적인 이야기는 소설, 영화, 드라마, 대중가요, 연극 등의 소재가 될 만큼 인생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시는 상처내고 고통을 주는 대상으로 그려진다. 우리는 심하게 아프거나 힘들 때, 사랑하는 것들과 이별했을 때 가시에 찔렸다고 말한다. 가시 돋친 말을 하거나 눈엣가시의 시선으로 다른 이를 아프게 할 때도 있다. 마음이 불안하고 강퍅할수록 ‘찌르고, 박히고, 돋치는’ 단어를 만난 가시는 더 매서워진다. 뾰족한 가시는 통증의 감각을 불러온다. 가시는 때로 날카로운 칼이나 못으로도 비유되곤 한다. 가장 심할 경우 마음에 대못을 박는다는 표현도 쓰인다. 살다보면 마음에서 자기도 모르게 못 같은 것이 삐죽 솟을 때가 있다. 이것은 남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스스로를 상처 내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
생각해 보면 가시를 세우는 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남을 경계하거나 공격하는 본능과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식물이 제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지나 잎이 뾰족하게 변태한 것처럼, 고슴도치의 가시나 장미의 가시도 제 몸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다. 그러나 때로 가시의 말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나, 황폐해진 스스로를 보며 더 큰 고통으로 의기소침해지고 자존감도 저하되어 자신까지 해치게 된다. 이럴 때 가시는 상처와 보호라는 이중성을 지닌다.
그 방향을 어디로 향하는가에 가시의 가치가 놓일 것이다. 나무들은 바람과 번개와 같은 것들이 만드는 상처들로 옹이가 생긴다. 그러면서 나무는 성장한다. 나이테는 상처의 훈장이다. 사람도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지 않으며 살아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조심하기만 할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든 상처 받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며 조금씩 강해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가시가 왜 박혔는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나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바로보아야 하고, 상대방은 왜 그랬는지 그의 입장에서 헤아리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시를 뺀 자리가 곪지 않도록 소독약을 바르고 치유를 해야 한다. 상처 없는 삶이 없듯이 상처 난 곳을 치유하는 힘도 우리에게는 있다.
내겐 인상 깊은 하나의 조각상이 있다. 2013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콩고강 중앙아시아 예술’ 전시 중 ‘은카시 은콘디’가 그것이다. ‘은카시 은콘디’는 ‘강한 힘을 가진 조각상’이라는 의미인데, 이 부족은 조각상에 칼날이나 못을 박음으로써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한다. 강한 힘은 역설적으로 강한 자극이 있을 때 생겨난다. 지금 칼날 같은 상처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이겨낼 지혜도 있을 것이다. 부드러운 강함, 엷은 미소를 지닌 그 작은 조각상이 전해주는 주술의 힘은 고통으로부터 생성된 것이어서 더 공감했는지도 모른다.
5월 10일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이 결과에 이르는 동안 생각과 관점이 달라 상처 내고 상처 받은 일이 많았을 것이다. 내가 건넨 선의와 걱정의 말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가시였을지도 모른다. 가시를 부드럽게 하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내 몸을 뚫고 나오는 날카로운 것들을 다스리는 정성을 쏟는다면 가능할 것이다. 장미가 아름다운 자태와 향기를 품을 수 있도록 본문을 다한 가시는 아름답다. 장미의 계절에 치러진 큰 ‘선택’[大選]이 큰 ‘선함’[大善]으로 향해가는 시작임을 믿는다. 가시가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는 시금석으로 쓰인다면, 아름답고 성숙한 인간다움은 더욱 향기롭게 꽃피울 것이다.
김정숙 충남대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정숙 충남대 교수
김정숙 충남대 교수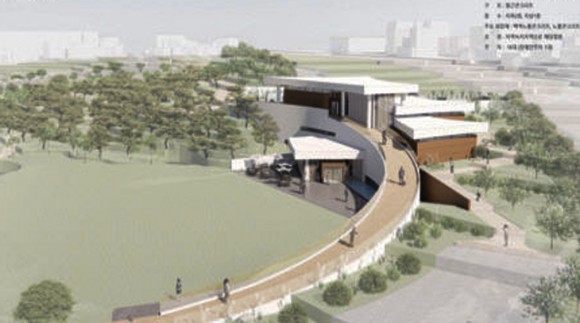

![[2025 경제정책] 내수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1m/02d/118_2025010301000178300006411.jpg)

![[2025 경제정책] 내수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온누리상품권 할인률 상향 등](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1m/02d/78_2025010301000178300006411.jpg)




![[펫챠] 대전 반려동물의 명암 볼 수 있는, 40m 거리 이웃사촌인 두 기관](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1m/02d/85_202501020100011440000418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