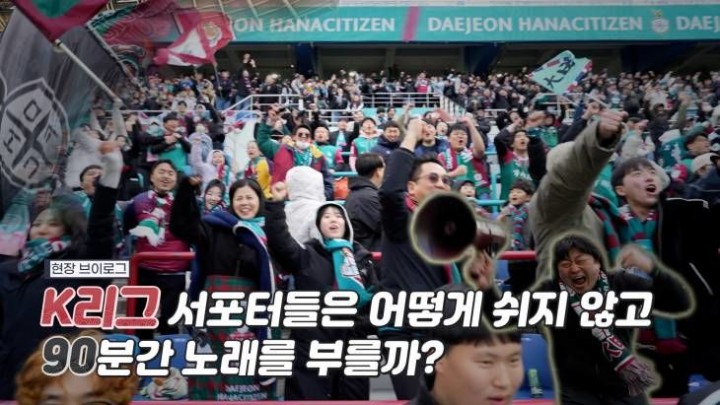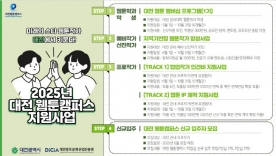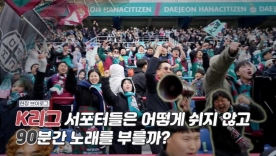이렇게 역할이 뒤바뀐 주된 이유는 정규교사의 담임 기피에 있다. 이는 전체 교사의 11.5%(4만 4000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하 요인의 하나다. 제주도교육청 등이 기간제 교사 담임 업무 '제로화'를 추진한다고는 했다. 의지와 달리 교원 부족 등 학교 여건과 교과 특성상의 현실성은 떨어질 수 있다.
기간제 교사 비율은 최근 몇 년간 제자리걸음이거나 지역에 따라 느는 추세다. 경북을 예로 들면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이 2014년 49.4%에서 올해 55.9%로 늘었다. 30.5%로 상대적으로 낮은 전남 역시 2년 전에 비하면 6.4% 증가했다. 광주는 51.3%가 담임교사를 맡아 충남의 뒤를 잇고 있다. 담임에 정규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과도한 기간제 교사 업무를 경감하는 한편, 교권 침해 등 열악한 처우도 마땅히 개선돼야 할 것이다.
이는 학부모가 신분이 안정된 정규교사 담임을 선호한다는 것과는 다른 각도의 문제다. 기간제 교사가 학사관리나 학생지도를 못해서가 아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신규교사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고 교육부도 결원 발생 때 정규교원을 적극 채용한다고 했지만 지지부진하다. 담임을 맡을 교사가 부족하다는 말만으로는 정규교사의 절반 이상이 담임을 안 맡는 현상황을 설명하기엔 괴리가 있다.
기간제 교사 증가는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재정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이 억지로 떠맡겨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담임 업무는 교사로서 본질적 영역이다. 너나없이 회피한다면 안정적 공교육 저해 등 부작용을 부른다.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 증가가 교육현장에서 이른바 '갑' 지위 남용 탓은 아닌지도 같이 살펴볼 시점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슈] 청소년 비행 잡고 불법촬영 막아주는 대전자치경찰위 `과학치안`](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3d/과학치안1.jpeg)

![[썰] 4·2 대전시의원 보궐, 더불어민주당은 본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3d/78_2025040301000346200012001.jpg)



![[WHY이슈현장] 청소년 비행 잡고 불법촬영 막아주는 대전자치경찰위 `과학치안`](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3d/78_2025040301000308200010831.jpg)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4m/02d/78_20250402010002736000089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