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논설실장 |
실제로 이것이 지역 농산물 로컬푸드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개인적으로 체험한 최(最)지근거리의 로컬은 온갖 종류의 채소를 직접 길러먹을 때였다. 그때 겪은 난제의 핵심은 잉여 농산물(?) 처리였다. 인심은 후하게 썼지만 운송비와 시간 낭비를 무시할 수 없었다. 고민의 결은 상당히 달라도 환경에너지 전문가인 크리스 구달의 의문에 최근 좀 공감하게 됐다. 2.4㎞를 걷고 우유 1잔을 마신다 치자. 그러면 우유 생산지의 메탄가스와 우유 배달 차량의 온실가스는 내가 자동차로 이동할 때의 배출량과 맞먹는다고 본다.
 |
작목 전문화라는 면에서는 또한 금산 깻잎, 당진 쪽파, 청양 취나물, 논산 딸기, 보은 대추, 충주 사과, 영동 포도 등으로 특화해야 효율적일 수 있다. 가드닝과 유사한 취미나 교육문화적 가치에 값하며 자작했던 농사는 시장경제의 층위에 들지도 않았다. 유리한 공급자 위치에서 차익을 얻는 자본주의의 층위는 더욱 아니었다. 농사짓느라 다른 일을 못하는 기회비용까지 계산하면 자급자족의 의미만 겨우 건졌다. 경제의 눈높이에선 불합리했다.
씨앗 값이나 굳는 셀프 농사보다 구입해 먹는 쪽이 자원집중적이라는 이야기다. 영국의 얼롯먼트,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등의 도시 텃밭은 본보기로나 놔둬야 좋을 수 있다. 그에 비해 로컬푸드는 생업, 생계의 문제다. 운송 과정이 짧아 신선하다는 전제 외에 도농 상생 캠페인의 요소를 가미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도 식품 안전과 가격 안정을 보장받아야 신뢰에 바탕을 둔 선순환경제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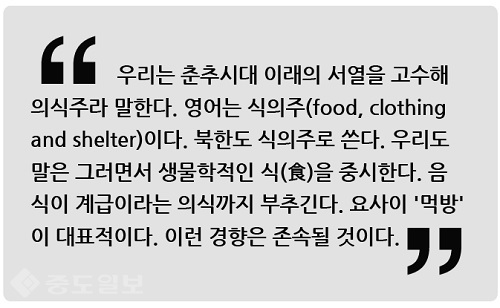 |
그런 점에서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이 8개월 만에 매출 55억원을 돌파한 사례는 확장성을 나타내준다. 그런데 국내 로컬푸드의 효시로 공인받는 전북 완주처럼 너무 잘되어도 탈이다. 직매장과 전통시장 충돌이 우려된다고 그 지역의 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지역 내 순환, 지역 내 협력체 추구는 똑같이 신경 쓸 부분임을 일깨워준다.
지금도 앞으로도 로컬푸드의 지속성은 좋은 먹거리에서 찾는 게 답이다. 우리는 춘추시대 이래의 서열을 고수해 의식주라 말한다. 영어 배열은 식의주(food, clothing and shelter)이다. 북한도 식의주로 쓴다. 우리도 말은 그러면서 생물학적인 식(食)을 중시한다. 나아가 음식이 계급이라는 의식까지 부추긴다. 요사이 '먹방'이 대표적이다. 이런 경향은 존속될 것이다.
로컬푸드의 활로는 어쩌면 이 지점에 있다.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 맺기로 밥상 안전을 지킨다는 것이 그것이다. 환경 난제에 속하는 미세먼지이건 다른 무엇이건 식품체계 위험성의 대응 방안이 돼야 로컬푸드가 살아남는다. 우리가 로컬 식재료를 쓰는 동안은 먹는 행위도 얼마든지 지역적일 수 있다.
최충식 논설실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최충식 논설실장
최충식 논설실장
![[날씨] 12호 태풍 `링링` 영향…폭염·열대야 강화](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8m/22d/crop118_2025082201001680100070791.jpg)











![[S석한컷]대전팬들의 로망 ACL원정 갈 수 있을까? 그럼 당연히 가야지!](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8m/23d/20250814001526426_1.jpg)
![[드림인대전] 윤하랑, 우상혁의 대를 잇는 육상의 별을 꿈꾸다](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8m/23d/20250812010009293000383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