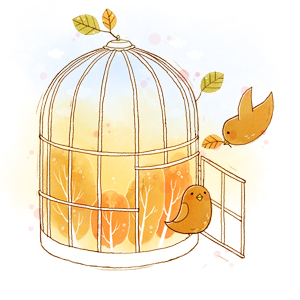 |
특정해서 의심자만 단속하면 나머지 운전자들의 자유는 존중된다. 불특정 다수를 모두 도로 위에 잡아두는 우리나라의 경우 적발건수는 늘어날 수 있지만, 자유와 인권 측면에서는 최악이 될 수 있다.
아직도 우리는 자유를 뺏는 문화에 익숙하다. 자유를 빼앗기면서도 그것을 침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어찌 보면 일제강점기와 해방과 6·25전쟁, 유신과 군사독재, 민주화 투쟁 등을 거치면서 사고와 행동이 자유를 뺏고 빼앗는 프레임(틀)에 적응됐다고도 볼 수 있다.
온갖 매체와 수단을 통해 쏟아지는 마케팅도 마찬가지다. 무자비하게 소비자를 공격한다. 소비자의 마음과 상태는 안중에도 없다. 무조건 질러놓고 하나라도 걸리면 된다는 심보다. 시대는 급속히 변하는데, 아직도 광고 행태는 '마켓 1.0 시대'에 머물고 있다. 온종일 광고와 마주치는 현대인들은 거부할 수 없는 마땅한 장치 없이 광고의 집중포화를 받으며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자유를 뺏는 것에 익숙한 것들의 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자유를 주고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힘'은 자유를 배려하지 않는 일탈로 치부하기 일쑤다. 그러면서 구속과 속박, 질서 등으로 자유를 끌어내리려 한다. 총장직선제를 요구하며 투신한 국립 부산대 교수는 '돈다발' 앞에서 너무도 쉽게 자유를 상납한 다른 국립대 구성원들에게 '부끄럽게 살지 말자'고 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우기며 소수자 의견이나 작은 외침을 깔아뭉개며 권력화된 힘을 과시하는 종교계 역시 별반 다를 게 없다. 아무리 포장해보려 하지만, 교조(敎條)에 불과한 건 아닐까 한다. 그냥 힘만 자랑하려는 아집(我執) 말이다.
관점을 바꾸면 다르게 보인다. 기준을 바뀌면 정책이 바뀐다고 했다. 차들이 달리는 도로도 인도지만, 사람들이 운전자를 위해 배려해준 공간이다. 육교는 사람을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운전자)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불필요한 물건일 뿐이다. 그래야, 힘이 더 강해지는 세력이 조작해낸 결과물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윤희진·취재 1부 행정팀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윤희진 취재 1부 행정팀장
윤희진 취재 1부 행정팀장
![[기획] 대전, 트램부터 신교통수단까지… 도시균형발전 초석](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6d/20241125010100129661.jpeg)


![[기획] 대전, 트램부터 신교통수단까지… 도시균형발전 초석](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6d/20241125010100129662.jpeg)






![[S석한컷]축제 같았던 대전하나 시즌 마지막 홈경기](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4y/11m/27d/20241125001758353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