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보통 3~7일 이후에 접수되면서 역학조사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22일 대전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식중독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식당은 2곳에 불과하다.
지난 해의 경우 총 8곳에서 식중독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단 1곳만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7곳은 기준치 이하, 식품·환경검체 미검출 등의 이유로 처분불가 조치가 내려졌다.
올해도 현재까지 시내 유명 음식점 등에서 6건 정도의 의심신고가 접수됐으나 식중독 바이러스가 검출돼 행정처분을 받은 식당은 없다.
이마저도 의심신고에 대한 통계가 없거나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자치구가 있어 의심신고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처분불가 조치가 많은 이유는 신고자 대부분이 수일이 지나서야 행정기관에 의심 신고를 하기 때문이다.
신고를 늦게 하는 이유로는 미미한 증상의 경우 식중독으로 의심하지 않다가 증상이 지속되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사람 마다 식중독 원인균의 잠복기가 달라 신고가 늦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직접 해당 음식점과 병원비나 보상금 등을 며칠 동안 협의하다가 협의가 안 될 경우 뒤늦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럴 경우 역학조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당일 사용한 식재료에 대해 144시간을 보관하지만, 일반 음식점은 당일 사용한 식재료를 보관할 의무가 없다.
결국 일반 음식점의 경우 즉각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역학조사를 해도 해당 식당의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에 걸렸다는 규명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 음식점도 일정기간 식재료를 보관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식중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 종사자(가검물), 조리식품, 환경검체에서 모두 원인균이 검출돼야 한다”며 “신고가 늦어지면 사실상 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 의도적으로 봐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정성직 기자
정성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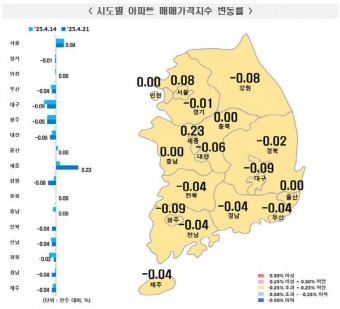







![[박현경골프아카데미]백스윙 어깨 골반 회전! 당겨서, 고정하고, 돌려주세요](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4m/20d/85_20250420000024502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