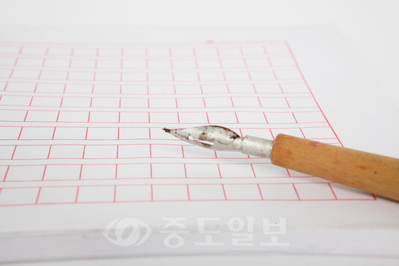 |
종사자들이 문인이라면 궁금증은 배증(倍增)한다. 1950년대 중도일보 편집국장과 주필을 지낸 소설가 추식(秋湜)이 나름대로 그 모델이다. 글쓰기와 밥벌이 병행이 쉽지 않았을 텐데, 문학적 성과인 『인간제대』가 범우문고로 남아 있다. 추 주필이 활약했을 무렵도 지금 개념으로 최저임금 이상 원고료를 버는 문인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시 한 편에 삼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말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긍정적인 밥')라고 노래한 함민복은 그나마 복 받은 시인이다. “시인이 되고 나면 세상이 한 번 뒤집힐 것 같지만, 세상은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 중도일보 직무연수에서 '저널리즘 문장론'을 강의했던 시인 이문재(경희대 교수, 전 시사저널 기자)는 데뷔하자마자 '개점휴업'이 되는 사정을 이렇게 잘 적시해냈다.
원고료 5만원, 3만원이든 받으면 감지덕지란 이야기다. 원고 청탁에 응해도 책으로 받거나 인정상 책을 사주는 수가 있다. 엊그제 받은 한 문예지 청탁서에도 '죄송하지만 원고료는 책으로 대체합니다'라고 덧붙여 있다. 회당 1천만 원 넘는 몇몇 드라마 작가, 짱짱한 연봉에 강의료, 원고료 부수입으로 두둑한 극소수와 동일시해선 이해 불가한 일이다.
행위예술가이자 시인인 류환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니 '예술가에게 예술은 없을 수 없는 존재'라고 떠 있다. 불안한 노동과 수입, 미래의 3중고를 그렇게 견딘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는 문화적 수준이다' 운운이지만 늘 공허하게 들린다. 문화를 산업으로만 보는 까닭에 예술인 복지는 유럽연합(EU)의 '개구리 복지'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수입 비율로도 안개 속을 걷는 삶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음악 60%, 무용 64%, 국악 67%, 영화 71%, 연극 74%, 미술 79%, 문학 91.5%가 100만원을 못 번다. 책을 내면 자비 출간이고 영세 출판사는 그걸 먹고 지탱한다. “저자가 책 보내면 1만원씩 보내자”는 이규식 한남대 문과대학장의 제안에 솔깃했었는데, 소박한 애정만 갖고는 실천이 안 된다.
이제 막 겪은 에피소드다. 잡지 연재물에 유명 작가의 작품을 삽화를 실었다. 남한강변에 사는 화가는 “책이나 넉넉히 '원고료 조'로 달라”고 신신당부했더랬다. '죄송하다'는 사과 아닌 사과까지 받고 내가 수령한 원고료는 5만원. 오히려 죄송했다. 잔여분 책이 서점에 얼마 남지 않아 적자는 면했다. 3만원이면 아프리카 한 가정이 한 달을 버티지만 현실의 이면은 이렇게 다르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일당 5억원이 더 괘씸해 보이는 날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최충식 논설실장
최충식 논설실장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1d/118_2024112101001603200062341.jpg)



![[기획]`대한민국의 스페이스X를 꿈꾼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의 도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4y/11m/20d/78_2024112001001447200056411.jpg)











